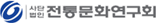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 여닫기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06.
夏六月에 暑雨旣止라 歐陽子坐於樹間하야 仰行度라가 見星有殞者라
夜旣久에 露下한대 일새 其感于耳目者가 有動乎其中이라 作雜說하노라
1)하니 其爲生也簡而易足이라 然仰其穴而鳴이 若號若呼하며 若嘯若歌하니 其亦有所求耶아
抑其求易足而自鳴其樂耶아 苦其生之陋而自悲其不幸耶아 將自喜其聲而鳴其類耶아
豈其時至氣作에 不自知其所以然하야 而不能自止者耶아 何其聒(괄)然而不止也오 吾於是乎有感이로라
2)星隕於地에 腥礦頑醜가 化爲惡石이라 其昭然在上而萬物仰之者는 러니 及其斃也하얀 瓦礫之不若也로다
人之死에 骨肉臭腐면 니 其貴乎萬物者는 亦精氣也라
其精氣不奪于物하면 則蘊而爲思慮하며 發而爲事業하며 著而爲文章하야 昭乎百世之上而仰乎百世之下하니
非如星之精氣가 隨其斃而滅也하니 可不貴哉아 而生也에 利欲以昏耗之하고 死也에 臭腐而棄之어늘
而惑者方曰 足乎利欲이면 所以厚吾身이라하니라 吾於是乎有感이로라
3)이라 日一歲而一周한대 月疾於日하야 一月而一周하며
天又疾於月하야 一日而一周하며 星有遲有速하며 有逆有順하니
是四者各自行而若不相爲謀로되 其動而不勞하며 運而不已하야 自古已來로 未嘗一刻息也니 是何爲哉아
夫四者는 所以相須而成晝夜四時寒暑者也라 一刻而息이면 則四時不得其平하며 萬物不得其生하니 蓋其所任者重矣라
人之有君子也에 其任亦重矣니 萬世之所治며 萬物之所利라 는 其知所任矣라
然則君子之學也에 其可一日而息乎아 吾於是乎有感이로라
中多近道之言이라
06. 雜說 세 편 幷序
여름 6월에 후텁지근한 비가 그쳤다. 歐陽子 가 나무 아래 앉아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우러러 관찰하다가 떨어지는 별을 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이슬이 내리는데 풀 사이로 점점 促急 해지는 지렁이 소리를 들을 때 귀와 눈으로 느껴지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점이 있기에 〈雜說 〉을 짓는다.
지렁이는 흙을 먹고 땅속의 물을 마시니 그 살아가는 방식이 간단하여 만족하기 쉽다. 그렇지만 그 땅속 굴에서 우러러 바라보며 울어대는 것이 호소하는 듯하고 부르는 듯하며 휘파람부는 듯하고 노래하는 듯하니 지렁이가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구하는 것이 만족하기 쉬워 스스로 그 즐거움을 울어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삶이 누추함을 괴롭게 여겨 그 불행을 스스로 슬퍼하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자신이 내는 소리를 스스로 즐거워하여 다른 지렁이들을 불러대는 것인가.
어쩌면 그 시절이 이르고 기후가 변하여 자신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그치지 못해서인가. 어쩌면 그리도 시끄럽게 울면서 그치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이에 대해 느끼는 점이 있다.
별이 땅에 떨어질 때 투박하고 거친 것들이 변하여 惡石 이 된다. 별이 밝게 하늘에 있어서 萬物 이 우러르는 것은 精氣 가 모인 것이기 때문인데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와나 돌만도 못하게 된다.
사람이 죽어 뼈와 살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면 개미가 갉아먹으니 사람이 萬物 가운데 존귀한 것 역시 精氣 가 모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精氣 가 外物 에 끌려가지 않으면 내면에 쌓여 思慮 가 되며 밖으로 발휘되어 事業 이 되며 저술로 드러나 文章 이 되어 百代 의 앞에 밝게 빛나고 百代 의 뒤에 추앙하게 된다.
이는 별의 精氣 가 그 죽음을 따라 사라지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존귀하지 않겠는가. 살아서는 利欲 으로 精氣 를 소모시키고 죽어서는 부패하여 버려지는데,
미혹한 자는 바야흐로 “利欲 을 채운다면 내 몸을 厚 하게 돌볼 수 있다.”라고 떠들어댄다. 내가 이에 대해 느끼는 점이 있다.
하늘은 서쪽으로 運行 하고 日月 과 五星 은 모두 동쪽으로 운행한다. 해는 한 해에 한 바퀴 도는데 달은 해보다 빨라 한 달에 한 바퀴 돌며,
하늘은 또 달보다 빨라 하루에 한 바퀴 돌며, 별은 빠르거나 느린 경우가 있으며 거꾸로 가거나 바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넷은 각각 운행하면서 상호 모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움직이되 힘들지 않고 운행하면서 그치지 않아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시각도 쉰 적이 없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이 넷은 서로 의지하면서 낮과 밤, 사계절, 추위와 더위를 이루는 것이다. 한 시각이라도 쉬면 사계절이 그 고름을 유지할 수 없으며 萬物 이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없으니 그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 가운데 君子 가 있음에 그 맡고 있는 일이 역시 중요하니 萬世 가 다스려지는 것이며 萬物 이 이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고 하고, 또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고 말한 것은 그 맡은 일을 알고 있어서이다.
그렇다면 君子 가 학문을 함에 하루라도 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에 대해 느끼는 점이 있다.
내용 중에 道 에 가까운 말이 많다.
- 역주
-
역주1
雜說 三 幷序 :
이 글은 韓愈가 지은 〈雜說 四首〉를 모방하여 歐陽脩 자신의 인생 理想을 서술하였다. 첫 편에서는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짓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는 글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둘째 편에서는 공업을 세우되 名利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편에서는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발분하여 힘쓰고 自強不息하려는 다짐을 강조하였다. 세 편 모두 向上하고자 하는 정신이 충만한 것에 비추어 歐陽脩가 젊은 시절 지은 것으로 보인다. ‘幷序’는 본집에 ‘首’로 되어 있다.
雜說은 雜文에 속하는데 오늘날의 雜感이 사물에 빗대어 뜻을 말하고 어떤 일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것과 비슷하다. - 역주2 見日月星辰 : 본집에는 ‘視天與月星’으로 되어 있다.
- 역주3 聞草間蚯蚓之聲益急 : 옛사람들은 지렁이가 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爾雅≫에 “蚯蚓은 土蟺이라고도 하고 曲蟺이라고도 하는데 여름 밤에 풀밑에서 잘 운다. 그래서 江東 지역에서는 歌女라고 부른다. 鳴徹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 역주4 蚓食土而飮泉 : ≪荀子≫ 〈勸學〉에 “지렁이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단단한 근육이나 뼈가 없이 위로는 흙을 먹고 아래로는 黃泉을 마신다.”라고 하였다.
- 역주5 精氣之聚爾 : 옛사람은 星體가 하늘에 있으면서 빛을 발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으로 생명은 바로 精氣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莊子≫ 〈知北遊〉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氣가 모여서이니 모이면 태어나고 흩어지면 죽는다.[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라고 하였다.
- 역주6 螻蟻之食爾 : ≪莊子≫ 〈列禦寇〉에 “윗부분은 매에게 파먹히고 아랫부분은 개미에게 파먹힌다.[在上爲鳥鳶食 在下爲螻蟻食]”라고 하였다.
- 역주7 天西行 日月五星皆東行 : 옛사람은 하늘의 형태가 덮개와 같아서 하늘 덮개가 왼쪽, 즉 서쪽으로 돌므로 日月星辰은 동쪽으로 돈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漢代 桓譚은 ≪新論≫에서 “하늘은 덮개가 도는 것과 같아서 日月星辰은 이를 따라 東西로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五星은 金, 木, 水, 火, 土 다섯 行星을 가리킨다. ≪史記≫ 〈天官書〉에 “하늘에는 五星이 있고 땅에는 五行이 있다.”라고 하였다.
-
역주8
故曰……死而後已者 :
‘自彊不息’은 ≪周易≫ 乾卦에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死而後已’는 ≪論語≫ 〈泰伯〉에서 曾子가 이르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仁을 하기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않은가.[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