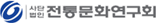25.1 有物混成하니 先天地生이라
25.2 寂兮寥兮여 獨立不改하고
25.3 周行而不殆하니 可以爲天下母라
注
[注]周行無所不至而免殆하고 能生全大形也라
故可以爲天下母也라
25.4 吾不知其名하여
注
[注]名以定形이라 混成無形하여 不可得而定이라
故曰 不知其名也라하니라
25.5 字之曰道라하고
25.6 强爲之名曰大라하니라
注
[注]吾所以字之曰道者는 取其可言之稱最大也일새라
責其字定之所由하면 則繫於大하니라
大有繫則必有分하고 有分則失其極矣라
故曰 强爲之名曰大라하니라
25.7 大曰逝요
注
[注]逝는 行也라 不守一大體而已하고 周行無所不至하니
故曰 逝也라하니라
25.8 逝曰遠이요 遠曰反이라
25.9
25.10 호되
注
[注]四大는 道天地王也라
凡物有稱有名이면 則非其極也라
言道則有所由한대 有所由然後라야 謂之爲道라하니
然則稱中之大也로 不若無稱之大也니라
無稱이면 不可得而名이라 曰 域也라하니라 道天地王은 皆在乎無稱之內라
故曰域中有四大者也라하니라
25.11 而王(居)[處]其一焉하니
注
[注]處人主之大也니라
25.12 人法地하고 地法天하고 天法道하고 道法自然이니라
注
[注]法은 謂法則也라
人不違地라야 乃得全安하니 法地也요
地不違天이라야 乃得全載하니 法天也요
天不違道라야 乃得全覆하니 法道也요
道不違自然이라야 方乃得其性하니 라하니라
法自然者는 在方而法方하고 在圓而法圓하니 於自然無所違也하니라
自然者는 無稱之言이요 窮極之辭也라
用智不及無知하고 而形魄不及精象하고
精象不及無形하고 有儀不及無儀라
故轉相法也라 道自然하니 天故資焉이요
天法於道하니 地故則焉이요
地法於天하니 人故象焉이니라
제25장에서 노자老子는 ‘무엇인가 섞여 이루어진 것’이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필은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므로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약간 비틀어 이야기하고 있다.
‘혼성混成’이란 만물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고, 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혼성混成’에서 ‘혼混’은 《장자》에 나오는 ‘혼돈渾沌(혼돈混沌)’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중국 신화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와 《장자》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신화에서는 혼돈을 어둑한 한 덩어리, 하나의 달걀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어두침침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반고盤古가 도끼를 힘껏 휘둘렀고, 그 바람에 달걀이 깨져 달걀 속에 있던 가볍고 맑은 기운은 점점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혼돈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변주하고 있다. 눈, 코, 입, 귀가 없는 존재인 혼돈을 답답하게 생각한 북해의 천제인 홀忽과 남해의 왕 숙熟이 매일 한 개씩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주어, 혼돈을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가儒家가 말하는 유위有爲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무위無爲란 유위有爲하는 사람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위이다. 노자는 근본적으로 유위有爲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무형無形(무명無名)을 통해서 심心(도道)을 말하려고 했다. 얼굴 표면 속에 감추어진 마음(내면)을 읽고자 했다는 것. 도를 통해 음양陰陽, 사시四時, 우리 삶의 이치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그럼으로써 주기적이며 규칙적인 규범적이고 규율적인 도道(길)를 찾고 싶었던 것이 노자의 관심이다.
‘혼성混成’이란 만물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고, 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혼성混成’에서 ‘혼混’은 《장자》에 나오는 ‘혼돈渾沌(혼돈混沌)’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중국 신화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와 《장자》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신화에서는 혼돈을 어둑한 한 덩어리, 하나의 달걀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어두침침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반고盤古가 도끼를 힘껏 휘둘렀고, 그 바람에 달걀이 깨져 달걀 속에 있던 가볍고 맑은 기운은 점점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혼돈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변주하고 있다. 눈, 코, 입, 귀가 없는 존재인 혼돈을 답답하게 생각한 북해의 천제인 홀忽과 남해의 왕 숙熟이 매일 한 개씩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주어, 혼돈을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가儒家가 말하는 유위有爲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무위無爲란 유위有爲하는 사람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위이다. 노자는 근본적으로 유위有爲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무형無形(무명無名)을 통해서 심心(도道)을 말하려고 했다. 얼굴 표면 속에 감추어진 마음(내면)을 읽고자 했다는 것. 도를 통해 음양陰陽, 사시四時, 우리 삶의 이치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그럼으로써 주기적이며 규칙적인 규범적이고 규율적인 도道(길)를 찾고 싶었던 것이 노자의 관심이다.

뒤섞인 가운데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이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다!
注
뒤섞여 있어 알 수 없는데 만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뒤섞인 가운데 이루어준다.”고 했다. 〈이미 《노자》 경經4.1에서 말하였듯이 나는〉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천지天地보다 먼저 생겨났다.
고요하고 텅 비었구나! 홀로 서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도〉 바뀌지 않고,
注
‘적료寂寥’는 아무런 형체가 없는 것이다.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 짝할 수 없으므로 ‘홀로 서다.’라고 했다.
돌아오고 변화하고 마치고 시작함에 그 항상됨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다.
두루 다니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미가 될 만하다.
注
두루 다녀서 이르지 못할 곳이 없으면서 위태로움을 면하고, 커다란 형체를 낳고 온전히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천하의 어미가 될 만한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注
이름이란 〈어떤 사물의〉 형체를 규정하는 것이다. 뒤섞인 가운데 이루어주고 형체가 없어 〈그 이름을〉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자字를 붙여 도道라고 하고
注
무릇 이름이란 그것을 통해 〈어떤 사물의〉 형체를 규정하는 것이요 자字란 그것을 통해 대략[가可]을 지칭하는 것이다.
도는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는 데에서 취한 것이다.
이것은 〈도道가〉 뒤섞여 있으면서 〈만물을〉 이루어주는 중에 말로 할 수 있는 지칭 가운데 가장 큰 것임을 말한 것이다.
억지로 이름을 지어 ‘크다’고 말하였다.
注
내가 자字를 지어 도道라고 말한 까닭은 그것이 말로 할 수 있는 지칭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자字를 정하게 된 까닭을 너무 깊이 따지면 ‘크다’는 말에 매이게 된다.
크다는 말에 매이게 되면 반드시 나뉨이 있고, 나뉨이 있으면 그 궁극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억지로 이름을 지어 ‘크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큰 것은 가기 마련이고,
注
서逝는 ‘다니다[행行]’는 뜻이다. 하나의 커다란 몸을 지키며 머물지 않고, 두루 다녀서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
그래서 “가기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가는 것은 멀어지기 마련이고, 멀어진 것은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注
원遠은 ‘다한다’는 뜻이다. 두루 다녀서 끝까지 다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나 한쪽으로 가는 데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멀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나아간 곳을 따르지 않으나 그 몸이 홀로 선다. 그래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 또한 크다.
注
“하늘과 땅이 낳은 만물의 본성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였는데 왕은 바로 사람의 주인이다.
비록 큰 것을 맡지는 않았으나 또한 다시 큰 것이 된다. 다른 세 가지 큰 것과 짝이 되기 때문에 “왕 또한 크다.”고 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영역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注
네 가지 큰 것이란 도, 하늘, 땅, 왕이다.
무릇 만물 가운데 지칭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그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도道라고 말하면 말미암는 것이 있는데 말미암는 것이 있은 후에야 그것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는 곧 지칭되어지는 것 가운데 큰 것으로 지칭이 없는 큰 것만 못하다.
지칭이 없으면 이름 지을 수 없는 까닭에 ‘역域’이라 하였다. 도, 하늘, 땅, 왕은 모두 지칭이 없는 영역 안에 있다.
그래서 “〈이름 지을 수 없는〉 영역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다.”고 했다.
왕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
注
〈왕 또한〉 사람의 주인이라는 커다란 〈자리에〉 처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注
법法이란 ‘본받는다[법칙法則]’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땅을 어기지 않아야 〈자신의〉 평안함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땅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땅은 하늘을 어기지 않아야 온전하게 〈만물을〉 실을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하늘은 도를 어기지 않아야 온전하게 〈만물을〉 덮어줄 수 있다. 이것이 “도를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어기지 않아야 〈만물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는 것은 네모난 데 있으면 네모남을 본받고 동그란 데 있으면 동그람을 본받으니, 스스로 그러함에 대해서 어기는 게 없는 것이다.
‘자연自然’이란 말은 지칭하는 게 없는 말이며 궁극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세상의 왕이 습관처럼 그렇게 하듯이〉 꾀를 쓰는 것은 ‘무지無知’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땅처럼〉 ‘물리적 형태[형백形魄]’가 있는 것은 〈하늘처럼〉 ‘정미한 기로 이루어진 상[정상精象]’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정미한 기로 이루어진 상’은 〈도와 같이〉 ‘무형無形’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음양陰陽과 같이 두 가지〉 ‘기준을 갖는 것[유의有儀]’은 〈스스로 그러함과 같이〉 ‘기준 없는 것[무의無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이와 같은 까닭에 돌아가며 서로 본받는 것이다. 도가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으니 하늘이 이러한 도를 바탕으로 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늘이 도를 본받으니 땅이 이러한 하늘을 본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땅이 하늘을 본받으니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이러한 땅을 본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누구든 다른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까닭은 아마도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 역주
- 역주1 不知其誰之子 : 經4.1에서 “湛兮似或存 吾不知其誰之子 象帝之先”이라 했는데, 王弼은 注4.1에서 “하늘과 땅 또한 결코 그에 미칠 수가 없는데 또한 帝보다 앞서는 듯하지 않은가? ‘제’란 천제이다.[天地莫能及之 不亦似帝之先乎 帝 天帝也]”라고 하였다.
- 역주2 寂寥 : 宇惠의 《王注老子道德經》에서 본래 ‘寂寥’가 ‘寂寞’이라 보았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3 無形體也 : 王弼은 《論語釋疑》에서 “공자가 말했다.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고 인에 의지하며 예에 노닐어라.’[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라고 한 부분의 ‘道’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도는 無의 지칭이니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미암지 않는 것도 없다. 〈그래서〉 비유하여 도라고 말하는데 〈이 도는〉 고요하여 몸체가 없으니 어떠한 象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도는 몸체로 삼을 수 없으므로 다만 뜻을 향할 뿐이다.[道者 無之稱也 無不通也 無不由也 況之曰道 寂然無體 不可爲象 是道不可體 故但志慕而已]”
- 역주4 3) 返化終始 : 이 말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注25.8에서 ‘反’의 의미를 이와 연관하여 풀이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
- 역주5 夫名以定形 字以稱可 : 《老子指略》에서는 “이름이란 저것(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칭이란 〈그 대상을〉 따라서 일컫는 것이다. 이름이란 저것(대상)으로부터 나오지만 지칭은 나에게서 나온다.[名也者 定彼者也 稱也者 從謂者也 名生乎彼 稱出乎我]”라고 하였다.
- 역주6 [行] : 저본에는 ‘行’이 없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注25.7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 역주7 故道大……而王(居)[處]其一焉 : 저본에는 ‘處’가 ‘居’로 되어 있으나, 아래 王弼 注에 ‘處’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 이 부분은 《淮南子》 〈道應訓〉에는 “天大 地大 道大 王亦大”라 되어 있고, 甯戚과 齊 桓公의 이야기로 설명한다. 이 이야기는 《呂氏春秋》 〈離俗覽 擧難〉, 《新序》 〈雜事〉에도 보인다. 《회남자》에서는 衛나라 출신의 甯戚이 齊 桓公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여 어렵게 기회를 갖는다. 환공은 영척이 들려준 천하를 다스리는 道에 감동하여 그를 쓰고자 하지만 신하들은 그가 위나라 출신이라 반대한다. 그러자 환공은 “한 사람의 작은 결점 때문에 그 사람의 큰 장점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이 군주가 천하의 선비를 잃는 까닭이다.[以人之小惡 而忘人之大美 此人主之所以失天下之士也]”고 하며 영척을 포용한다. 《회남자》는 환공의 방법이 옳다고 하면서 《노자》의 이 구절을 인용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대 《회남자》는 인재를 가리지 않는 포용성의 뜻으로 ‘왕이 크다’는 의미를 이해한 듯하다.
- 역주8 天地之性人爲貴 : 《孝經》 〈聖治〉 第9를 인용한 것이다. 본래 문장은 다음과 같다. 曾子가 말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성인의 덕 가운데 孝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과 땅이 낳은 만물의 본성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한데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는 효보다 큰 것이 없고, 효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존엄히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아버지를 존엄히 모시는 데 있어서는 하늘에 배합시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바로 周公이 그것을 실천한 분이다.[曾子曰 敢問聖人之德 無以加於孝乎 子曰 天地之性人爲貴 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則周公其人也]”
- 역주9 域中有四大 : 帛書本은 ‘國中有四大’, 竹簡本은 ‘國中有四大安’으로 되어 있다.
- 역주10 (是道)[道是] : 저본에는 ‘是道’로 순서가 바뀌어 있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바로잡는다.
- 역주11 [故] : 저본에는 ‘故’가 없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 역주12 [法自然也] : 저본에는 없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 역주13 (順)[法] : 저본에는 ‘順’으로 되어 있으나, 樓宇烈은 道藏集注本에 따라 ‘法’으로 수정하였는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法으로 일관되므로 이를 따른다.
- 역주14 所以爲主 其一之者主也 : 樓宇烈은 陶鴻慶의 설에 따라 “王所以爲主 其主之者一也”로 교감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왕이 주인 되는 까닭은 그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다.”로 풀이할 수 있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