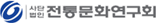32.1 道常無名이라
注
[注]道는 無形不繫하니 常不可名이라
以無名爲常이라 故曰 道常無名也라하고
樸之爲物은 以無爲心也이니 亦無名이라
故將得道면 莫若守樸하니라
夫智者는 可以能臣也요 勇者는 可以武使也요 巧者는 可以事役也요 力者는 可以重任也라
樸之爲物은 憒然不偏하고 近於無有라
故曰 莫能臣也라
抱樸하되 不以物累其眞하며 不以欲害其神하면 則物自賓而道自得也라
32.2 天地相合하면 以降甘露하고 民莫之令호대 而自均이니라
注
[注]言天地相合하면 則甘露不求而自降하며 我守其眞性無爲하면 則民不令而自均也라
32.3 始制에 有名이니 名亦旣有면 夫亦將知止니라
知止라야 所以不殆니라
注
[注]始制는 謂樸散始爲官長之時也라
始制官長에 不可不立名分以定尊卑라 故始制有名也라
過此以往하면 이라 故曰 名亦旣有면 夫亦將知止也라하니라
遂任名以號物하면 則失治之母也라 故知止所以不殆也니라
32.4 譬道之在天下는 猶川谷之與江海니라
제32장은 여러 가지 도가적道家的 개념들을 얽어서 말하고 있다. 제32장은 도道가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름 없음은 그 다음에 통나무와 연결된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는 또한 특정한 기능을 갖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직 어떤 특수한 형태도 취하고 있지 않다. 형태를 가진 것은 따라서 이름이 있지만, 형태를 갖지 않은 것 그래서 여전히 형태가 없는 것은 이름 지어지지 않는다. 통나무는 도의 무형성無形性 - 그렇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궁극적인 잠재성潛在性을 가리킨다. - 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의 무형성이란 또한 도의 이름 없음에 상응한다.
그 다음에 도는 정치권력의 행사라는 맥락에 놓인다. 이름이 없는 것은 기능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름이란 사회 속에서의 특정한 역할, 관직, 의무를 나타낸다. 이름이 없는 것은 특정한 업무가 없다. 이름 없음(Nameless)은 그러므로 군주권(rulership)에 상응한다.
도에 따라 다스리는 군주는 무위無爲를 통해 행위하고, 이는 또한 ‘스스로 그러함(자연自然)’ 또는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복종(natural subordination)으로 이끈다. 그런 군주는 강압적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제17장에서 말하였듯이 백성들은 오로지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그런 군주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하늘과 땅, 즉 천지는 ‘감로甘露(sweet dew)’를 내리는데, 이 말은 자연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번성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2장의 끝에 이르면 ‘그침의 완성(mastery of cessation)’ 또는 ‘멈출 때를 아는 것[지지知止]’이 언급되고 있다. ‘그침의 완성’이란 탐욕, 열망, 중독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는 기예로서 중요한 도가적 기술이다.
마지막 행은 제32장의 나머지와는 다소 연관성이 없다. 여기서 물의 상징이 다시 도입된다. 도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다른 모든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드는 수체(body of water)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산多産의 축으로서 도는, 생명이 자라나는 낮은 곳에 머무는 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도는 바다에 비유된다.
그 다음에 도는 정치권력의 행사라는 맥락에 놓인다. 이름이 없는 것은 기능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름이란 사회 속에서의 특정한 역할, 관직, 의무를 나타낸다. 이름이 없는 것은 특정한 업무가 없다. 이름 없음(Nameless)은 그러므로 군주권(rulership)에 상응한다.
도에 따라 다스리는 군주는 무위無爲를 통해 행위하고, 이는 또한 ‘스스로 그러함(자연自然)’ 또는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복종(natural subordination)으로 이끈다. 그런 군주는 강압적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제17장에서 말하였듯이 백성들은 오로지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그런 군주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하늘과 땅, 즉 천지는 ‘감로甘露(sweet dew)’를 내리는데, 이 말은 자연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생명이 번성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2장의 끝에 이르면 ‘그침의 완성(mastery of cessation)’ 또는 ‘멈출 때를 아는 것[지지知止]’이 언급되고 있다. ‘그침의 완성’이란 탐욕, 열망, 중독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는 기예로서 중요한 도가적 기술이다.
마지막 행은 제32장의 나머지와는 다소 연관성이 없다. 여기서 물의 상징이 다시 도입된다. 도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다른 모든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드는 수체(body of water)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산多産의 축으로서 도는, 생명이 자라나는 낮은 곳에 머무는 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도는 바다에 비유된다.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통나무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천하의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으니, 제후와 왕이 만약 이 〈도리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손님으로 올 것이다.
注
도는 형체가 없고 매이지 않으니 늘상 이름 지을 수 없다.
이름 없음을 늘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고 했다.
통나무라는 것은 ‘없음’을 마음으로 삼으니 또한 이름이 없다.
그러므로 장차 도를 얻으려면 통나무를 지키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 그 능력을 요구하는 신하로 삼을 수 있고, 용기가 있는 자는 군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기예가 뛰어난 자는 〈국가적인〉 사업을 담당케 할 수 있고, 힘이 강한 자는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다.
그런데 통나무라는 것은 뒤섞여 있어서 치우치지 않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무유無有]’에 가깝다.
그래서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통나무를 끌어안고 무위하되 외물로 참된 본성을 매이게 하지 않고 욕심으로 정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만물이 스스로 손님으로 오고 도가 저절로 얻어질 것이다.
천지가 서로 합하면 감로甘露가 내려오고 백성은 명령하지 않지만 저절로 균평해진다.
注
천지가 서로 합하면 감로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리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참된 본성과 무위의 〈도리를〉 지키면 백성이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균평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처음 〈관장官長을〉 제정함에 이름이 있게 되니 이름이 또한 이미 있다면 장차 그칠 줄 알아야 한다.
그칠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注
시제始制란 것은 통나무가 쪼개져 비로소 〈성인이〉 관장이 되는 때를 말한다.
처음 관장을 제정할 때에는 명분名分을 세워 존비尊卑를 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관장을〉 제정함에 이름이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면 장차 송곳이나 칼끝같이 작은 일에도 다투기 때문에 “이름이 또한 이미 있다면 장차 그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모름지기 이름에 맡겨 만물을 호명하면 다스림의 어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칠 줄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비유하건대 도道가 천하에 행해지는 것은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스스로〉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注
시내와 골짜기는 강과 바다를 구하지 않으니, 강과 바다가 〈시내와 골짜기를〉 부르지도 않는다. 〈강과 바다가〉 부르지도 않고 〈시내와 골짜기가〉 구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흘러드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하에 도를 행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균평해지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진다.
그래서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스스로〉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고 했다.
- 역주
- 역주1 [樸 雖小] : 저본에는 없으나, 帛書本을 비롯한 모든 판본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보충하였다.
- 역주2 天下莫能臣也 : 河上公本에는 ‘天下不敢臣’으로 되어 있고, 帛書本에는 ‘天下弗敢臣’으로 되어 있으니, “천하의 누구도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竹簡本에는 ‘天地弗敢能臣’으로 되어 있다.
- 역주3 (爲無)[無爲] : 저본에는 ‘爲無’로 되어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無爲’로 바로잡는다.
- 역주4 將爭錐刀之末 : 아주 소소한 일을 비유한 말로 《春秋左氏傳》 魯 召公 6년(3:96)에서 따온 말이다. “백성들이 소송의 법적 근거를 알게 되면 장차 禮를 버리고 법률의 조문만 찾아내어 송곳이나 칼날과 같이 작은 일에까지 다 소송하고자 할 것이다.[民知爭端矣 將棄禮而徵於書 錐刀之末 將盡爭之]”
- 역주5 川谷之(以)[不]求江與海 : 王弼은 바로 이어서 ‘不召不求’라 했으니 “시내와 골짜기가 강과 바다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필이 바로 뒤에서 부연하고 있듯이 성인이 명령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하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自歸’는 뒤의 ‘自均’과 ‘自得’에 호응하는데 本文의 ‘川谷之與江海’를 王弼은 ‘自歸’로 풀이한 것이니 이에 따라 “스스로 흘러든다.”로 번역하였다.
- 역주6 (以)[不]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永樂大典本에는 ‘不’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바그너는 본문과 같이 수정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이와 달리 樓宇烈은 ‘川谷之與江海’로 原文을 반복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뒤의 문장에서 ‘不求’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바그너의 설을 따라 ‘不’로 되어 있는 永樂大典本을 따른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