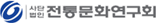5.1 天地不仁하여 以萬物爲芻狗하고
注
故不仁也라하니라 仁者는 必造立施化하니 有恩有爲로되
造立施化하면 則物失其眞이요
有恩有爲면 則物不具存이요 物不具存하면 則不足以러라
地 不爲獸生芻하나 而獸食芻하고 不爲人生狗하나 而人食狗하니
無爲於萬物이면 而萬物各適其所用하니 則莫不贍矣라
若慧由己樹하면 未足任也라
5.2 聖人不仁하여 以百姓爲芻狗로다
注
[注]일새 以百姓比芻狗也라
5.3 天地之間은 其猶槖籥乎인저 虛而不屈하고 動而愈出이라
注
[注]槖은 排槖也요 籥은 樂籥也라
槖籥之中은 空洞하여 無情無爲라
故虛而不得窮屈하고 動而不可竭盡也라
天地之中은 蕩然任自然이라 故不可得而窮이 猶若槖籥也라
5.4 이니라
注
[注]愈爲之하면 則愈失之矣라 라
槖籥而守數中하면 則無窮盡하니 棄己任物이면 則莫不理하니
도가道家의 성인은 인간의 덧없음에서 자유롭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결정하려는 충동에서도 자유로운 유일한 인간이다. 즉, 추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려는, 이것은 선善이고 저것은 악惡이라 규정하려는, 죽는 것을 사는 것보다 더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여기려는, 하나의 의견은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려는 어떠한 욕망도 가지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도가의 성인이 그러한 인간의 특성들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이 그러한 것으로 “내면적으로 자신의 인격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성인은 따라서 인도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다.
‘인도적인’ 것 대신에 도가의 성인은 하늘과 땅의 태도를 가지고 인간을 마치 ‘짚강아지[추구芻狗]’처럼 대한다. 고대와 근대의 주석자들이 다 같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짚강아지는 희생제에서 대단히 숭배되는 요소지만 의례 이후엔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그저 버려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가의 성인은 사람들에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는 《노자》의 다섯 번째 장이 유학자儒學者와 ‘인본주의자人本主義者’의 의례에 대한 집착을 공격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례, 특히 죽음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은 유교 문화에서는 최우선시된다. 버려진 짚강아지를 언급하는 것은 의례적 수행을 조롱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영속성 - 인간의 선조와 그 일족들의 영속성 - 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되는 의례는 대단히 일시적인 사건이다. 의례가 끝나자마자, 그 의례에 사용된 도구들은 그것들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여기에서 《노자》는 인간의 영속성에 대한 유교의 탐구를 실패한 것으로 비판하는 듯 보인다. 도가의 관점에서 영속성은 〈선조와 일족의〉 진행 중인 존재에 대한 기념에 기반을 둘 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는 변화의 인식에만 기반을 둘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영속적이지 않고 유교적인 의례는 또한 인간을 그러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게다가 도가적 관점에서 유교의 의례는 삶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적 집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장자》처럼 《노자》도 죽음에 대한 유교의 감정적 집착을 비판한다. 도학자에게, 삶을 죽음보다 선호하는 인간적 경향에서 생겨난 그러한 감정적 애착은 짚강아지에 대한 감정적 애착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짚강아지의 이미지가 유교의 의례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이 그 이미지와 얽혀 있는 ‘인본주의(humanism)’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다. 하늘과 땅과 마찬가지로 도가의 성인은 특히 ‘인간적’이거나 각별하게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도가 성인에게 인간은 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심지어 짚강아지하고도 다르지 않다! 인간은 마치 짚강아지가 의례 수행 뒤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삶에서 사라진다. 짚강아지가 아궁이를 위한 연료가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늘의 조상이 아니라, 도가의 성인 - 《노자》 5장 세 번째 부분에서 인간이 아닌 풀무에 비견되는 존재 - 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이것은 물론 성인들이 인류를 싫어한다거나 심지어 경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다른 종보다 인간 종에 더하거나 덜한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인들은 스스로를 비워냄에 있어 감정을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의 성性과 종種까지 버린다.
‘인도적인’ 것 대신에 도가의 성인은 하늘과 땅의 태도를 가지고 인간을 마치 ‘짚강아지[추구芻狗]’처럼 대한다. 고대와 근대의 주석자들이 다 같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짚강아지는 희생제에서 대단히 숭배되는 요소지만 의례 이후엔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그저 버려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가의 성인은 사람들에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는 《노자》의 다섯 번째 장이 유학자儒學者와 ‘인본주의자人本主義者’의 의례에 대한 집착을 공격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례, 특히 죽음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은 유교 문화에서는 최우선시된다. 버려진 짚강아지를 언급하는 것은 의례적 수행을 조롱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영속성 - 인간의 선조와 그 일족들의 영속성 - 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되는 의례는 대단히 일시적인 사건이다. 의례가 끝나자마자, 그 의례에 사용된 도구들은 그것들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여기에서 《노자》는 인간의 영속성에 대한 유교의 탐구를 실패한 것으로 비판하는 듯 보인다. 도가의 관점에서 영속성은 〈선조와 일족의〉 진행 중인 존재에 대한 기념에 기반을 둘 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는 변화의 인식에만 기반을 둘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영속적이지 않고 유교적인 의례는 또한 인간을 그러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게다가 도가적 관점에서 유교의 의례는 삶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적 집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장자》처럼 《노자》도 죽음에 대한 유교의 감정적 집착을 비판한다. 도학자에게, 삶을 죽음보다 선호하는 인간적 경향에서 생겨난 그러한 감정적 애착은 짚강아지에 대한 감정적 애착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짚강아지의 이미지가 유교의 의례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이 그 이미지와 얽혀 있는 ‘인본주의(humanism)’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다. 하늘과 땅과 마찬가지로 도가의 성인은 특히 ‘인간적’이거나 각별하게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도가 성인에게 인간은 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심지어 짚강아지하고도 다르지 않다! 인간은 마치 짚강아지가 의례 수행 뒤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삶에서 사라진다. 짚강아지가 아궁이를 위한 연료가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늘의 조상이 아니라, 도가의 성인 - 《노자》 5장 세 번째 부분에서 인간이 아닌 풀무에 비견되는 존재 - 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이것은 물론 성인들이 인류를 싫어한다거나 심지어 경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다른 종보다 인간 종에 더하거나 덜한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인들은 스스로를 비워냄에 있어 감정을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의 성性과 종種까지 버린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짚강아지처럼 여기고
注
하늘과 땅은 저절로 그러함에 맡겨 함도 없고 만듦도 없으나 만물이 스스로 서로를 다스린다.
그래서 ‘어질지 않다’고 한 것이다. ‘어질다’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 세우고 펼쳐서 변화시키니 은혜가 있고 함이 있다.
그러나 만들어 세우고 펼쳐서 변화시키게 되면 만물은 그 참된 본성을 잃게 될 것이요,
은혜가 있고 함이 있게 되면 만물이 함께 보존될 수 없고, 만물이 함께 보존될 수 없으면 온전히 실어주기에는 부족하게 된다.
하늘과 땅이 짐승을 위하여 꼴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들은 꼴을 먹고, 사람을 위하여 개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개를 먹는다.
만물에 무위無爲하면 만물은 저마다 제가 쓰일 바에 맞추어 나아가게 되니 넉넉하지 못함이 없게 된다.
만약 지혜가 자기로부터 세워지게 되면 맡기기에 부족하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짚강아지로 여긴다.
注
성인은 천지와 그 덕이 합치하기에 백성을 짚강아지에 견준 것이다.
하늘과 땅의 사이는 아마도 풀무나 피리와 같지 않은가? 비어 있으나 쪼그라들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注
‘탁槖’은 ‘풀무[배탁排槖]’이고 ‘약籥’은 ‘피리[악약樂籥]’이다.
풀무와 피리의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어떠한 마음도 없고 무언가 함도 없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서도 다하여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고 움직여도 다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늘과 땅의 가운데는 텅 비어 스스로 그러함에 맡긴다. 그래서 다할 수 없는 것이 마치 풀무나 피리와 같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가운데를 지키느니만 못하다.
注
하면 할수록 더욱 잃게 된다. 만물이 〈군주의〉 지혜를 피하고 하는 일마다 〈군주의〉 말과 어긋나니, 그 지혜가 다스려지지 않고 그 말은 조리에 맞지 않게 되어 반드시 막히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풀무와 피리가 그 속을 지키면 궁하거나 다함이 없다. 자신을 버리고 만물에게 맡기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만약 풀무와 피리가 어떤 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갖게 되면 함께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 역주
- 역주1 天地……萬物自相治理 : 王弼에 따르면 ‘無爲’란 무엇보다도 天地가 운행하면서 만물을 키우는 근원적인 방식을 형용하는 용어이다. 《노자주》에는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에 대한 발생론적 언급은 없다. 단지 그에게 이 세계는 천지라는 주어진 세계로 존재할 뿐이며, 그것은 이미 본연의 질서[道]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란 바로 그러한 본연의 질서에 따라 인간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聖人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천지자연의 세계는 이미 본래적인 질서가 구현되어 있는 세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천지가 드러내는 ‘본래 그러함’에 의해 인도된다. 이러한 천지 세계가 具有하고 있는 ‘본래 그렇게 질서를 이루는 본성’은 만물의 ‘情’, ‘眞’과 같은 용어로 표현된다. 각각의 개체는 전체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타고난 본성을 내부에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운행 과정에서 천지는 ‘무위’하지만, 모든 만물들은 저절로 질서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무엇보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 역주2 (載矣)[備載] : 저본에는 ‘備載’가 ‘載矣’로 되어 있으나, 樓宇烈과 바그너는 劉惟永集義本에 따라 ‘備載’로 확정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따른다. ‘備載’란 波多野太郞에 따르면 그 뜻은 ‘全載’, 즉 온전히 싣는다는 뜻으로 보았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3 [天] : 저본에는 없으나 樓宇烈은 道藏集注本에 근거하여 天을 보완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 역주4 聖人與天地合其德 : 《周易》 乾卦 〈文言傳〉에서 따온 말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인이란 天地와 그 덕이 합치하고, 日月과 그 밝음이 합치하며, 四時와 그 순서가 합치하며, 鬼神과 그 길흉이 합치한다. 그리하여 하늘에 앞서지만 하늘조차 그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뒤에 서되 하늘의 때를 받든다. 하늘 또한 그를 어기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나 귀신이 어기겠는가.[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이를 통해 보면 王弼의 聖人은 《周易》의 大人에 해당한다. 이는 注17.1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역주5 多言數(삭)窮 不如守中 : 帛書本에는 ‘多聞數窮 不若守於中’으로 되어 있다. 이석명은 多言이 언변의 유창함을 뜻하는 반면 多聞은 知와 관련된 것으로 《老子》 經3.4의 ‘無知無欲’처럼 知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에 비추어볼 때 본래 《노자》는 ‘多言數窮’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淮南子》 〈道應訓〉은 이 부분을 王壽와 徐馮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지혜[知]란 때를 아는 것인데, 책에는 이러한 지혜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하면서 《노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韓非子》 〈喩老〉에도 보인다.
- 역주6 物避其慧……必窮之數也 : 樓宇烈은 “物樹其慧 事錯其言 不慧不濟 不言不理”라고 보았으나, 바그너는 注17.4 “不能法以正齊民 而以智治國 下知避之 其令不從 故曰侮之也”라고 한 것, 注10.4에서 “能無以智乎 則民不辟而國治之也”라고 한 것, 注18.2에서 “行術用明 以察姦僞 趣覩形見 物知避之 故智慧出則大僞生也”라 한 것을 근거로 “物避其慧 事錯其言 其慧不齊 其言不理”라고 교감하였는데, ‘避’를 ‘樹’로 본 樓宇烈의 제안보다 바그너의 논의가 자연스러워 이를 따른다.
- 역주7 若槖籥有意於爲聲也 則不足以共吹者之求也 : 儒家의 정치사상은 제도적으로 ‘聖君賢臣’의 정치로 요약된다. 왕필이 말하는 ‘피리를 부는 자’는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왜 孔子는 평생토록 周公을 사모하였던 것일까? 왕도 아니었고, 단지 재상으로서 자신의 조카인 成王을 보좌하던 ‘賢臣’인 주공을 사모하였던 것일까? 본래 治의 구심을 이루는 ‘國’의 본질은 비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의 주체인 왕 또한 마땅히 스스로를 비워야 한다. 도가에서는 帝王이 스스로를 비워야 누구도 감히 그를 넘볼 수 없고, 속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유가는 다른 이유로 제왕에게 스스로를 비우라고 요구한다. 왕은 국가를 상징하는, 천하 만민을 대표하는 피리이다. 피리가 속이 비어 있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 유가란 속이 빈 천하라는 피리, 국가와 인간 세계의 상징인 왕이라는 피리를 부는 음악가인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은 魏晉時代에 개화하는 士大夫의 정신적 자각을 표상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군주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던 漢代의 賦 문학과 달리 위진시대에 이르게 되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사대부의 개성에 대한 자각이 싹트게 되고, 이러한 개인적인 정조를 문학을 통해 표출하는 현상이 전개된다. 왕필의 사상은 당시의 이러한 사상적 자각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오로지 제왕을 중심으로 황로학적 이상을 드러내는 《하상공장구》의 성인관과 다르다. 《노자》 經62.6에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둔다.[立天子 置三公]”는 구절에 대해 道를 실천의 방법으로 보는 왕필과 달리 《하상공장구》에서는 “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欲使敎化不善之人]”라고 애매하게 회피하는 주석을 하여 ‘삼공’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상공장구》에 나오는 ‘公’은 그래서 ‘公正’, ‘公平無私’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하상공장구》의 성인이 養生의 도를 실천하는 제왕이라면, 《노자주》의 성인은 《주역》 〈문언전〉의 大人이다. 이런 점에서 《하상공장구》와 《노자주》의 성인관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것은 송명 신유학의 정치사상과 분명하게 이어지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