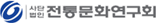23.1 希言이 自然이라
注
[注]聽之不聞名曰希라하니 下章에 言道之出言은 淡兮其無味也니 視之不足見하고 聽之不足聞하니
然則無味不足聽之言은 乃是自然之至言也라
23.2 故飄風은 不終朝며 驟雨는 不終日이니
注
[注]言暴疾美興은 不長也라
23.3 故하고
注
[注]從事는 謂擧動從事於道者也라 道는 以無形無爲로 成濟萬物이라
故從事於道者는 以無爲爲하고 不言爲敎하며
緜緜若存이로되 而物得其眞하니라
與道同體라 故曰 同於道라하니라
23.4 하고
注
[注]得은 少也니 少則得이라
故曰得也라 行得則與得同體라 故曰 同於得也라
23.5 失者同於失이라
注
[注]失은 累多也니 累多則失이라
故曰失也라 行失則與失同體라 故曰同於失也라
注
[注]言隨이라 故同而應之하니라
23.7 이라
제23장은 노자老子의 말하기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이는 유가儒家가 취하는 것과는 사뭇 구분된다.
《논어論語》 〈양화陽貨〉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기술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네 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장하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자왈子曰 여욕무언予欲無言 자공왈子貢曰 자여불언子如不言 즉소자하술언則小子何述焉 자왈子曰 천하언재天何言哉 사시행언四時行焉 백물생언百物生焉 천하언재天何言哉]” 스승 공자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말이란 무엇일까? 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공자는 그것을 거부한 것일까? 고대 중국의 직하稷下 계열의 문헌인 《관자管子》 〈내업內業〉에서는 “한마디 말이 얻어지면 하늘 아래 모두가 복종하고, 한마디 말이 정해지면 하늘 아래 모두가 경청한다.[일언득이천하복一言得而天下服 일언정이천하청一言定而天下聽]”고 한다. 고대 중국의 지식인 세계에서 ‘말한다는 것[언言]’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말을 한다는 것, 특히 도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하와 관련된다. 천하에 대고서 어찌 허언虛言을 하겠는가? 어쩌면 공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대 중국의 직하稷下 계열의 문헌인 《관자管子》 〈내업內業〉에서는 “한마디 말이 얻어지면 하늘 아래 모두가 복종하고, 한마디 말이 정해지면 하늘 아래 모두가 경청한다.[일언득이천하복一言得而天下服 일언정이천하청一言定而天下聽]”고 한다. 고대 중국의 지식인 세계에서 ‘말한다는 것[언言]’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말을 한다는 것, 특히 도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하와 관련된다. 천하에 대고서 어찌 허언虛言을 하겠는가? 어쩌면 공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어도 도를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면 나와 일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숨는다. 나라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는데도 가난하고 미천한 것은 치욕이요, 나라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부유하거나 귀한 것은 치욕이다.[자왈子曰 독신호학篤信好學 수사선도守死善道 위방불입危邦不入 난방불거亂邦不居 천하유도즉현天下有道則見 무도즉은無道則隱 방유도邦有道 빈차천언貧且賤焉 치야恥也 방무도邦無道 부차귀언富且貴焉 치야恥也]”
그런데 《노자》의 말은 이와 다르다. 《노자》는 공자처럼 ‘불언不言’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노자》도 ‘불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불언지교行不言之敎”를 외치는 듯하지만, 실상 그가 말하는 진의는 다른 곳에 있다. 제왕은 말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하상공주河上公注는 아주 단순하다. “희언이란 말을 아끼라는 뜻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의 도이다.[희언자希言者 위애언야謂愛言也 애언자愛言者 자연지도自然之道]” 황제가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법과도 같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실언失言은 용서되지 않는다. 아낄수록 좋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왕필王弼은 말을 돌린다. ‘희언希言’에 나름 심원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노자》 경經14.1에서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희希’라 한다.”고 했고, 《노자》 경經35.3에서는 “도에 대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고 쳐다보아도 잘 보이지 않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무 맛이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곧 자연自然의 지극한 말이다.
‘희希’는 이미 《노자》에서 말하듯,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단순하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을 초월하여 있는 실체나 선험적 존재에 대한 말은 아니다. 왕필은 그것이 ‘자연의 지극한 말’ 또는 ‘도에 대해 하는 말’이라고 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어論語》 〈양화陽貨〉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기술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네 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장하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자왈子曰 여욕무언予欲無言 자공왈子貢曰 자여불언子如不言 즉소자하술언則小子何述焉 자왈子曰 천하언재天何言哉 사시행언四時行焉 백물생언百物生焉 천하언재天何言哉]” 스승 공자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말이란 무엇일까? 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공자는 그것을 거부한 것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어도 도를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면 나와 일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숨는다. 나라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는데도 가난하고 미천한 것은 치욕이요, 나라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부유하거나 귀한 것은 치욕이다.[자왈子曰 독신호학篤信好學 수사선도守死善道 위방불입危邦不入 난방불거亂邦不居 천하유도즉현天下有道則見 무도즉은無道則隱 방유도邦有道 빈차천언貧且賤焉 치야恥也 방무도邦無道 부차귀언富且貴焉 치야恥也]”
그런데 《노자》의 말은 이와 다르다. 《노자》는 공자처럼 ‘불언不言’을 말하지 않는다. 물론 《노자》도 ‘불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불언지교行不言之敎”를 외치는 듯하지만, 실상 그가 말하는 진의는 다른 곳에 있다. 제왕은 말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하상공주河上公注는 아주 단순하다. “희언이란 말을 아끼라는 뜻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의 도이다.[희언자希言者 위애언야謂愛言也 애언자愛言者 자연지도自然之道]” 황제가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법과도 같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실언失言은 용서되지 않는다. 아낄수록 좋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왕필王弼은 말을 돌린다. ‘희언希言’에 나름 심원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노자》 경經14.1에서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희希’라 한다.”고 했고, 《노자》 경經35.3에서는 “도에 대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고 쳐다보아도 잘 보이지 않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무 맛이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곧 자연自然의 지극한 말이다.
‘희希’는 이미 《노자》에서 말하듯,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단순하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을 초월하여 있는 실체나 선험적 존재에 대한 말은 아니다. 왕필은 그것이 ‘자연의 지극한 말’ 또는 ‘도에 대해 하는 말’이라고 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맛이 없고〉 들리지 않는 말이 자연〈에 대한〉 지극한 말이다.
注
〈《노자》 경經14.1에서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희미하다[희希]’”고 했고, 뒤의 장 〈《노자》 경經35.3에서는〉 “도에 대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고 보아도 잘 보이지 않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무 맛이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곧 자연自然에 대한 지극한 말이다.
그러므로 사나운 회오리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않고, 퍼붓는 소낙비는 한나절을 가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注
사납고 빠르고 아름답고 급히 일어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자는 도를 행하는 것이 도와 같아지고,
注
종사從事란 거동함에 있어 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형체도 없이 함도 없이 만물을 이루고 다스린다.
그래서 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자는 〈《노자》 2장에서 말한 성인과 같이〉 “무위無爲로써 거하고 말하지 않음을 가르침으로 삼으며”,
〈《노자》 6장에서 하늘과 땅의 뿌리처럼〉 “면면히 이어지는 듯이” 하는데 만물은 저마다의 ‘참된 본성[진眞]’을 얻는다.
도를 행하면 도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도와 같아진다.”고 한 것이다.
〈도를〉 얻도록 〈적게 행하는〉 자는 얻음과 같아지고,
注
득得은 ‘적어진다’는 뜻이다. 〈《노자》 경經22.5에서 말하였듯이〉 적어지면 얻는다.
그래서 ‘얻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얻음을 행하면 얻음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얻음과 같아진다.”고 했다.
〈도를〉 잃도록 〈매이는 게 많은〉 자는 잃음과 같아질 것이다.
注
실失은 ‘매이는 게 많다’는 뜻이다. 매이는 것이 많으면 〈도를〉 잃게 된다.
그래서 “잃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잃음을 행하면 잃음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잃음과 같아진다.”고 했다.
도와 같아진 사람은 도 또한 그를 즐거이 얻을 것이요, 얻음과 같아진 자는 얻음 또한 즐거이 그를 얻을 것이요, 잃음과 같아진 자는 잃음 또한 즐거이 그를 얻을 것이다.
注
저마다 그 행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같은 것이 그에 응한다는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윗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생겨난다.
注
〈나라를 다스리는〉 윗사람에게 충실함과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생겨난다.
- 역주
- 역주1 孰爲此者……而況於人乎 : 帛書本은 “孰爲此者 天地尙不能久 而況於人乎”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크게 다르다. 王弼本에 의거할 때 이 문장은 앞의 문장 즉 “사나운 회오리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않고, 퍼붓는 소낙비는 한나절을 가지 않는다.”는 자연현상의 주재자로서 天地를 지목한 후에 이러한 天地조차 오래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帛書本의 논리는 소낙비와 회오리바람 그 자체가 天地가 드러난 현상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현상들이 오래가지 않음을 지적한 문장으로 뜻이 바뀐다. 이석명은 《帛書老子》에서 天地를 옮겨 쓰는 과정에 생긴 오류로 추정한다. 하지만 河上公本, 傅奕本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인 점을 보면 이것은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漢代 宇宙論이 天地論으로 형성되는 과정 이전과 이후를 반영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이거나, 아니면 《周易》이 天地에서 시작하는 완정한 우주론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필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역주2 從事於道者 道者同於道 : 《淮南子》 〈道應訓〉에는 “從事於道者 同於道”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갈고리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莊子》 〈知北遊〉에도 나온다. 《회남자》에서는 大司馬의 집에 갈고리를 만드는 사람이 나이 80이 되어도 여전히 정교한 기술을 잃지 않았는데, 대사마가 묻자 그는 나이 20부터 오로지 갈고리 만드는 일에만 매달리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고 답한다. 그리고 《노자》의 이 구절을 인용한다. 《회남자》의 취지는 오로지 道에만 전념해야 도와 같아진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듯하다.
- 역주3 (君)[居] : 저본에는 ‘居’가 ‘君’으로 되어 있는데 樓宇烈은 注17.1, 注63.1, 注72.1을 근거로 ‘居’라고 보았다. 특히 注72.1에서 왕필은 ‘淸靜無爲謂之居’라 하였는데, 이는 “〈커다란 사업이나 전쟁을 일으킴 없이〉 맑고 고요히 무위함을 일컬어 ‘거하다’고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樓宇烈은 ‘居’를 ‘편안하다[安]’는 뜻으로 보았다.
- 역주4 [行道則] : 저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런데 바그너는 아래의 注23.4 ‘行得則’, 注23.5 ‘行失則’과 짝이 되므로 삽입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는데, 타당하므로 이를 따라 보충하였다.
- 역주5 (德)[得]者同於(德)[得] : 河上公本과 王弼本은 모두 “德者同於德”으로 되어 있으나, 바그너는 王弼의 注文에서 “得 少也”, “故曰 同於得也”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得者同於得”이라 보았다. 이 章의 흐름을 道와 德을 논한 것으로 본다면 “德者同於德”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韓非子》에서 德을 得으로 본 것이나 王弼이 德을 得으로 풀이한 것을 보면 “得者同於得”이라 해도 그 의미의 차이는 없다. 다만 이어지는 文章에서 得이 失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得者同於得”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바그너의 견해를 따라 고친다.
- 역주6 同於道者……失亦樂得之 : 帛書本은 “同於得者 道亦得之 同於失者 道亦失之”라고 되어 있다. 풀이하면 “얻음과 같아진 자는 도 또한 그를 얻을 것이요, 잃음과 같아진 자는 도 또한 그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여 오로지 道와의 관계에서 得失을 말하였다.
- 역주7 (行其所)[其所行] : 저본에는 ‘行其所’로 되어 있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其所行’으로 바로잡는다.
- 역주8 信不足焉 有不信焉 : 같은 문장이 經17.5에도 나온다. 樓宇烈은 帛書本에 이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經17.5의 經과 注가 여기에 잘못 삽입된 것이라 추정하였다.
- 역주9 (下)[上] : 저본에는 ‘上’이 ‘下’로 되어 있다. 여기의 經文은 17.5에도 나오는데, 앞의 맥락에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君臣 혹은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함축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그너는 이 맥락을 고려할 때 여기의 문장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아 ‘下’가 ‘上’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王弼의 사상적 입장과 상통하므로 이를 수용하여 ‘下’를 ‘上’으로 바꾼다. 김학목은 《노자도덕경과 왕필의 주》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충실함과 진실성이 부족하니 이에 불신이 생긴다.”고 옮겼는데 같은 맥락이다.
- 역주10 (也)[焉] : 저본에는 ‘焉’이 ‘也’로 되어 있는데, 經17.5와 앞의 經文에 비추어볼 때 ‘焉’이 타당한 듯하다. 樓宇烈 또한 ‘焉’으로 보았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