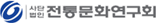16.1
注
[注]言致虛면 라
16.2 萬物竝作에
注
[注]動作生長이라
16.3 吾以觀復이라
注
[注]以虛靜으로 觀其反復이라
凡有起於虛하고 動起於靜이라
故萬物雖幷動作하나 卒復歸於虛靜하니 是物之極篤也라
16.4 夫物이 芸芸이나 各復歸其根이라
注
[注] 各反其所始也라
16.5 歸根曰靜이요 復命이요 復命曰常이요
注
[注]歸根則靜이라 故曰靜이요 靜則復命이라 故曰復命也라
復命則得性命之常이라 故曰常也라
16.6 知常曰明이라하니 不知常이면 이나
注
[注]常之爲物은 不偏不彰하고 無昧之狀 溫凉之象이라
故曰 知常曰明也라
唯此復은 乃能包通萬物하여 無所不容이라
失此以往은 則邪入乎分하니 則物離이라
故曰 不知常則妄作凶也니라
16.7 知常이면 容이니
注
[注]無所不包通也라
16.8 容乃公이요
注
[注]無所不包通이면 則乃至于蕩然公平也라
16.9 公乃王이요
注
[注]蕩然公平하면 則乃至于無所不周普也라
16.10 王乃天이요
注
[注]無所不周普하면 則乃至于同乎天也라
16.11 天乃道요
注
[注]與天合德하고 體道大通이면 則乃至于極虛無也라
16.12 道乃久니
16.13 沒身不殆니라
제16장은 ‘허정虛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텅 비어 있음이 사물의 참되고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만물은 움직여서 일어나 생겨나고 자라지만 결국 허정한 곳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니, 텅 비어 있어야 만물이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정한 곳이 뿌리인 셈이다. 왕필王弼은 이를 ‘성명지상性命之常(본분의 마땅함)’이라고 풀고 있다. ‘성명지상性命之常’을 아는 것을 ‘명明(밝은 지혜)’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명지상性命之常’을 알게 되면 모든 것과 통하게 되고 공정하게 되며, 왕이 되고 하늘이 되며, 도를 얻게 되고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양론修養論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노자》에서 영성靈性 수련의 세 가지 화두를 말하여 ‘몸성히’, ‘맘놓이’, ‘바탈퇴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맘놓이’가 바로 자기를 비우는 행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바탈퇴히’는 나의 바탕(자아)을 태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내 못된 버릇과 내 악한 바탕을 끊임없이 태워 변화시키고 새 바탈(나)을 낳는 것, 종국에는 나를 아주 벗어버리는 것’이 수양의 요체라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양론修養論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노자》에서 영성靈性 수련의 세 가지 화두를 말하여 ‘몸성히’, ‘맘놓이’, ‘바탈퇴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맘놓이’가 바로 자기를 비우는 행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바탈퇴히’는 나의 바탕(자아)을 태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내 못된 버릇과 내 악한 바탕을 끊임없이 태워 변화시키고 새 바탈(나)을 낳는 것, 종국에는 나를 아주 벗어버리는 것’이 수양의 요체라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마음을〉 비운 상태를 유지하면 〈만물이〉 지극해지고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지키면 〈만물이〉 돈독해진다.
注
〈마음을〉 비운 상태를 유지하면 만물이 지극해지고,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면 만물의 참된 본성이 바르게 된다는 말이다.
만물이 함께 자라나는데
注
〈만물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자라난다.
나는 돌아옴을 볼 뿐이다.
注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함으로써 만물이 돌아옴을 본다는 말이다.
무릇 있음이란 비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움직임이란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같이 활동하지만 결국에는 비어 있고 고요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니, 이 때문에 만물이 지극하고 돈독해진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 뒤엉키지만 각각 제 뿌리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注
근根이란 〈만물의〉 ‘처음’이니 각각 그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 ‘고요하다[정靜]’고 하고, 고요함을 일컬어 〈만물이 각각 자신의〉 ‘성명性命으로 돌아간다[복명復命]’고 하고, 〈만물이 각각 자신의〉 성명으로 돌아감을 일컬어 ‘늘 그러하다[상常]’고 하고,
注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해지므로 ‘고요하다’고 했다. 고요해지면 〈만물이 각각 본래의〉 성명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본래의〉 성명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성명으로 돌아가면 성명의 늘 그러함을 얻게 되므로 ‘늘 그러하다’고 했다.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일컬어 ‘밝다[명明]’고 한다.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게 흉한 일을 하게 되나,
注
‘늘 그러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으며, 밝거나 어두운 모습도 따뜻하거나 차가운 형상도 없다.
그러므로 ‘〈만물이〉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일컬어 밝다고 한다.’고 한 것이다.
오로지 이와 같은 〈만물의〉 ‘돌아옴’은 만물을 끌어안고 통할 수 있어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잃어버린 뒤로부터는 사특함이 〈만물 사이의〉 명분에 끼어들게 되니, 곧 만물이 자신의 명분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만물이〉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게 흉한 일을 하게 된다.”고 했다.
늘 그러함을 알면 포용하게 되니,
注
끌어안아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포용하게 되면 공평해지고,
注
끌어안아 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곧 크게 공평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공평하게 되면 〈진정한 천하의〉 왕자王者가 되고,
注
크게 공평해지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진정한 천하의〉 왕자가 되면 하늘의 도에 합치하고,
注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면 하늘과 〈도를〉 함께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하늘의 도에 합치하게 되면 도와 같아지고,
注
하늘과 덕이 합치하고 도를 체득하여 크게 통하면 허무의 상태를 극도에 달하게 함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도와 같아지면 오래 가니
注
허무의 상태를 극도에 달하게 하여 만물의 늘 그러함을 얻으면, 곧 다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注
‘무無’라는 것은 물이나 불로 해칠 수 없고 쇠나 돌로 깨뜨릴 수 없다.
〈군주가〉 무無를 마음에 쓰면 호랑이나 외뿔소가 그 발톱이나 뿔로 덤빌 곳이 없고 칼과 창의 날로 찌를 곳이 없으니, 어찌 위태로움이 있겠는가!
- 역주
- 역주1 致虛……吾以觀復 : 《淮南子》 〈道應訓〉에서 尹需의 이야기를 통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呂氏春秋》 〈不苟論 博志〉에는 ‘尹儒’의 이야기로 나온다. 《회남자》에서 尹需는, 3년이나 말 모는 법을 배웠으나 소득이 없다가 어느 날 꿈에서 스승으로부터 秋駕라는 기술을 배웠다. 아마도 꿈에서 부지불식간에 배운 것을 마음을 고요하게 한 상태에 비유한 듯하다. 이 고사를 소개하고 《회남자》는 《노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역주2 物之極(篤)[也]……物之眞正也 : 저본에는 ‘物之極篤’으로 되어 있으나 이런 경우 經文의 ‘極’과 ‘篤’의 풀이가 묘연해진다. 이 때문에 陶鴻慶은 “致虛守靜 物之眞正也”로 바꾸어볼 것을 제안하였고, 樓宇烈은 經文과 注文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文選》의 李善 注에서 《老子》 ‘致虛極’에 대해 王弼의 注를 인용하면서 ‘言至虛之極也’라고 한 점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至虛之極也 守靜之眞也’로 보아 ‘極’과 ‘篤’에 대해 ‘極’과 ‘眞’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이와 달리 바그너는 아래 注16.4의 “卒復歸於虛靜 是物之極篤也”에 근거하여 ‘極’과 ‘篤’이 ‘虛’와 ‘靜’에 상응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物之極篤也’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또한 王弼이 ‘靜’을 ‘正’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經45.6과 注45.6에서 ‘淸靜爲天下正’이라 하였으니 ‘眞正’으로 보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바그너는 ‘物之極也’, ‘物之眞正也’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논의의 맥락으로 볼 때 바그너의 주장이 가장 타당성 있기에 이를 따른다.
- 역주3 [根 始也] : 저본에는 없으나, 바그너는 慧琳의 《一切經音義》를 근거로 보충하였는데, 논의가 분명해지므로 이를 따른다.
- 역주4 (是謂)[靜曰] : 저본에는 ‘靜曰’이 ‘是謂’라고 되어 있으나, 바그너는 帛書本에 의거하여 ‘靜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문장의 패턴으로 보거나 王弼의 注文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므로 이를 따른다.
- 역주5 妄作凶 : 바그너는 아래 王弼의 注文에 ‘則’이 첨가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則妄作凶’으로 수정하였다. 다만 이렇게 할 때 樓宇烈은 ‘妄作 凶’으로 읽어 “망녕되이 행동하니 흉하다.”라고 풀이하지만, 바그너는 “망녕되게 흉한 일을 하게 된다.”고 풀이하였다.
- 역주6 (敝)[皦] : 저본에는 ‘敝’로 되어 있으나, 樓宇烈은 經14.2에서 ‘其上不曒 其下不昧’라 한 것을 근거로 ‘皦’로 교감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 역주7 [其]分 : 저본에는 ‘其’가 없으나 陸德明의 《經典釋文》에는 ‘其分’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樓宇烈은 ‘物離其分’의 ‘分’이 《老子指略》 2.2의 ‘名之者離其眞(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참됨을 벗어나는 것이다.)’과 ‘不以名爲常 則不離其眞(이름으로 항상된 상태를 삼지 않으면 그 참된 원래의 상태를 이탈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의미상 ‘分’을 ‘眞’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이 또한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는 萬物이 저마다 타고난 性命의 常 혹은 名分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두었는데, 바그너는 이를 ‘만물 각각에 할당된 자리[assigned stations]’로 풀었다.
- 역주8 [窮] : 저본에는 없으나, 陶鴻慶 등의 설과 아래 注16.12에 따라 ‘窮’을 보충하였다.
- 역주9 得(道)[物]之常 : 저본에는 ‘物’이 ‘道’로 되어 있고 永樂大典本 등에는 ‘物’로 되어 있다. 樓宇烈은 ‘道之常’으로, 바그너는 ‘物之常’으로 보았다. 經16.4-6을 보면 萬物이 性命之常을 얻는다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아는 聖人이 하늘과 덕이 합치하는 경지에 이를 때 만물과 만백성이 각각의 常을 얻게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는 物之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여 이를 따른다.
- 역주10 (有)[可窮] : 저본에는 이 부분이 ‘有極’으로 되어 있고, 樓宇烈과 바그너는 永樂大典本에 근거하여 ‘有’로 수정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 역주11 (齒角)[爪角] : 저본에는 ‘齒角’으로 되어 있으나 永樂大典本에는 ‘爪角’으로 되어 있고, 注50.2에 ‘虎兕無所措其爪角’이라고 같은 문장이 나오므로 이에 따라 바로잡는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