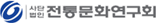이라 故混而爲一이라
注
[注]無狀無象하고 無聲無響이라
故能無所不通하고 無所不往하여 不得而知하니 更以我耳目體로 不知爲名이라
故不可致詰하여 混而爲一也하니라
14.2 는 其上不曒하고 其下不昧며 繩繩不可名이라
復歸於無物이니 是謂이며
注
[注]欲言無邪나 而物由以成하고 欲言有邪나 而不見其形이라
故曰 無狀之狀이요 無物之象也라
14.3 是謂惚恍이니
注
[注]不可得而定也라
14.4 迎之不見其首하고 隨之不見其後라
執古之道하여 以御今之有면
14.5 知古始니 是謂道紀니라
注
[注]無形無名者는 萬物之宗也라
雖今古不同이나 時移俗易이라 故莫不由乎此以成其治者也라
故可執古之道하여 以御今之有니라
上古雖遠이나 其道存焉이라
故雖在今으로 可以知古始也라
제14장은 고대 중국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사유, 즉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서 형상이 없는 형상, 텅 빈 사물의 모습, 너무 작아 있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사물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왕필王弼은 주석에서 사물의 모습을 ‘장狀 → 상象 → 형形(명名)’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장狀’은 가물가물한 모양이요, ‘상象’은 뚜렷한 형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핏 우리는 불완전함을 떠올리지만, 왕필은 그러한 뚜렷한 형체 없음이 오히려 ‘온갖 데를 갈 수 있고, 온갖 것과 통할 수 있다.’고 한다.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 온갖 형태가 되는 물을 떠올리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요상하다. 그 모습을 무어라 딱 정의해 말할 수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니요, 보이지 않아 없다고 하려니 사물을 이루어주는 근원이 되므로 없다고 부정해버리기도 곤란하다.
그 신비로운 것이 바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인 ‘이夷’, ‘희希’, ‘미微’를 합한 것인데, 이것이 도道(일一)이다. 도란 ‘잡雜스러운 것’, ‘섞여 있는 것’이므로, 이는 뒤에 나오는 ‘혼탁’한 것과도 이어진다. ‘옛날의 도道를 잡아 지금의 유有를 다스린다.’라는 구절에서, 왕필王弼은 ‘무無가 일一에 있다.[무재어일無在於一]’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금지유今之有’를 ‘시대가 처한 시대적 과제’로 해석하게 한다. 왕필의 주석을 읽으면 이 부분은 좀 명확해진다.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이 만물의 근본인 도인데,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풍속이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도를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다스려야 한다. 옛날의 도란 중국의 영원한 이상향인 요순시대堯舜時代를 이루던 도, 선왕지도先王之道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유자儒者들의 목표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 오경五經을 통해 선왕들의 도를 부활시켜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천국을 이루자는 것이다. 유학자인 왕필이 왜 《노자》에 주석을 달았는지, 《노자》를 왜 정치적인 텍스트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동아시아 사유에서 요순시대를 이상향으로 추앙하는 것은 서양이 그리스 시대를 찬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요상하다. 그 모습을 무어라 딱 정의해 말할 수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니요, 보이지 않아 없다고 하려니 사물을 이루어주는 근원이 되므로 없다고 부정해버리기도 곤란하다.
그 신비로운 것이 바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인 ‘이夷’, ‘희希’, ‘미微’를 합한 것인데, 이것이 도道(일一)이다. 도란 ‘잡雜스러운 것’, ‘섞여 있는 것’이므로, 이는 뒤에 나오는 ‘혼탁’한 것과도 이어진다. ‘옛날의 도道를 잡아 지금의 유有를 다스린다.’라는 구절에서, 왕필王弼은 ‘무無가 일一에 있다.[무재어일無在於一]’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금지유今之有’를 ‘시대가 처한 시대적 과제’로 해석하게 한다. 왕필의 주석을 읽으면 이 부분은 좀 명확해진다.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이 만물의 근본인 도인데,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풍속이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도를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다스려야 한다. 옛날의 도란 중국의 영원한 이상향인 요순시대堯舜時代를 이루던 도, 선왕지도先王之道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유자儒者들의 목표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 오경五經을 통해 선왕들의 도를 부활시켜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천국을 이루자는 것이다. 유학자인 왕필이 왜 《노자》에 주석을 달았는지, 《노자》를 왜 정치적인 텍스트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동아시아 사유에서 요순시대를 이상향으로 추앙하는 것은 서양이 그리스 시대를 찬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어슴푸레하다[이夷]’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어렴풋하다[희希]’ 하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일컬어 ‘작다[미微]’ 한다.
이 세 가지는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뭉뚱그려 하나라고 한다.
注
가물가물한 모습도 없고 뚜렷한 형상도 없고, 분명한 소리도 없고 메아리처럼 울림도 없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가지 못하는 곳도 없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나의 귀, 눈, 몸의 감각으로는 무어라 이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어 뭉뚱그려 ‘하나’라고 하였다.
‘하나’는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으며,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 이름 지을 수 없다.
다시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니 이것을 일컬어 모습 없는 모습, 물체 없는 형상이라 하며,
注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만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성한다.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정확한 형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습 없는 모습, 물체 없는 형상’이라 말한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홀황惚恍하다 한다.
注
〈어떤 것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맞이하여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도 그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옛날의 도를 잡고서 오늘의 있음을 다스리면
注
옛날과 지금은 비록 다르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도道는 언제나 있었으니, 그 도를 잡으면 바야흐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있음’이란 그에 해당하는 일이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옛 시원始原을 아니, 이것을 일컬어 도道의 벼리라 한다.
注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는 것은 만물의 으뜸이다.
비록 지금과 옛날이 같지 않으나 시대가 바뀌고 풍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치적治績을 이루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옛날의 도를 잡고서 오늘의 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상고시대는 비록 아득히 멀지만 〈옛 선왕들이 남긴〉 그 도는 〈오경五經과 같은 경전을 통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으로 옛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역주
- 역주1 視之不見……名曰微 : 帛書本에는 ‘夷’와 ‘微’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 역주2 此三者 不可致詰 : 帛書本에는 ‘不可致詰(캐물을 수 없다)’이 ‘不可至計(계산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 역주3 [一者] : 저본과 河上公本에는 ‘一者’가 없으나, 帛書本과 傅奕本에는 있다. ‘一者’는 바로 앞 구절의 ‘混而爲一’의 一을 뜻하므로 문장이 보다 분명해진다. 두 판본에 의거하여 보충한 바그너를 따라 보충하였다.
- 역주4 無狀之狀 無物之象 : 이 구절은 《呂氏春秋》 〈審應覽〉, 〈執一〉과 《淮南子》 〈道應訓〉에서 田騈과 齊 宣王의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회남자》에서 제 선왕은 전병에게 道에 대해 듣고 나서 도로써 나라의 근심을 없앨 수 없으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전병은 자신의 말이 정치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정치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것이 바로 老聃이 말한 ‘모습 없는 모습, 물체 없는 형상’에 해당한다.[此老聃之所謂 無狀之狀 無物之象者也]”고 답하면서 《노자》의 이 구절이 인용된다.
- 역주5 [可] : 저본에는 ‘可’가 없으나 바그너의 주장에 따라 帛書本과 王弼 注47.1 등에 의거하여 ‘可’를 보충하였다.
- 역주6 古今雖異……方能於物 : 저본에는 이 부분이 없으나 바그너는 道藏取善集本을 근거로 이 부분을 삽입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注47.1을 함께 보면 좋다.
- 역주7 (能)[以] : 저본에는 ‘以’가 ‘能’으로 되어 있으나, 바그너는 아래 王弼의 注와 傅奕本 등을 근거로 ‘以’로 볼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