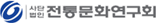1.1 이라
1.2 無名은 요 有名은 萬物之母라
注
[注]라
故未形無名之時는 則爲萬物之始요 及其有形有名之時는 라
1.3 이면 以觀其妙하고
1.4 常有欲이면 以觀其徼하니라
1.5 此兩者는 同出而異名으로 이니 玄之又玄이 衆妙之門이라
注
[注]兩者는 始與也라 同出者는 同出於玄也요 異名은 所施不可同也니
在首則謂之始요 在終則謂之母라
玄者는 冥也니 默然無有也며 始母之所出也로 不可得而名라
故不可言同名曰玄이로되 而言謂之玄者는 取於不可得而謂之然也라
故曰 玄之又玄也라하니라
衆妙는 皆從同而出이라 故曰 衆妙之門也라하니라
제1장은 《노자老子》를 유명하게 만든 “도道는 〈문자로〉 표현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은 〈문자로〉 규정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구절은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형이상학形而上學과 언어철학言語哲學, 존재론存在論 등 매우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논의되었고, 존재와 언어의 문제, 삶과 깨달음의 경지 등과 관련하여 인식론이나 경험적 차원에서도 논의되었다.
일반적으로 20세기에 ‘도道’는 우주의 궁극적 근원, 근본 실체, 우주적 원리 등등으로 규정지어져 왔다. 특히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 자극되어 ‘도道’는 동아시아 전통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모두 왕필王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왕필의 논의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노자老子》에서는 도道가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왕필은 도道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象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결국 언言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언言(문자적 표현)과 의意(의도, 뜻)의 문제로 이해한 것이다. 특히 그것은 유가 경전 등에 담긴 언어와 그 의미에 관한 이해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말이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언의지변言意之辨’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맥락에서 보면 《노자老子》의 첫 구절에서 ‘가도可道’와 ‘불가도不可道’는 궁극적 실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경전經典의 말과 그 말에 담긴 뜻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왕필의 입장은 언言이 의意를 다 드러낼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긴장 관계는 상象을 통해 극복된다. 즉 경전經典에 담긴 성인의 의意는 언言을 통해 상象을 얻고, 상象을 통해 의意를 얻는 방식으로 긍정된다. 이렇게 해서 왕필王弼은 성인聖人의 의意, 경전經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로지 상수象數에 집착하던 한대역학漢代易學을 비판하면서 언言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상象을 해석하는 의리역義理易을 주창한 사실과 통한다.
왕필은 《주역약례周易略例》 〈명상明象〉에서 “상象은 의意를 드러내는 것이고, 언言은 상象을 밝히는 것이다. 의意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象만 한 것이 없고, 상象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언言만 한 것이 없다. 언言은 상象에서 생기므로 언言을 찾아서 상象을 보고, 상象은 의意에서 생기므로 상象을 찾아서 의意를 본다.……그러므로 언言은 상象을 밝히는 수단이니 상象을 얻으면 언言을 잊고, 상象은 의意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 의意를 얻었으면 상象을 잊어야 하는 것이다.[부상자夫象者 출의자야出意者也 언자言者 명상자야明象者也 진의막약상盡意莫若象 진상막약언盡象莫若言 언생어상言生於象 고가심언이관상故可尋言以觀象 상생어의象生於意 고가심상이관의故可尋象以觀意……고언자소이명상故言者所以明象 득상이망언得象而忘言 상자象者 소이존의所以存意 득의이망상得意而忘象]”라고 하였는데, 이 논의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왕필王弼은 상象을 통해 언言을 다시 긍정한 것이다. 따라서 언言에 집착하는 훈고訓詁를 반성하고, 성인聖人의 의意를 추구하려는 의리義理의 입장에서 나온 의미로 보아야 한다. 현대철학의 존재와 언어, 언어와 실재라는 맥락과는 분명 다르다.
“무명無名은 만물의 시작이요,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미이다.”라는 문장 또한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40장의 “천하天下의 만물萬物은 유有에서 생겨나고 유有는 무無에서 생겨난다.[천하만물天下萬物 생어유生於有 유생어무有生於無]”와 관련되는데, 동양철학東洋哲學의 우주발생론宇宙發生論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무無를 강조하는 귀무貴無와 유有를 긍정하는 숭유崇有의 입장이 대립한 위진시대魏晉時代에 왕필은 귀무貴無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유생어무有生於無’를 그대로 긍정하는 논리를 펴지 않고 ‘생生’을 ‘시始’로 바꾸어 이해하고, 유有와 무無의 관계는 ‘미형무명지시未形無名之時’와 ‘유형유명지시有形有名之時’의 관계로 대체하였다. 즉 천지天地 이전의 무無로부터의 창생蒼生을 긍정하지 않고 천지天地 안에서 만물萬物이 형성形成되는 과정過程으로 파악한 것이다.
오히려 ‘유생어무有生於無’가 우주논적宇宙論的 차원의 논쟁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불교佛敎가 수용되던 시기에 불교의 용어가 《노자老子》의 철학적哲學的 용어用語들로 번역되면서부터이다.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철학적哲學的 개념槪念들에 의존하여 불경佛經을 해석하는 격의불교格義佛敎에서 공空과 색色은 처음에 《노자老子》의 무無와 유有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노자老子》의 유무有無는 보다 풍부한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른 한편 ‘유생어무有生於無’는 예술藝術의 영역에서 새로운 작품 창작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흰 여백의 종이 위에 산수山水가 그려지는 과정을 ‘유생어무有生於無’의 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제1장은 동아시아의 철학哲學과 종교宗敎, 예술藝術에 커다란 의미意味와 상상력想像力을 제공해준 문장文章이라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세기에 ‘도道’는 우주의 궁극적 근원, 근본 실체, 우주적 원리 등등으로 규정지어져 왔다. 특히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 자극되어 ‘도道’는 동아시아 전통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이 모두 왕필王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왕필의 논의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노자老子》에서는 도道가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왕필은 도道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象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결국 언言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언言(문자적 표현)과 의意(의도, 뜻)의 문제로 이해한 것이다. 특히 그것은 유가 경전 등에 담긴 언어와 그 의미에 관한 이해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말이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언의지변言意之辨’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맥락에서 보면 《노자老子》의 첫 구절에서 ‘가도可道’와 ‘불가도不可道’는 궁극적 실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경전經典의 말과 그 말에 담긴 뜻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왕필의 입장은 언言이 의意를 다 드러낼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긴장 관계는 상象을 통해 극복된다. 즉 경전經典에 담긴 성인의 의意는 언言을 통해 상象을 얻고, 상象을 통해 의意를 얻는 방식으로 긍정된다. 이렇게 해서 왕필王弼은 성인聖人의 의意, 경전經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로지 상수象數에 집착하던 한대역학漢代易學을 비판하면서 언言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상象을 해석하는 의리역義理易을 주창한 사실과 통한다.
왕필은 《주역약례周易略例》 〈명상明象〉에서 “상象은 의意를 드러내는 것이고, 언言은 상象을 밝히는 것이다. 의意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象만 한 것이 없고, 상象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언言만 한 것이 없다. 언言은 상象에서 생기므로 언言을 찾아서 상象을 보고, 상象은 의意에서 생기므로 상象을 찾아서 의意를 본다.……그러므로 언言은 상象을 밝히는 수단이니 상象을 얻으면 언言을 잊고, 상象은 의意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 의意를 얻었으면 상象을 잊어야 하는 것이다.[부상자夫象者 출의자야出意者也 언자言者 명상자야明象者也 진의막약상盡意莫若象 진상막약언盡象莫若言 언생어상言生於象 고가심언이관상故可尋言以觀象 상생어의象生於意 고가심상이관의故可尋象以觀意……고언자소이명상故言者所以明象 득상이망언得象而忘言 상자象者 소이존의所以存意 득의이망상得意而忘象]”라고 하였는데, 이 논의에 기대어 생각해보면 왕필王弼은 상象을 통해 언言을 다시 긍정한 것이다. 따라서 언言에 집착하는 훈고訓詁를 반성하고, 성인聖人의 의意를 추구하려는 의리義理의 입장에서 나온 의미로 보아야 한다. 현대철학의 존재와 언어, 언어와 실재라는 맥락과는 분명 다르다.
“무명無名은 만물의 시작이요,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미이다.”라는 문장 또한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40장의 “천하天下의 만물萬物은 유有에서 생겨나고 유有는 무無에서 생겨난다.[천하만물天下萬物 생어유生於有 유생어무有生於無]”와 관련되는데, 동양철학東洋哲學의 우주발생론宇宙發生論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무無를 강조하는 귀무貴無와 유有를 긍정하는 숭유崇有의 입장이 대립한 위진시대魏晉時代에 왕필은 귀무貴無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유생어무有生於無’를 그대로 긍정하는 논리를 펴지 않고 ‘생生’을 ‘시始’로 바꾸어 이해하고, 유有와 무無의 관계는 ‘미형무명지시未形無名之時’와 ‘유형유명지시有形有名之時’의 관계로 대체하였다. 즉 천지天地 이전의 무無로부터의 창생蒼生을 긍정하지 않고 천지天地 안에서 만물萬物이 형성形成되는 과정過程으로 파악한 것이다.
오히려 ‘유생어무有生於無’가 우주논적宇宙論的 차원의 논쟁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불교佛敎가 수용되던 시기에 불교의 용어가 《노자老子》의 철학적哲學的 용어用語들로 번역되면서부터이다.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철학적哲學的 개념槪念들에 의존하여 불경佛經을 해석하는 격의불교格義佛敎에서 공空과 색色은 처음에 《노자老子》의 무無와 유有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노자老子》의 유무有無는 보다 풍부한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른 한편 ‘유생어무有生於無’는 예술藝術의 영역에서 새로운 작품 창작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흰 여백의 종이 위에 산수山水가 그려지는 과정을 ‘유생어무有生於無’의 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제1장은 동아시아의 철학哲學과 종교宗敎, 예술藝術에 커다란 의미意味와 상상력想像力을 제공해준 문장文章이라 말할 수 있다.
도道는 〈문자로〉 표현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은 〈문자로〉 규정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注
〈문자로〉 표현된 도와 〈문자로〉 규정된 이름은 〈구체적 사태를 가리키는〉 지사指事나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조형造形에 해당하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문자로〉 규정할 수 없다.
무명無名은 만물의 시작이요,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미이다.
注
무릇 유有는 모두 무無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만물이〉 아직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는 때가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이〉 형체가 있고 이름이 있는 때에는 〈도道가 만물을〉 자라게 하고 길러주며 형통케 하고 성장케 하니 〈만물의〉 어미가 된다.
이는 도가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시작하고 이루어주지만, 만물은 〈그 도에 의해〉 시작되고 이루어지면서도 그 소이연所以然을 알지 못하니 신비하고 또 신비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신묘함을 보고,
注
‘묘妙’란 지극히 ‘작다[미微]’는 뜻이다.
만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 뒤에 성장하고, 무無에서 시작한 뒤에 생장한다.
따라서 늘 욕심이 없어 그 마음을 텅 비워내면 그 시작하는 만물의 신비를 볼 수 있다.
항상 욕심이 있으면 그 돌아가는 끝을 본다.
注
‘끝[요徼]’이란 돌아가 마치는 곳이다.
무릇 유有가 이롭게 되려면 반드시 무無를 써야 한다. 욕심의 뿌리인 〈마음은〉 도에 나아간 뒤에야 가지런해진다.
그러므로 항상 욕심이 있으면 마치고 〈돌아가는〉 만물의 끝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나와 이름을 달리한 것으로, 함께 일컬어 ‘신비하다’고 하는데, 신비하고 또 신비한 것이 뭇 신비함이 나오는 문이다.
注
양자兩者란 ‘시始’와 ‘모母’이다. ‘함께 나왔다[동출同出]’는 것은 ‘함께 현玄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이름이 다르다[이명異名]’는 것은 〈‘시始’와 ‘모母’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머리 쪽에 있으면 ‘시始’라 일컫고, 끝 쪽에 있으면 ‘모母’라고 일컫는다.
‘현玄’은 깊고 어두운 것이니, 고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무유無有]이며 ‘시始’와 ‘모母’가 나오는 곳으로서 〈이러한 현玄에 대해〉 ‘이름[명名]’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현玄’이라고 이름을 붙여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함께 일컬어 현玄이라 한다.[동위지현同謂之玄]’고 말한 것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 일컬을 수 없다는 데서 취한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 ‘현玄’이라는 하나의 〈글자로〉 확정할 수 없으니, 만약 ‘현玄’이란 하나의 〈글자로〉 확정하면 이것은 곧 이름이요 〈본래의 뜻을〉 크게 잃은 것이다.
그래서 ‘신비하고 또 신비하다.[현지우현玄之又玄]’고 〈형용하는 의미로 중복하여〉 말한 것이다.
뭇 신비함이 모두 같은 현玄에서 나오니, 이 때문에 ‘뭇 신비함이 나오는 문’이라고 했다.
- 역주
- 역주1 道……非常名 : 帛書 甲‧乙本에는 ‘常’이 ‘恒’으로 되어 있으나, 뜻 차이는 없다. 이 구절은 《莊子》 〈天道〉, 《淮南子》 〈道應訓〉에서 桓公과 輪扁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淮南子》에서 수레바퀴를 깎는 匠人인 윤편은 齊 桓公에게 聖人이 남긴 글[書]은 결국 실질적인 의미[實]는 사라지고 껍데기[糟粕]만 남은 것이고, 道는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장자》와 《회남자》의 해석은 《老子》의 이 첫 구절이 현대학자들이 선호하는 언어와 실재의 불일치라는 철학적 주제와 관련된 논의라기보다, 道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方法知(the knowing-how)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河上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道는 문자로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초기의 주석이다. 그러나 王弼에 이르면 言(말 혹은 문자)이 意(뜻)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속되지만, 《周易》의 象을 통해 言이 긍정되고, 다시 言을 통해 意가 긍정되어 결국은 言을 통해 意를 얻을 수 있다는 논의로 전환된다. 그래서 王弼은 象보다 言을 중시하는 義理易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왕필의 논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역주2 可道之道 可名之名 : 《列子》 〈天瑞〉의 張湛 注에 “죽간이나 비단에 쓰거나 쇠붙이나 돌에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可道의 道이다.[夫著於竹帛 鏤於金石 可傳於人者 可道之道也]”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可名之名’은 죽간이나 비단에 쓰인 문자를 통해 전한다는 뜻이니 可道는 ‘문자로 표현하면’, 可名은 ‘문자로 규정하면’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王弼은 漢代의 文字 訓詁에 매이지 않아도 六經에 담긴 聖人의 진정한 뜻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義理學’이라 부른다. 따라서 왕필이 ‘可道’와 ‘可名’을 부정한 것이 文字를 통해 뜻[意]을 전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 역주3 指事造形 : ‘指事’란 글자를 통해 표현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를 가리킨다. 樓宇烈에 따르면, ‘指事’는 許愼의 《說文解字》 〈六書篇〉에서 漢字를 分類하는 데서 온 말이다. 指事字의 대표로는 ‘上’이나 ‘下’와 같은 한자가 있다. ‘造形’은 《周易》 〈繫辭傳 上〉 韓康白의 注에서 ‘象’은 ‘日月星辰’에 해당하고 ‘形’은 ‘山川草木’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指事造形’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형상을 지닌 구체적 사물을 가리킨다. 여기의 대구를 따른다면 ‘道’는 ‘事’, ‘名’은 ‘形’에 상응한다. 그리고 王弼은 ‘有名’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有名有形’을 포함하여 말하는데 注1.1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造形’은 본래 《莊子》 〈徐无鬼〉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무귀가 말했다. ‘좋지 않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해치는 첫걸음이고 정의를 위해 전쟁을 멈추겠다는 것이 도리어 전쟁을 시작하는 근본입니다. 임금께서 이 같은 생각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무릇 아름다움을 이루겠다는 것이 惡을 담는 그릇이니 임금님께서는 비록 仁義를 실천하려 하나 아마도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형식적 규범은 반드시 더 위선적인 형식적 규범을 만들며[形固造形], 그 형식이 일단 성립되면 반드시 실패가 기다리며, 변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타인과 무력으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의 표현을 볼 때 ‘形’은 외형적인 차원의 의미이고 ‘造形’은 더욱 형태화된 행동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 역주4 (天地)[萬物]之始 : 저본에는 ‘天地之始’로 되어 있으나, 帛書 甲‧乙本, 傅奕本, 范應元本에는 ‘萬物之始’로 되어 있다. 《史記》 〈日者列傳〉에 “무명으로 만물의 시작을 말한다.[以無名說萬物始]”고 했다. 王弼의 注文에도 ‘萬物之始’로 되어 있고, 또한 注21.7에서 “만물의 시작이 된다.[爲萬物之始]”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바그너(Rudolf G. Wagner)는 ‘萬物之始’로 교감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萬物의 始作이란 天地創造와 같은 神話的 太初의 의미가 아니라 形名의 시작이다.
- 역주5 凡有 皆始於無 : 無名의 세계에서 有名의 세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有生於無’는 세계의 창조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형의 세계에서 유형의 세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王弼은 이를 ‘未形無名之時’의 始에서 ‘有形有名之時’로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nihilo)와는 다르다. 經40.3의 “天下의 萬物은 有에서 생겨나고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에 대해 왕필은 “天下의 만물은 모두 有로 해서 생겨나는데 有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無를 근본으로 삼는다. 장차 有를 온전케 하려면 반드시 無로 되돌아가야 한다.[天下之物 皆以有爲生 有之所始 以無爲本 將欲全有 必反於無也]”라 하였다. 또 注21.8에서 “이것은 위에서 말한 것을 가리킨다. ‘내가 어떻게 만물이 無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것(도)으로써 알 뿐이다.’라는 말이다.[此 上之所云也 言吾何以知萬物之始皆始於無哉 以此知之也]”고 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 역주6 則長之……爲其母也 : 王弼은 經51.3의 “도가 높고 덕이 귀한 것은 대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항상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고, 자라게 하고 기르며 형체를 주고 의지할 곳을 주며 먹을 것을 주고 덮어준다.[道之尊 德之貴 夫莫之爵而常自然 故道生之 德畜之長之育之亭之毒之養之覆之]”를 이용하여 주석하고 있다. 단, 經51.3에서 낳는[生] 작용 이외의 것을 德에 돌리는 데 반해, 왕필은 여기서 모든 작용을 道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注51.3에서는 “‘命’은 ‘爵’으로 된 것도 있다. ‘亭’은 각각의 형체를 품부한다는 뜻이고, ‘毒’은 각각의 바탕을 이루어준다는 뜻이다. 각각 저마다 의지할 곳을 얻어 그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命幷作爵亭謂品其形 毒謂成其質 各得其庇蔭 不傷其體矣]”라고 밝히고 있다.
- 역주7 [萬物] : 저본에는 ‘萬物’이 없으나, ‘萬物 2자는 중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한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 역주8 不知其所以[然] : 저본에는 ‘然’이 없으나, ‘所以 아래에 然자가 탈락되어 있다.’라고 한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注21.3에서는 “도가 무형으로 만물을 시작하고 매이지 않음으로 사물을 이루어주어 만물은 이것으로 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한다.[以無形始物 不繫成物 萬物以始以成 而不知其所以然]”고 하였다. 王弼은 여기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원인이나 원리를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간섭의 부재[不繫]로부터 찾고 있다.
- 역주9 故常無欲 : 注34.2에서 “天下 사람들이 늘 욕심이 없을 때에는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으나 도가 만물에 베푸는 게 없었다.[天下常無欲之時 萬物各得其所 而道無施於物]”라고 하였으니, 왕필이 말하는 無欲의 상태는 개개인의 욕망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신분과 직무를 얻어 사회 전체가 조화와 질서를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마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가가 되면 조각가가 되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
- 역주10 微 : 王弼은 〈老子微指例略〉 2.2에서 “‘微’라는 표현은 어둡고 작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서 취한 말이다. 따라서 〈《노자》에서〉 道, 玄, 深, 大, 微, 遠 같은 표현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그 궁극을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微也者 取乎幽微而不可覩也 然則道玄深大微遠之言 各有其義 未盡其極者也]”고 했다.
- 역주11 萬物……始於無而後生 : 통상 《노자》의 ‘有生於無’는 독특한 審美的 宇宙論으로 해석되는데, 王弼은 이와 같이 문자 그대로의 ‘有生於無’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始於微而後成’으로 이해한다. 달리 말해 만물이 無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微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存在論的인 無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 역주12 空虛[其懷] : 저본에는 ‘其懷’가 없으나 바그너는 道藏集注本, 道藏集義本, 永樂大典本을 근거로 ‘其懷’를 보충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日本의 學者 波多野太郞은 아래 注1.4에서 “故常有欲 可以觀其終物之徼也”라 한 것을 근거로 ‘空虛’를 衍文이라 보았는데 이 또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어느 쪽을 취하든 모두 마음에 품은 욕심을 비운다는 뜻이다.
- 역주13 凡有之爲利 必以無爲用 : 王弼이 “有가 이롭게 되려면 반드시 無를 써야 한다.”고 한 것은, 그가 易學에서 ‘大衍之數’를 無와 연결하여 이해한다는 점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왕필은 《周易注》에서 “천지의 수를 펼칠 때 의지하는 것은 50이지만 그 가운데 쓰이는 것은 49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하나가 쓰이지 않음으로 해서 나머지 49의 쓰임이 통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수가 아니기에 다른 수들이 완성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周易》에서 말하는 太極일 것이다. 49는 숫자의 끝이다. ‘無’는 그 스스로는 밝힐 수 없기에 반드시 ‘有’에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늘 사물의 끝에서 반드시 그 有의 으뜸 되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演天地之數 所賴者五十也 其用四十有九 則其一不用也 不用而用以之通 非數而數以之成 斯易之太極也 四十有九 數之極也 夫無不可以無明 必因於有 故常於有物之極 而必明其所有之宗也]”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占을 칠 때 산가지 50개 가운데 하나는 남기고 나머지 49개로 점을 치는데 이때 남겨지는 하나가 바로 無이며, 근원의 수로서 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易에서 말하는 太極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산가지 하나를 남겨두어야 49개의 산가지가 활용되어 실질적인 占과 그에 따른 卦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無는 一과 太極으로 이어져서 이해된다.
- 역주14 同謂之玄 : 王弼은 〈老子微指例略〉 5에서 ‘이름으로 부르는 것[名號]’과 ‘지칭하여 일컫는 것[稱謂]’을 구분한다. 왕필은 “道는 지칭하여 〈일컫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에 해당한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만물의〉 형상에서 생기고, ‘지칭하여 일컫는 것’은 관련시키고 구하는 데에서 나온다.[道 稱之大者也 名號生乎形狀 稱謂出乎涉求]”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涉求’에 대해 바그너는 ‘the being concerned with and the searching(연관 짓기와 찾기)’이라 영역하였고, 김학목은 ‘관련시켜 보고 구해보는 것’이라 옮겼는데 함께 참고할 만하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名號’가 사물의 어떤 특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稱謂’란 무엇이라 규정할 수 없기에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지칭하여 말하는 것에 그친다는 뜻이다. 왕필은 道가 이런 稱謂에 해당한다고 풀이한 것이다.
- 역주15 (無)[母] : 저본에는 ‘無’로 되어 있으나, 이는 ‘母’의 誤記이므로 바로잡는다.
- 역주16 [同] : 저본에는 ‘同’이 없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同’을 보충하였다. 經文에 ‘同謂之玄’이라 하였으니 ‘同’자가 누락된 것이다.
- 역주17 [不可得而] : 저본에는 ‘不可得而’가 없으나, 앞의 문장을 다시 말한 것이므로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 역주18 [若定乎一玄] : 저본에는 ‘若定乎一玄’이 없으나, 樓宇烈이 道藏集注本에 근거하여 이를 보충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 또한 앞 문장을 다시 말한 것이다.
- 역주19 [玄] : 저본에는 ‘玄’이 없으나, 陶鴻慶의 설에 따라 보충하였다.
-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