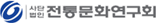장자(2)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장자(1)
- 여닫기 장자(2)
- 여닫기 장자(3)
- 여닫기 장자(4)
帝曰
인저
호니 其聲이 하야 하야 타가 하야 호니 하야 이리라
하며 望之而不能見也하며 逐之而不能及也하니라
聖也者는 라
故로 爲之頌하야 曰
而 로다
樂也者는 하나니라
吾 又次之以怠호니 하나니라
卒之於惑호니 惑이론 故로 愚하나니라
황제黃帝의 신하 북문성北門成이 황제黃帝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께서는 함지咸池의 음악을 저 광원막대廣遠莫大한 동정洞庭의 들판에서 악기를 늘어놓고 연주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첫 번째 연주를 듣고서는 두려움에 빠졌고 다시 두 번째 연주를 듣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져 나른해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주를 들었을 때는 어지러워져 마음이 흔들리고 할 말조차 잊고서 마침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황제黃帝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마도 그랬겠지.
나는 먼저 인간 세상의 규율에 따라 연주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리가 울리게 하고, 예의의 질서를 갖추고 연주를 진행했으며, 태청太淸의 맑고 맑은 무위자연의 경지에 맞게 그것을 맺어 나갔다.
그리하여 사계절이 교대로 일어나면 만물이 그에 따라 생겨나듯이 혹은 성대해지고 혹은 쇠퇴하는 가운데 문文의 부드러운 음색音色과 무武의 강직한 음색이 차례대로 정돈整頓되며, 소리가 맑아졌다 탁해졌다 하는 가운데 마치 음양陰陽의 기氣처럼 잘 조화調和된다.
그리하여 잘 조화된 음악 소리가 널리 흘러 퍼지면서 동면하고 있던 벌레가 비로소 일어나면 나는 또 뇌정雷霆의 울림으로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음악은 마침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시작이 어딘지도 알 수 없어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며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일정함이 끝이 없어서 하나도 예측할 수 없으니 너는 그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나는 또 음양의 조화에 따라 연주하고, 해와 달의 밝음을 따라 음악을 화려하게 연주하였더니, 그 소리를 짧게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길게 늘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굳세게 할 수도 있게 되어 일제히 변화하여 옛 가락에 구애받지 않아서 골짜기를 만나면 골짜기를 채우고 작은 구덩이를 만나면 구덩이를 채우다가 욕망의 틈을 막고 정신을 지켜서 대상對象 사물의 있는 그대로에 순응順應해 나가니 그 소리는 맑게 울리고 그 〈함지악咸池樂이라는〉 이름도 높고 밝게 빛났다.
그 때문에 귀신도 어두운 곳을 지켜 떠나지 않고 일월성신도 제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나는 〈연주演奏를〉 어느 때는 유한有限의 세계에 그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침이 없는 무한의 세계에까지 흘려보내기도 한다네.
자네가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알 수 없으며, 아무리 바라보아도 볼 수 없으며 아무리 쫓아가도 미칠 수 없다.
그러다 자네는 흐리멍덩 넋이 나간 채 사방으로 끝없이 터진 대도大道 가운데 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라 버린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어 신음 소리만 낼 것일세.
그 까닭은 눈의 지각 능력은 보고자 하는 데서 다하고 힘은 쫓아가고자 하는 데서 다하기 때문이다.
나도 이미 거기에 미칠 수 없다.
인간의 육체에 공허함이 가득 차서 마침내 힘이 빠져 흐느적 흐느적 종잡을 수 없게 되니 너도 이처럼 종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느슨해졌던 것이다.”
“나는 또 나른함을 없애는 소리를 연주하고, 자연自然의 명령에 따라 조절하였다네.
그랬더니 만물이 떨기로 자라는 것처럼 이리저리 뒤섞여서 서로 쫓아다니며 모두 크게 즐거워하면서도 그렇게 만든 음악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널리 울려 퍼지는데도 끌고 다니지 않으며,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다.
일정한 방향 없이 움직이고 그윽하고 어두운 근원의 세계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니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충실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 없이 꽃만 무성하다 한다.
자유자재로 유전流轉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일정한 소리에 얽매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여 성인聖人에게 물어본다.
성인聖人이란 자기自己의 정성情性을 남김없이 실현하고 주어진 명령을 완수하는 존재이다.
자연의 조화造化(天機)를 인위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오관五官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을 일러 천락天樂이라 하니 말없이 마음으로 기뻐할 따름이다.
그 때문에 그 옛날 유염씨有焱氏도 이 함지악咸池樂을 기리는 글을 지어 이렇게 말했다.
‘들으려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보려 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천지 사이에 충만하며 육극六極을 감싸 안는다.’ 그러니 너는 이 음악을 들으려 해도 접할 수 없다.
네가 그래서 어지러워진 것일 게다.
이 함지咸池의 음악은 처음에는 듣는 자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하나니, 두려워하게 되기에 불안감이 생긴다.
나는 다음으로 또 듣는 자를 나른하게 하는 음악을 연주하니 나른해지기에 멀리 도망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듣는 자를 어지럽게 하는 음악을 연주하니 어지러워지기에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어지기에 도道와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도道에 내 몸을 싣고 도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 역주
- 역주1 北門成 : 인명. 역시 作者가 창작한 가공의 인물이다. 陸德明은 “사람의 성명이다[人姓名也].”라고 풀이했고, 成玄英은 “성이 북문이고 이름은 성이다. 황제의 신하이다[姓北門 名成 黃帝臣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2 黃帝 : 고대 전설상의 임금으로 삼황오제의 한 사람. 여기서는 음악의 작곡자이자 연주가로 등장하지만 黃帝와 음악의 관계는 池田知久에 의하면 그다지 깊지 않은 것 같다. 池田知久의 해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前漢 후기에 성립된 劉向의 《別錄》에서 유래하는 목록학 관련 문헌인 《漢書》 〈藝文志〉에도 黃帝의 이름을 붙인 音樂書는 보이지 않는다. 《呂氏春秋》 〈古樂〉편에는 黃帝가 伶倫에게 명하여 六律을 만들게 하고, 또 伶倫과 榮將에게 명하여 十二鍾을 鑄造해서 咸池라 이름 붙인 음악을 만들어 처음으로 이것을 연주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국시대 말기에는 黃帝를 咸池의 제작자로 간주하는 등 음악과 결부된 전설이 존재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을 계승한 古文獻은 많지 않으며, 《管子》 〈五行〉편에 ‘옛날 황제는 완급을 따라 오성을 만들었다[昔者黃帝以其緩急作五聲].’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이 章과 〈天下〉편의 ‘황제에게는 咸池樂이 있다[黃帝有咸池].’고 한 기록 정도가 보일 뿐이다. 그런데 《韓非子》 〈十過〉편에는 晉 平公과 師曠의 문답 속에서 師曠이 ‘옛날에 황제가 귀신들을 泰山 위에 모이게 한 일이 있습니다. 象牙로 장식한 수레에 타고 蛟龍 여섯 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는데, 木神 畢方이 수레의 양쪽에 나란히 서고, 兵神 蚩尤는 前驅를 맡고, 바람의 神 風伯이 앞 길을 쓸고 비의 神 雨師가 길에 물을 뿌리고, 호랑이가 선두에 서고 귀신이 뒤따라 수행하고 騰蛇(雲霧 속을 나는 뱀)는 땅에 엎드리고 鳳凰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크게 귀신들을 집합시키고 淸角의 곡을 만들었습니다[昔者黃帝合鬼神於泰山之上 駕象車而六蛟龍 畢方幷鎋 蚩尤居前 風伯進掃 雨師灑道 虎狼在前 鬼神在後 騰蛇伏地 鳳凰覆上 大合鬼神 作爲淸角].’라고 말한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韓非子》에는 황제가 작곡한 음악의 이름이 咸池가 아니라 淸角으로 되어 있지만 문답의 내용이 이 편의 문답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아마도 이 장의 原形일 것이다.” 馬叙倫에 의하면 黃을 皇으로 한 인용문이 있다.
- 역주3 張咸池之樂於洞庭之野 : 咸池의 음악을 洞庭의 들판에서 연주함. 황제가 咸池의 음악을 하늘과 땅의 사이 廣遠莫大한 虛無의 들판(즉, 宇宙의 洞庭의 들판)에서 악기를 늘어놓고 연주하였다는 뜻. 成玄英은 張을 “베푼다[施也].”로 풀이했는데 여기서는 악기를 늘어놓고 연주한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咸池는 악곡의 명칭이다. 成玄英은 “음악의 이름이니 咸은 和合의 뜻이다[樂名. 咸 和也].”라고 풀이했다. 池田知久에 의하면, 《禮記》 〈樂記〉편에 나오는 “함지가 갖추어졌다[咸池備矣].”라고 한 구절에서 鄭玄은 “황제가 작곡한 음악의 명칭이다. 요가 증수해서 연주했다. 咸은 모두라는 뜻이고 池라는 말의 뜻은 베푼다는 뜻이니 덕이 베풀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周禮》에서는 大咸이라 말하고 있다[黃帝所作樂名也 堯增修而用之 咸 皆也 池之言施也 言德之無不施也 周禮曰大咸].”라고 풀이했고, 《漢書》 〈禮樂志〉의 顔師古 注에도 “咸은 모두라는 뜻이고 池는 포용하고 스며듦을 말한 것이니 그 때문에 갖추어졌다고 말한 것이다[咸 皆也 池 言其包容浸潤也 故云備矣].”라고 풀이하고 있는 내용이 보인다. 또 이 책 〈至樂〉편에도 “咸池와 九韶의 음악을 동정의 들판에서 연주했다[咸池九韶之樂 張之洞庭之野].”는 기록이 있으며 《淮南子》 〈齊俗訓〉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呂惠卿은 樂을 道를 비유한 것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견해이다(池田知久). 成玄英은 洞庭之野를 “천지 사이를 말한 것이니 태호의 동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天地之閒 非太湖之洞庭也].”라고 했는데 참고할 만한 견해이다. 〈逍遙遊〉편 제5장에 보이는 “無何有之鄕廣莫之野”를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 呂惠卿인데 이 說 역시 참고할 만하다(池田知久).
- 역주4 聞之懼 : 듣고 두려워함. 듣고 두려워 不安에 긴장한다는 뜻. 之자 아래에 而자가 있는 인용문이 있고(馬叙倫, 王叔岷) 王叔岷은 而자가 있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굳이 而자를 넣을 것까지는 없다. 懼에 대하여는 盧文弨와 馬叙倫의 고증이 있다고 한다(池田知久).
- 역주5 復聞之怠 : 다시 두 번째 연주를 듣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져 나른해짐. 마음이 느슨해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른해진다는 뜻. 復자가 後자로 표기된 인용문이 있지만 오류이다(王叔岷). 復는 다시. 成玄英도 “거듭함이다[重也].”라고 풀이했다. 怠는 《廣雅》 〈釋詁〉에서 “나태함이다[懶也].”라고 풀이한 것을 따라 느슨해지다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集韻》에서는 ‘懈’로 풀이했는데 같은 뜻이다.
- 역주6 卒聞之而惑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주를 들었을 때는 어지러워짐. 어지러워져 思慮分別을 잃고 무어가 무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며, 懼와 怠의 상반된 감정이 교차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는 뜻. 惑자가 感으로 표기된 인용문이 있고(馬叙倫), 或으로 표기된 인용문(劉文典)도 있는데 王叔岷은 이에 대해 或은 惑의 假借字로 보고 있다.
- 역주7 蕩蕩黙黙 : 마음이 흔들리고 할 말조차 잊어버림. 蕩蕩은 마음이 동요하는 모습. 林希逸은 “정신이 흩어짐이다[精神散也].”라고 풀이했는데, 이것이 定說이다(池田知久). 黙黙은 말 없는 모양. 成玄英의 “무지한 모양[無知之貌].”과 林希逸의 “입을 다묾이다[口噤也].”가 定說이다(池田知久). 그래서 이 번역에서는 蕩蕩黙黙을 定說에 따라 北門成의 心理를 묘사한 말로 취해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고 할 말을 잊었다.”는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池田知久는 成玄英이나 林希逸의 定說을 소개하면서도 이것을 北門成의 心理를 묘사한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本文의 理解에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음악을 형용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池田知久의 의견에 따른 번역을 하면 蕩蕩黙黙은 “〈세 번째 연주를 들었을 때는 思慮分別을 잃고 어지러워졌는데〉 음악이 걷잡을 수 없이 한없이 퍼져 나가 흔들거리며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아 〈마침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라는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나 참고할 만한 의견으로 소개한다.
- 역주8 乃不自得 : 마침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함. 망연자실하게 되었다는 뜻. 郭象은 “좌망을 일컬음이다[坐忘之謂也].”라고 풀이했고, 成玄英도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또 林希逸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함이다[不自安也].”라고 풀이한 것 등이 무난하지만 沈一貫이 “대상 사물과 나를 모두 잃어버려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다[物我具喪 乃不自得也].”라고 풀이한 것이 좋을 것이다(池田知久). 〈天地〉편 제11장에 “子貢이 부끄러워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신을 잊은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삼십 리나 간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子貢卑陬失色 頊頊然不自得 行三十里而後愈].”라고 한 것과 〈應帝王〉편 제5장에서 鄭나라의 神巫 季咸이 壺子에게 혼이 나서 “넋을 잃고 달아났다[自失而走].”라고 한 내용과 참조할 필요가 있다(池田知久).
- 역주9 汝殆其然哉 : 너는 아마도 그랬겠지. 殆는 아마도. 然哉가 庶幾也로 표기된 인용문이 있다(馬叙倫). 林希逸은 “나의 음악을 네가 들었다면 의당 이같이 세 차례 변화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言我之樂 而汝聽之 宜其如此三變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10 吾奏之以人 : 인간 세상의 규율에 따라 연주함. 人은 인간 세상의 음률. 赤塚忠에 의하면, 《荀子》 〈樂論〉편에 “무릇 음악이란 즐거움이니 인정상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다[夫樂者 樂也 人情之所必不免也].”라고 한 내용이 있고, 《呂氏春秋》 〈音初〉편에도 “무릇 음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凡音者 産乎人心者也].”라고 한 기록이 있다. 또 《禮記》 〈樂記〉편에도 “무릇 음악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凡音之起 由人心生也].”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成玄英은 “奏는 호응함이다[奏 應也].”라고 풀이했지만 따르지 않는다.
- 역주11 徽之以天 :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리가 울리게 함. 底本에는 徽자가 徵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馬叙倫의 견해를 따라 徽자로 고쳤다. 陸德明도 徵자는 고본에는 徽자로 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徽자로 표기된 판본이 있으며(劉文典, 王叔岷), 그 의미는 馬叙倫에 따르면 揮의 뜻일 것이다(池田知久). 곧 소리 울리게 한다거나 樂記를 演奏한다는 뜻이 된다. 赤塚忠은 《禮記》 〈樂記〉편에 “大樂與天地同和”라고 있는 것을 참조할 것을 말하고 있다. 成玄英 疏에서는 徽를 順으로 풀이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12 行之以禮義 : 예의의 질서를 갖추고 연주를 진행했음. 절도와 조리의 정신에 따라 질서 있게 연주를 진행시켜 나갔다는 뜻이 된다. 行은 연주를 진행함을 말한다.
- 역주13 建之以太淸 : 太淸의 맑고 맑은 무위자연의 경지에 맞게 음악을 맺어 나감. 太淸의 太는 底本에는 大로 되어 있으나 通行本에 따라 太로 고쳤다. 太淸(廣大한 淸虛)의 맑고 맑은 무위의 경지에 맞게 음악을 맺어 나갔다는 뜻이 된다. 建은 근본을 세운다, 연주를 맺어 나간다는 뜻. 成玄英은 “태청은 천도이다[太淸 天道也].”라고 풀이했다. 池田知久의 注에 의하면, 〈知北遊〉편의 ‘泰淸’, 〈列御寇〉편의 ‘太淸’, 《淮南子》 〈本經訓〉편의 ‘太淸’ 등이 참조가 되는데 음악과 관련된 것으로는 《鶡冠子》 〈度萬〉편에 “오직 성인만이 그 音을 바로잡고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 덕이 위로는 태청을 회복하고 아래로는 泰寧에 미친다[唯聖人能正其音 調其聲 故其德上反太淸 下及泰寧].”라고 한 내용이 있다(福永光司). 또 底本에는 이 아래에 “夫至樂者 先應之以人事 順之以天理 行之以五德 應之以自然 然後調理四時 太和萬物”의 35字가 있지만 오래 전에 蘇轍이 말을 꺼낸 이래로 빼 버려야 할 衍文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池田知久). 蘇轍은 注의 文章이 잘못 끼어든 것이라 했고, 徐廷槐의 《南華簡鈔》와 姚鼐의 《莊子章義》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郭象 注의 문장이라 했으나(武延緖, 阮毓崧, 馬叙倫, 于省吾, 楊明照 등도 같은 견해) 沈一貫, 劉文典, 王叔岷, 寺岡龍含 등의 고증에 따르면 成玄英 疏의 문장이 끼어든 것이다(池田知久). 이 35字가 없는 판본과 인용문이 있는데다(劉文典, 王叔岷) 道藏注疏本에는 이것이 아예 成玄英 疏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 역주14 四時迭起 萬物循生 : 〈그리하여〉 사계절이 교대로 일어나면 만물이 그에 따라 생겨남. 四時迭起는 “사계절이 추이하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따라 音律을 轉換시키면.”의 뜻이 되고, 萬物循生은 “만물이 그에 따라 생겨나듯 千變萬化하는 소리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 글과 연결시키면서 “사계절이 교대로 일어나면 만물이 그에 따라 생겨나듯이.”로 번역하였다. 陸德明의 《經典釋文》에서는 어떤 판본에는 迭자가 遞자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두 字를 馬叙倫은 같은 글자로 보았다. 萬物循生의 循을 成玄英 疏에서는 “順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15 一盛一衰 文武倫經 : 혹은 성대해지고 혹은 쇠퇴하는 가운데 文의 부드러운 音色과 武의 강직한 음색이 차례대로 정돈됨. 혹은 성대해지고 혹은 쇠퇴한다는 것은 萬物에 盛衰가 있듯 음악에도 昻揚되었다가 凋落되는 성쇠가 있음을 말하며, 文과 武는 평화로운 북소리[文]와 전투적인 鐘소리를 의미하기도 하며, 倫經은 차례대로 펼쳐진다는 뜻이다. 池田知久의 注를 보면, 文武는 《禮記》 〈樂記〉편에 “처음에는 文으로 연주하고 다시 武로 마무리한다[始奏以文 復亂以武].”라고 한 내용과 같은 의미이다(陸樹芝). 林希逸이 “발생시키는 것은 文이고 죽이는 것은 武이다. 倫經은 차례이다. 사계절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며 만물이 이를 따라 생장하여 성대해졌다가 다시 쇠퇴함이 마치 음악에 문과 무의 차례가 있는 것과 같다. 거문고에 문현과 무현이 있으니 바로 여기의 문무에 해당하는 종류이다[發生 文也 肅殺 武也 倫經 次序也 四時生殺 萬物循序 而生長 旣盛復衰 猶樂聲之有文武倫序也 琴有文武絃 卽此文武之類].”라고 한 풀이를 참고할 만하다. 成玄英은 “循은 따름이고 倫은 가지런히 정돈함이고 經은 일정함이다[循 順 倫 理 經 常也].”라고 풀이했는데 무난한 해설이다.
- 역주16 一淸一濁 陰陽調和 : 〈소리가〉 맑아졌다 탁해졌다 하는 가운데, 즉 한 번 맑아지면 한 번 탁해지는 가운데, 陰陽의 氣처럼 잘 調和됨. 陰陽調和는 陰氣와 陽氣가 조화를 이룬다고 흔히 보고 있으나 陰陽을 부사로 읽어 음양처럼, 陰氣와 陽氣처럼으로 읽을 수도 있다. 一濁一淸으로 표기된 인용문이 있고 위아래의 문장과 韻도 맞으므로 그것이 올바른 문장일 수도 있다(王叔岷). 武延緖는 이 句도 注의 문장이 잘못 끼어든 것이라고 의심했다(池田知久).
- 역주17 流光其聲 : 잘 조화된 음악 소리가 널리 흘러 퍼짐. 光은 馬其昶(淸)의 《莊子故》, 奚侗(民國)의 《莊子補注》, 馬叙倫(民國)의 《莊子義證》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廣의 假借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池田知久는 成玄英 疏, 林希逸 注, 羅勉道 注를 모두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成玄英이 “照燭은 和氣가 流布되어 三光이 밝게 비춤이다[照燭和氣流布 三光照燭].”라고 풀이한 것은 무리이고, 林希逸이 또한 “流光은 광휘가 성대하게 흐름이니 음양청탁의 소리를 조절하여 이처럼 광화가 성대하게 흐른다는 것이다[流光 流暢光輝也 調其陰陽淸濁之聲 如此流暢光華也].”라고 풀이한 것도 무리이고, 또 羅勉道가 “그 소리가 순조롭게 흘러 빛남이다[言其聲流順而光瑩也].”라고 풀이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역주18 蟄蟲始作 吾驚之以雷霆 : 동면하고 있던 벌레가 비로소 일어나면, 나는 또 雷霆의 울림으로 이들을 놀라게 했다. 蟄은 겨울잠을 자는 벌레. 霆은 雷霆. 陸德明은 ‘電’으로 풀이했다. 《禮記》 〈月令〉편 仲春之月조에 “이달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우레가 비로소 소리를 내며 처음으로 번개가 치며 겨울잠을 자던 버러지들이 모두 움직인다[是月也 日夜分 雷乃發聲 始電 蟄蟲咸動].”라고 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福永光司). 또 〈樂記〉편에서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이 하강하여 음양이 서로 부딪치고 천지가 서로 움직여서 雷霆으로 고무시키고 風雨로 떨치게 하며 사계절로 움직이게 하고 해와 달로 따뜻하게 하면 온갖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으니 음악이란 천지의 화합이다[地氣上齊 天氣下降 陰陽相摩 天地相蕩 鼓之以雷霆 奮之以風雨 動之以四時 煖之以日月 而百化興焉 如此則樂者天地之和也].”라고 한 내용도 참조할 만하다(陸樹芝, 池田知久).
- 역주19 其卒無尾 其始無首 : 이 음악(咸池樂)은 마침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시작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음. 卒은 음악의 마침이고 始는 음악의 시작이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음악이라는 뜻. 成玄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이다[無始無終].”라고 풀이했는데, 《老子》 제14장에 나오는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따라가도 그 꽁무니를 볼 수 없다[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라고 한 표현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리가 가늘고 길게 이어져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고 조용히 일어나서 어디서 시작하는 지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 역주20 一死一生 一僨一起 :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며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함.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음악의 연속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끝났나 싶으면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동정이 반복되는 도의 모습을 음악으로 형용한 것이다. 司馬彪는 僨을 “엎어짐이다[仆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21 所常無窮 : 일정함이 끝이 없음. 所常은 일정함, 변함이 없는 바인데, 郭象은 “변화를 일정한 모습으로 삼기 때문에 일정함이 끝이 없다[以變化爲常 則所常者無窮也].”라고 풀이했다. 이 郭象 注를 따르면 莊子의 道의 不變의 모습은 변화이다. 변화의 흐름이 바로 道인 것이다.
- 역주22 一不可待 : 하나도 예측할 수 없음. 전혀 알 수 없다는 뜻. 一은 兪樾의 견해를 따라 ‘모두, 전혀[皆]’의 뜻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데 池田知久에 의하면 兪樾 이전에 이미 宣穎이 “조금도 없다[毫無].”는 뜻으로 풀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 ‘전혀’라는 뜻으로 풀이한 것은 宣穎이 앞선다고 해야 한다. 不可待는 기다릴 수 없다, 예측이 不可하다는 뜻이다. 一不可待의 一을 成玄英이 “지극히 한결같은 이치이다[至一之理].”라고 풀이한 것은 不可하다(池田知久). 待는 〈逍遙遊〉편 제1장의 ‘彼且惡乎待哉’의 待와, 〈齊物論〉편 제4장의 ‘若其不相待’와 제5장에 나오는 ‘吾有待而然者邪’의 待자와 같은 맥락이다(池田知久).
- 역주23 汝故懼也 : 너는 그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끝없이 변화하여 어떻게 변할지 전연 예측이 불가하니, 너는 그 때문에 不安하고 聚張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뜻.
- 역주24 吾又奏之以陰陽之和 燭之以日月之明 : 〈다음에, 第二奏에서는〉 나는 또 음양의 조화에 따라 연주하고, 해와 달의 밝음을 따라 음악을 화려하게 연주함. 郭象은 “이른바 자연[天]의 도를 이용함이다[所謂用天之道].”라고 풀이했다. 馬叙倫은 燭을 照의 가차로 풀이했는데 여기서는 음악을 밝게 연주했다는 뜻, 곧 화려하게 연주했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 역주25 能短能長 能柔能剛 : 그 소리를 짧게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길게 늘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굳세게 할 수도 있음. 能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敦煌본에는 能長이 빠져 있다(寺岡龍含, 楊明照, 池田知久).
- 역주26 變化齊一 不主故常 : 일제히 변화하여 옛 가락에 구애받지 않음. 齊一은 일제히, 나란히, 똑같이의 뜻. ‘不斷히’로 번역하기도 한다(池田知久). 林希逸은 “같음이다[同也].”라고 풀이했다. 馬叙倫은 主를 住의 생략이라 했는데 통용하는 글자이다. 故는 옛것으로 舊와 같다. 林希逸은 ‘舊’로 풀이했다. 成玄英은 “뭇 생명들의 길고 짧음을 따르고 만물의 강유에 따라 맡기며 변화의 한결같은 이치를 가지런히 하는데 어찌 옛것을 지켜 일정함을 고집하겠는가[順群生之修短 任萬物之柔剛 齊變化之一理 豈守故而執常].”라고 풀이했다. 〈秋水〉편에 “사물 각각의 운명도 일정함이 없고 終始는 되풀이되어 옛것에 집착함이 없다[分無常 終始無故].”라고 한 내용을 참조할 것(福永光司, 池田知久).
- 역주27 在谷滿谷 在阬滿阬 : 골짜기를 만나면 골짜기를 채우고 작은 구덩이를 만나면 구덩이를 채움. 阬은 坑과 같이 구덩이. 郭象은 “至樂의 도리는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다[至樂之道 無不周也].”라고 풀이했고, 成玄英도 비슷하다. 王敔가 “큰 것도 채우지 않음이 없고 작은 것도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大無不充 小無不入].”라고 한 것이 대의를 잘 살린 풀이이다. 陸德明은 《爾雅》를 인용하여 阬을 빈 공간[虛]으로 풀이했다(池田知久).
- 역주28 塗卻守神 : 욕망의 틈을 막고 정신을 지킴. 감각적 욕망의 틈[卻]을 막고 순수한 정신을 지킨다는 뜻이다. 塗는 막는다[塞]는 뜻(成玄英). 卻은 틈. 陸德明은 “틈[隙]과 뜻이 같다[與隙義同].”라고 풀이했다. 이외에 成玄英도 “구멍이다[孔也].”라고 풀이했다. 《老子》 제56장에 보이는 “塞其兌 閉其門”의 뜻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郭象은 ‘塞其兌’를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풀이했다.
- 역주29 以物爲量 : 物로서 量을 삼는다, 物로서 大小를 삼는다고 逐字譯이 되는데, 物에 그대로 따른다, 대상 사물의 있는 그대로에 順應한다는 뜻이다. 池田知久에 따르면, 音樂論으로서는 羅勉道가 “스스로 사물의 분수와 함량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따라 소리를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한다[自隨物分量所受 以爲聲之大小].”라고 풀이한 것이 그럴듯하다.
- 역주30 其聲揮綽 : 그 소리가 맑게 울림. 揮는 빛난다는 뜻으로 ‘暉’와 같고 綽은 밝다는 뜻으로 焯과 같다. 여기서는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맑다’로 번역하였다. 馬叙倫은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暉는 빛남이고 焯은 밝음이다[暉 光也 焯 明也].”라고 풀이하고 暉자와 焯자의 가차자로 보았는데 타당한 견해이다.
- 역주31 其名高明 : 그 〈咸池樂이라는〉 이름이 높고 밝게 빛남. 名은 곡조, 또는 곡조의 이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咸池樂이라는 음악의 이름을 말한다. 林雲銘은 “마디와 곡조 중에서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것[節奏之可名象者也].”이라고 풀이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高明은 수준이 높다는 뜻으로 《中庸》에 자주 보이는 표현이다. 《禮記》 〈月令〉편에서 “이달에는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볼 만하다[是月也 可以居高明 可以遠眺望].”라고 한 것이 참고가 되는데(池田知久), 이때는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 밖에 《春秋左氏傳》 文公 5년조와 《尙書》 〈洪範〉편 등에도 보인다(福永光司).
- 역주32 鬼神守其幽 : 귀신도 어두운 곳을 지켜 떠나지 않음. 〈이 음악의 영향으로〉 귀신도 차분히 幽冥界에 그대로 머물러, 세상 사람들에게 災殃을 입히려고 나돌아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곧 귀신도 협조한다는 뜻. 成玄英이 말한 것처럼 《老子》 제60장의 사상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天地〉편 제1장의 “무심을 얻게 되면 귀신도 복종한다[無心得而鬼神服].”라고 한 내용과 〈天道〉편 제3장에서 “天樂을 알게 되면……귀신의 재앙도 없게 된다[知天樂者……無鬼責].”라고 한 것과 같은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역주33 止之於有窮 流之於無止 : 〈演奏를〉 어느 때는 有限의 세계에 그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침이 없는 무한의 세계에까지 흘려보내기도 함. 有窮은 유한의 세계이고 無止는 무한의 세계로 無窮과 같다. 赤塚忠이 “有無를 兼하고 있음을 말함이다.”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池田知久). 郭象은 “변화를 따라감이다[隨變而往也].”라고 풀이했고, 成玄英은 “流는 움직임이다. 감응에 일정함이 없어서 때에 따라 꼭 맞게 변하여 일정한 것을 고집하는 적이 없다. 그 때문에 고요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이다[流 動也 應感無方 隨時適變 未嘗執守 故寂而動也].”라고 풀이했는데 지나치게 추상적인 풀이이다.
- 역주34 子欲慮之而不能知也 : 底本에는 子가 予로 되어 있으나 다른 通行本에 따라 子로 고침. 자네가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알 수 없음. 子자가 予자로 표기된 판본으로는 馬叙倫, 劉文典, 王叔岷 등이 있으나 앞에 말한대로 子자로 고쳤다. 敦煌본에도 子자로 표기되어 있다(寺岡龍含, 池田知久). 이하의 세 구절에 대하여는 《老子》 제14장에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夷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希라 하고, 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微라 한다[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라고 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阮毓崧, 池田知久).
- 역주35 儻然立於四虛之道 : 흐리멍덩 넋이 나간 채 사방으로 끝없이 터진 大道 가운데 섬. 池田知久에 의하면, 儻은 曭(흐릿할 당)으로 표기된 인용문이 있으며(馬叙倫), 矘의 가차라 하는 주장이 있으나(王叔岷, 福永光司, 金谷治) 적당하지는 않으며, 또 陸德明이 “창으로 읽기도 한다[一音敞].”라고 했고, 郭象이 “넓고 높아서 치우침이 없음을 말한다[弘敞無偏之謂].”라고 풀이한 것을 따라 敞의 가차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馬叙倫) 역시 부적당하다. 의미는 成玄英이 “사심이 없는 모양[無心貌].”이라고 풀이한 것이 무난하지만, 丁展成(《莊子音義釋》, 1931)이 惝의 가차자로 보고 멍한 모습으로 풀이한 것이 정확하다. 말하자면 自己喪失의 모양이다. 四虛는 成玄英이 “사방이 텅 빔을 말함이다[謂四方空].”라고 풀이한 것이 정설이다(池田知久).
- 역주36 倚於槁梧而吟 : 〈음악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답시고〉 말라 버린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어 신음 소리만 냄. 〈德充符〉편 제6장에서 “나무에 기대 신음 소리나 내고, 말라 버린 오동나무로 만든 안석에 기대 졸기나 하고 있다[倚樹而吟 據槁梧而暝].”라고 한 표현을 모방한 글이다(林希逸, 阮毓崧). 〈德充符〉편 제6장에서 惠施류의 변론가들을 비판한 것처럼 여기서도 잔재주를 부리는 분석적 학문이 道라는 音樂 앞에서는 전혀 無力하기만 함을 풍자한 표현이다(池田知久).
- 역주37 目知 窮乎所欲見 : 눈과 知의 능력은 보고자 하는 데서 다함. 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눈과 知의 능력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다. ‘目知窮乎所欲見’의 앞에는 본래 ‘心窮乎所欲知’가 있었던 것이 脫落하고 ‘知’자 한 글자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馬叙倫의 견해이다(福永光司). 또 바로 앞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心 窮乎所欲知’와 바로 뒤의 ‘力 屈乎所欲逐’과의 자연스런 대구를 위해 目知 두 글자 중 한 글자를 연문으로 처리하거나 目자가 自로 표기된 판본이 있다는 견해나 曰로 고치는 說이 있으나 여기서는 池田知久의 견해를 따라 그대로 둔다. 현대의 《莊子》 번역에서도 예를 들어 일본의 金谷治나 福永光司가 ‘目知窮乎所欲見’에서 ‘知’를 깎아 내어 ‘目窮乎所欲見’으로 원문을 고쳐서 해석하고 있기도 하나 우리나라 安東林이나 일본의 池田知久의 번역에서는 ‘目知窮乎所欲見’으로 ‘知’를 깎아 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安東林의 해석에서는 ‘知’를 생략한 번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本文은 ‘目知……’로 생략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池田知久의 지적대로, 近代的 眼目에서 바라보는 文章의 整合性을 古文獻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역주38 力屈乎所欲逐 : 힘은 쫓아가고자 하는 데서 다하기 때문이다. 힘은 발의 힘을 말하는데 이 뜻은 쫓고자 하는 것 때문에 발의 힘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屈은 竭과 같은 뜻이고, 力屈乎所欲逐은 ‘力屈乎所欲逐故也’의 ‘故也’ 두 글자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된다. 咸池의 음악에 대하여 目知나 力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 역주39 吾旣不及已夫 : 나도 이미 거기에 미칠 수 없음. 나도 이제는 도저히 그 咸池의 음악의 경지에 미칠 수 없다는 뜻이다. 吾는 黃帝. 吳汝綸은 北門成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 하나(林雲銘에 유래한다) 부적당하다(池田知久). 夫자가 矣자로 표기된 판본이 있다(劉文典, 王叔岷).
- 역주40 形充空虛 : 〈이 咸池樂의 연주를 듣고 나면〉 인간의 육체에 空虛함이 충만함. 인간의 육체가 안으로 공허함이 가득하다는 뜻도 되는데 이는 곧 마음을 비우게 된다는 뜻이다.
- 역주41 乃至委蛇 : 마침내 힘이 빠져 흐느적 흐느적 종잡을 수 없게 됨. 委蛇는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모양. 陸德明은 蛇자가 施로 표기된 판본도 있다고 했다. 委蛇는 〈應帝王〉편 제5장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대하다[吾與之虛而委蛇].”라고 한 데서 이미 나왔지만 의미는 다소 다르다.
- 역주42 吾又奏之以無怠之聲 : 나는 또 〈第三奏로서〉 나른함을 없애는 소리를 연주함. 無怠之聲은 나른함이 없는 소리, 즉 나른한 느낌을 一掃하는 曲調라는 뜻이다.
- 역주43 調之以自然之命 : 자연의 명령으로, 자연의 명령에 따라 곡조를 조절함. 馬叙倫은 命을 令의 假借字로 보고 음악의 마디[節奏]를 말하는 것이라 했고, 于省吾는 命을 名의 뜻이라 했는데 모두 적절치 않다(池田知久). 自然之命은, 郭象이 “命에 있는 것은 人爲가 아니라 모두 自然일 뿐이다[命之所有者 非爲也 皆自然耳].”라고 풀이했는데 여기서는 이 견해를 따라 자연의 명령으로 번역하였다. 자연의 명령에 따라 곡조를 조절하였다고 하는 것은 自然의 節奏로 음악을 잘 정비하였다는 뜻.
- 역주44 混逐叢生 : 만물이 떨기로 자라는 것처럼 이리저리 뒤섞여서 서로 쫓아다님. 叢生은 떨기로 자라는 모양. 混逐은 뒤섞여서 이리저리 뛰면서 쫓아다니는 모양. 林希逸이 “만물이 떨기로 자라는 것처럼 이리저리 뒤섞여서 서로 쫓아다님이다[如萬物之叢生 而混同相追逐也].”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馬蹄〉편 제2장에서 “금수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초목이 마음껏 자랄 수 있었다[禽獸成群 草木遂長].”라고 한 내용과 같은 의미(陸長庚)이다. 또 呂惠卿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在宥〉편 제4장에서 “만물이 많고 많다[萬物云云].”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 混逐叢生의 앞에 故若 두 字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랬더니[故로]鳥獸가 섞여 살고[混] 희롱하며 서로 쫓고[逐], 草木이 뒤엉켜 생겨나서[叢生]……같다[若].”로 번역할 수도 있다.
- 역주45 林樂而無形 : 모두 크게 즐거워하면서도 그렇게 만든 음악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林樂은 수풀이 무성한 것처럼 모두 크게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뜻. 林希逸이 “수풀처럼 즐거워함이니 수풀처럼 빽빽이 즐거움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林然而樂 言林林摠摠 無非樂也].”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羅勉道, 陸長庚, 王敔, 林雲銘, 宣穎, 陸樹芝, 陳壽昌도 거의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池田知久). 郭嵩燾가 “만물이 서로 함께 어울려 즐김이다[相與群樂之].”라고 풀이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池田知久). 林樂을 만물의 合奏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흥미 있는 해석이다. 無形은 褚伯秀가 〈齊物論〉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만물로 하여금 성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찾아도 찾을 수 없다[所以怒號者 求之而不可得也].”라고 풀이한 것이 뛰어나다(池田知久).
- 역주46 布揮而不曳 幽昏而無聲 : 널리 울려 퍼지는데도 끌고 다니지 않으며,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다.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음은 소리가 꺼져 감을 말한다. 布揮는 널리 퍼지는 모양. 成玄英은 “사계절을 움직이고 만물을 두루 펼쳐서 각기 제자리를 얻게 하니 끌고 다녀서 그리된 것이 아니다[揮動四時 布散萬物 各得其所 非由牽曳].”라고 풀이했는데 대의는 적절하지만 揮자는 흩어진다[散]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高亨, 池田知久). 曳는 질질 끌고 다님. 馬叙倫은 “引과 같다.”라고 풀이했다.
- 역주47 動於無方 居於窈冥 : 일정한 방향 없이 움직이고 그윽하고 어두운 근원의 세계에 조용히 머뭄. 무한정한 경지에 움직여 다니다가 근원의 세계에 조용히 휴식한다는 뜻. 動과 居는 상반된 표현으로 ‘動於無方’은 어디에나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뜻. 곧 음악이 어디에든 울려 퍼진다는 뜻이다. 〈在宥〉편 제6장에서 “메아리 없는 곳에 머물며 일정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움직여서 그대들을 데리고 어지러운 도의 세계로 돌아가서 한없이 노닐며 출입함에 일정한 장소가 없다[處乎無嚮 行乎無方 挈汝適復之撓撓 以遊無端 出入無旁].”라고 한 부분과 유사하다. 窈冥은 〈在宥〉편 제3장에도 ‘窈窈冥冥’과 ‘窈冥之門’ 등으로 표현된 적이 있다(池田知久). 또 《老子》 제21장의 “窈兮冥兮”도 참고할 만하다(福永光司).
- 역주48 或謂之死 或謂之生 或謂之實 或謂之榮 : 어떤 사람은 죽었다(소리가 끊겼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충실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 없이 꽃만 무성하다고 함. 榮은 林希逸에 의거 華의 뜻. 어떤 사람은 소리가 끊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충실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열매 없이 꽃만 무성하여 허무하다고 한다는 뜻이다.
- 역주49 行流散徙 不主常聲 : 자유자재로 流轉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일정한 소리에 얽매이지 않음. 行流는 자유자재로 유전한다는 뜻. 散徙는 이리저리 옮겨 다님. “不主常聲”은 위 문장의 “不主故常”과 같은 의미이다(林希逸). 成玄英은 “봄이 되면 만물이 자라나고 겨울이 되면 만물이 죽고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맺고 여름에 만물이 꽃을 피우며 구름이 몰려다녀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따르는 것은 모두 자연의 이치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하니 至樂의 도리가 어찌 한 가지 소리만을 고집하겠는가[夫春生冬死 秋實夏榮 雲行雨散 水流風從 自然之理日新其變 豈主一聲也].” 하고 풀이했다.
- 역주50 稽於聖人 : 聖人에게 물어봄. 稽는 물어본다는 뜻이다. 林希逸은 “세상 사람들이 이에 이르러 의심하여 깨우치지 못하자 마침내 그것을 성인에게 물어보기에 이른 것이다. 稽는 깊이 생각함이니 묻는다는 뜻이다[世人至此 疑而不曉 乃以問於聖人 稽 首考也 問之意也].”라고 풀이했다. 成玄英은 稽를 “붙들다[留也].”는 뜻으로 풀이했는데 성인을 붙들고 물어본다는 뜻으로 이해한 듯하다.
- 역주51 達於情而遂於命也 : 자기의 情性을 남김없이 실현하고 주어진 명령을 완수함. 자기의 情性을 남김없이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聖人이 本性을 남김없이 다 실현하는 生을 완수함을 말하고, 주어진 명령을 완수함이란 성인이 주어진 天命을 남김없이 완수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天地〉편 제12장의 “致命盡情”과 같은 뜻이다(池田知久). 成玄英의 疏에 근거해서 〈聖人을〉 “만물의 實情에 통달하고 주어진 운명을 완수하는 존재라.” 한 해석(福永光司, 安東林 등)은 따르지 않는다.
- 역주52 天機不張而五官皆備 : 자연의 造化(天機)를 인위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五官의 기능이 갖추어짐. 天機는 〈大宗師〉편 제1장에 이미 나왔다(福永光司, 池田知久 등).
- 역주53 此之謂天樂 : 이것을 일러 天樂이라 함. 天樂은 〈天道〉편 제3장에 “與天和者 謂之天樂”이라고 한 데서 이미 나왔다(阮毓崧, 池田知久).
- 역주54 無言而心說(열) : 말없이 마음으로 기뻐함. 說은 悅로 표기된 판본과 인용문이 있는데(王叔岷) 두 글자는 통용하는 글자이다. 心說은 天樂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부분에 語句의 倒錯이나 脫文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대로 두고 해석한다. 池田知久는 無言이 ‘稽於聖人’을 이어받은 것이고 心說이 ‘天樂’을 이어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 역주55 有焱(염)氏 : 成玄英에 의하면 神農의 별칭이다. 이 장의 내용을 따르면 黃帝 이전의 帝王을 말하는 것이고 또 陸德明에 의하면 焱자가 炎으로 표기된 판본도 있으므로 炎帝 神農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역주56 聽之不聞其聲 視之不見其形 : 들으려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보려 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음. 《老子》 제14장과 제41장을 참조할 것.
- 역주57 苞裹六極 : 六極을 감싸 안음. 陸德明은 어떤 판본에는 苞자가 包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다. 두 글자는 통한다(王叔岷). 六極은 上下四方의 極을 말한다. 六合과 같은 뜻이며, 이 편의 제1장에 이미 나왔다.
- 역주58 故惑也 : 그래서 어지러워진 것일 게다. 思慮分別을 잃고 어지러워져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게 되는, 放心 상태가 곧 ‘惑’이다. 그런데 이 懼‧怠‧惑의 세 과정이 바로 道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역주59 始於懼 懼故祟 : 〈咸池의 음악은〉 처음에는 듣는 자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하나니, 두려워하게 되기에 불안감이 생긴다. 음악을 듣는 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니 그 때문에 不安感이 喚起된다는 뜻이다. 두려워하게 함.
- 역주60 怠故遁(둔) : 〈힘 빠진 듯〉 나른하기에 멀리 도망치게 됨. 郭象이 “遁은 자취가 차츰 없어짐이다[迹稍滅也].”라고 註解한 이래로 그 해석을 따르는 주석이 없지 않으나 池田知久가 든, 羅勉道가 “나른해지면 心力이 지치고 다해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자 하게 된다. 그래서 달아난다고 말하는 것이다[怠則心力疲竭 欲棄去之 故曰遁].”라고 한 것을 따라 “멀리 도망치게 된다.”라고 번역하였다.
- 역주61 愚故道 : 어리석기에 道와 하나가 될 수 있음. 逆說的인 말인데, 郭象은 “知가 없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한 것이니 어리석음이 바로 가장 지극한 경지이다[以無知爲愚 愚乃至也].”라고 풀이했고, 成玄英은 “마음에 분별함이 없음이다[心無分別].”라고 풀이했다. 〈齊物論〉편 제4장에서 “성인은 어리석고 둔한 듯하다[聖人愚芚].”라고 했고, 〈天地〉편 제8장에서는 “마치 어리석고 마치 어두운 듯하니 이를 일러 깊은 덕이라 하니 대순과 동화된다[若愚若昏 是謂玄德 同乎大順].”라고 한 대목과도 유사하다(赤塚忠). 또 《老子》 제20장에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나 보다[我愚人之心也哉].”라고 한 내용, 그리고 제67장의 “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도가 크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도는 모자란 것 같다. 크기 때문에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天下皆謂我道大 似不肖 夫唯大 故似不肖].”라고 한 내용도 참고할 만하다.
- 역주62 道可載而與之俱也 : 道에 내 몸을 싣고 道와 함께할 수 있음. 이것은 “道를 이것을 可히 내 몸에 싣고서 이것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조금씩 뜻이 다르다. 〈天地〉편 제11장의 “神生이 불안정하게 된 자에게는 道가 깃들지 않는다[神生不定者 道之所不載也].”라고 한 것을 참고(池田知久)하면 “道를 내 몸에 싣는다.”는 뜻이 되나, 宣穎의 해석을 따르면 “도를 타고 간다[乘道而往].”는 뜻이 되니 이것을 따르면 일반적인 해석인 “道에 내 몸을 싣는다.”는 뜻이 된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내 몸과 道가 일체가 된 경지를 말하는 것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 장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