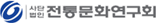장자(3)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장자(1)
- 여닫기 장자(2)
- 여닫기 장자(3)
- 여닫기 장자(4)
其生이 若浮하고 其死 若休하니
故로 曰 이라하노니
그 때문에 “성인은 살아 있을 때에는 자연의 운행을 따르고 죽을 때에는 물物의 변화를 따르니 고요히 머물 때에는 음陰과 덕을 함께하고, 활동活動할 때에는 양陽의 기氣와 같이 물결치듯 움직인다.”고 말한다.
복福의 앞이 되지도 아니하고 화禍의 시작이 되지도 아니하고 외물外物에 감촉感觸된 뒤에 비로소 호응하며 외물外物이 급박하게 다가온 뒤에 비로소 움직이며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된 뒤에 비로소 일어난다.
지혜知慧와 작위作爲를 버리고 오로지 자연의 이법을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재앙이 없으며, 외물外物에 얽매임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비난받음이 없으며, 귀신에게 책망받는 일도 없다.
살아 있을 때에는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죽을 때에는 마치 쉬러 들어가는 것처럼 편안하다.
미리 생각하거나 미리 계획하지 아니하며 안으로 빛이 갖추어져 있어도 밖으로 번쩍거리지 아니하며, 사람됨이 믿을 만하지만 기약期約하지 아니하며 잠잘 때에는 꿈꾸지 아니하며, 깨어서도 걱정하지 않으며, 정신은 순수하며, 혼魂은 지치지 않아서 무심無心(虛無)하고 무욕無欲(恬淡)하여 마침내 자연自然 본래의 작용(天德)과 합치된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감정은 본래의 덕이 비뚤어진 것이고, 희喜와 노怒의 감정은 자연自然의 도道가 잘못된 것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본래의 덕이 상실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과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덕의 극치이고 마음이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 것은 고요함의 극치이며 〈외물外物의 움직임에〉 거슬림이 없는 것은 허虛의 극치이고 외물外物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담담함의 극치이고 외물을 거스름이 없는 것은 순수의 극치이다.
- 역주
- 역주1 故曰 聖人之生也 天行 其死也 物化 靜而與陰同德 動而與陽同波 : 그 때문에 “성인은 살아 있을 때에는 자연의 운행을 따르고 죽을 때에는 物의 변화를 따르니 고요히 머물 때에는 陰과 덕을 함께하고, 活動할 때에는 陽의 氣와 같이 물결치듯 움직인다.”고 말한다. 天行은 자연의 운행이란 뜻이니 철저하게 자연현상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物化는 物의 변화란 뜻이니 物體轉生의 한 현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문장은 〈天道〉편 제3장에 거의 같은 문장이 보인다. “그 때문에 ‘자연의 즐거움[天樂]을 아는 사람은 살아 있을 적에는 자연[天]과 함께 움직이고 죽어서는 사물과 동화되며 고요할 적에는 陰氣와 德을 함께하고 움직일 때에는 陽氣와 파동을 함께한다. 그 때문에 자연의 즐거움[天樂]을 아는 이는 하늘의 원망을 받지도 않고 사람의 비난을 받지도 않고 사물의 얽매임도 받지 않고 귀신의 책망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故曰 知天樂者 其生也天行 其死也物化 靜而與陰同德 動而與陽同波 故知天樂者 無天怨 無人非 無物累 無鬼責].” 故曰의 내용을 ‘動而與陽同波’에서 끊는 독법을 취하여 여기에 ‘……라 하나니라’로 현토하였는데 뒤의 ‘不得已而後起’까지를 모두 曰의 내용으로 보아 起자 아래에 ‘……라 하나니라’로 현토하는 독법도 있다.
- 역주2 不爲福先 不爲禍始 : 福의 앞이 되지도 아니하고 禍의 시작이 되지도 아니함. 보통 사람들은 복은 좇으려 하고 화는 피하려 하지만 성인은 화와 복을 모두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淮南子》 〈精神訓〉편에 거의 같은 문장이 나온다. 郭象은 “唱導(앞서서 인도)함이 없음이다[無所唱也].”고 풀이했고, 成玄英은 “선행은 복의 앞이 되고 악행은 화의 시작이 된다. 이미 선악을 모두 보내 버리고 화복을 다 잊어서 사물에 감촉된 뒤에야 호응하니 어찌 앞이나 시작이 되겠는가[夫善爲福先 惡爲禍始 旣善惡雙遣 亦禍福兩忘 感而後應 豈爲先始者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3 感而後應 迫而後動 : 外物에 感觸된 뒤에 비로소 호응하며 外物이 급박하게 다가온 뒤에 비로소 움직임. 《管子》 〈心術 上〉편에 “감촉된 뒤에 호응하고……사물이 이른 뒤에 호응한다[感而後應……物至則應].”고 한 내용이 보이고, 《淮南子》 〈原道訓〉편에도 “감촉된 뒤에 호응하고……사물이 이른 뒤에 정신이 호응한다[感而後動……物至而神應].”고 한 내용이 있고, 또 “급박하게 다가오면 호응하고 감촉되면 움직일 수 있다[迫則能應 感則能動].”고 한 부분이 있고, 〈精神訓〉편에도 “감촉되면 호응하고 급박하게 다가오면 움직이고 부득이한 뒤에 나아간다[感而應 迫而動 不得已而往].”고 한 내용이 보인다. 迫은 급박하게 다가온다는 뜻. 成玄英은 “다가옴이니 가까이 닥침이다[至也 逼也].”고 풀이했다. 動은 호응한다는 뜻. 成玄英은 ‘應’으로 풀이했다.
- 역주4 不得已而後 起 :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된 뒤에 비로소 일어남. 郭象의 〈莊子序〉에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어쩔 수 없게 된 뒤에야 일어나는 이[夫寂然不動 不得已而後起者].”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郭象이 지칭한 성인은 노자가 아니라 공자라는 점은 王弼이 《周易注》에서 노자가 아닌 주공과 공자를 성인으로 지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진 시기의 玄學을 규정하는 데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本書에서는 〈人間世〉편 제1장에서 “오로지 道를 거처로 삼아 부득이할 때에만 말할 수 있다면 거의 가까울 것이다[一宅而寓於不得已 則幾矣].”라고 한 내용이나, 〈大宗師〉편 제1장에서 “臨迫해서 움직여 마지못한 듯하다[崔乎其不得已乎].”고 한 것처럼 자주 나오는 주요 어구이다(池田知久 참조).
- 역주5 去知與故 : 知慧와 作爲를 버림. 故는 故意, 짐짓 ~하려는 의도. 인위적인 행위를 뜻한다. 林希逸은 “일의 자취이다[事迹也].”고 하여 故를 事故의 故로 풀이했지만 옳지 않다(池田知久). 陳壽昌이 “마음이 있음을 말함이다[有心之謂].”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王先謙이 “기교이다[巧也].”고 풀이한 것, 馬叙倫이 “거짓으로 속인다는 뜻이다[詐僞之義].”고 풀이한 것도 무난하다. 阮毓崧, 劉文典, 王叔岷, 李勉, 金谷治, 赤塚忠, 陳鼓應, 池田知久 등도 거의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管子》 〈心術 上〉편에도 “군자는……조용히 즐거워함에 거짓이 없어서 지혜와 작위를 버린다[君子……恬愉無爲 去智與故].”고 한 내용이 있다. 또 《呂氏春秋》 〈論人〉편과 《韓非子》 〈揚權〉편, 《淮南子》 〈原道訓〉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池田知久).
- 역주6 循天之理 : 오로지 자연의 이법을 따름. 天之理는 자연의 이법, 〈養生主〉편 제2장에서 庖丁이 소를 잡으면서 “천리를 따른다[依乎天理].”는 내용이 있고, 〈盜跖〉편 제2장에도 “자연의 이법을 따른다[從天之理].”는 표현이 보인다. 그 밖에 〈秋水〉편 제1장에는 “아직 천지의 이법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未明天地之理].”는 표현이 있고, 〈漁父〉편에는 “참으로 자연의 이법이다[固天之理也].”고 한 표현도 보인다. 또 《管子》 〈心術 上〉편에도 “이법에 따라 움직인다[緣理而動].”는 표현이 있고, 《淮南子》 〈原道訓〉편, 《禮記》 〈樂記〉편에도 “천리가 소멸될 것이다[天理滅矣].”고 한 표현이 있는데 각각의 문헌마다 내용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천리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池田知久를 참조할 것). 循은 따른다는 뜻. 成玄英은 “따름이다[順也].”고 풀이했다.
- 역주7 故無天災 無物累 無人非 無鬼責 : 그러므로 하늘의 재앙이 없으며, 外物에 얽매임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비난받음이 없으며, 귀신에게 책망받는 일도 없음. 〈天道〉편 제3장에 “그 때문에 자연의 즐거움[天樂]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원망을 받지도 않고 사람의 비난을 받지도 않고 사물의 얽매임도 받지 않고 귀신의 책망도 받지 않는다[故 知天樂者 無天怨 無人非 無物累 無鬼責].”고 하여 거의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池田知久).
- 역주8 不豫謀 : 미리 계획하지 아니함. 豫는 預로 표기되어 있는 판본과 인용문이 있는데 預가 俗字이다(王叔岷).
- 역주9 光矣而不燿 : 안으로 빛이 갖추어져 있어도 밖으로 번쩍거리지 아니함. 《老子》 제58장에서 “빛이 있지만 번쩍거리지 않는다[光而不燿].”고 한 구절이 있고, 제4장의 “빛을 누그러뜨려 세속과 함께한다[和其光 同其塵].”고 한 구절도 비슷한 의미이다.
- 역주10 信矣而不期 : 사람됨이 믿을 만하지만 期約하지 아니함. 林希逸의 “다른 사물에 기필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不取必於物也].”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宣穎, 陸樹芝, 阮毓崧, 李勉 등의 견해도 대체로 비슷하다(池田知久). 〈天地〉편 제13장에 나오는 “마땅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信이라 자랑할 줄 몰랐다[當而不知以爲信].”고 한 것과 비슷한 사유이다(阮毓崧).
- 역주11 其寢不夢 其覺(교)無憂 : 잠잘 때에는 꿈꾸지 아니하며, 깨어서도 걱정하지 않음. 〈大宗師〉편 제1장에 “옛날의 진인은 잠잘 때에는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 있을 때에는 근심이 없었다[古之眞人 其寢不夢 其覺無憂].”고 하여 진인의 생활을 동일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며, 〈齊物論〉편에는 “〈세속적인 인간은〉 잠들어서도 꿈을 꾸어 마음이 쉴 사이가 없고, 깨어나서는 신체가 外界의 욕망을 받아들여 사물과 접촉해서 분쟁을 일으켜 날마다 마음속에서 싸운다[其寐也魂交 其覺也形開 與接爲構 日以心鬪].”고 하여 번민에 시달리는 세속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둘 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역주12 其神純粹 其魂不罷(피) : 정신은 순수하고, 魂은 지치지 않음. 〈天道〉편 제3장에 “그 精神(鬼와 魂)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다[其鬼不祟 其魂不疲].”고 한 내용을 토대로 삼아 수정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罷는 지친다는 뜻으로 疲와 같으며 음도 ‘파’가 아니고 ‘피’이다. 林希逸이 “疲와 같다[與疲同].”고 풀이했고, 馬叙倫은 疲의 假借字라 했는데 위에 인용한 〈天道〉편 제3장에 ‘疲’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 역주13 虛無恬惔 乃合天德 : 無心(虛無)하고 無欲(恬淡)하여 마침내 自然 본래의 작용(天德)과 합치됨. 虛無의 虛는 虛心, 無는 無爲로 無心의 뜻이며 恬惔의 恬은 고요함, 惔은 담담함, 無欲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虛無恬惔은 無爲의 태도를 의미한다. 〈天地〉편 제1장에 “아주 오랜 옛날, 천하에 군림한 임금은 아무 것도 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니 天德을 실천한 것일 뿐이다[玄古之君天下 無爲也 天德而已矣].”라고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대의는 宣穎이 “이상은 모두 虛無恬淡에 해당하는 일이다[以上皆虛無恬淡也].”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池田知久).
- 역주14 悲樂者德之邪 喜怒者道之過 好惡者德之失 :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감정은 본래의 덕이 비뚤어진 것이고, 喜와 怒의 감정은 自然의 道가 잘못된 것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본래의 덕이 상실된 것이다. 《淮南子》 〈原道訓〉편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로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감정은 도가 비뚤어진 것이고,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덕이 상실된 것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 기욕은 본성이 얽매인 것이다[夫喜怒者道之邪也 憂悲者德之失也 好憎者心之過也 嗜欲者性之累也].”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 역주15 故心不憂樂 德之至也 :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과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덕의 극치임.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淮南子》 〈原道訓〉편에 보인다(池田知久).
- 역주16 一而不變 靜之至也 : 마음이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 것은 고요함의 극치임. 다음 문장에 “고요히 한결같음을 지켜 변하지 않는다[靜一而不變].”고 하여 靜을 풀이하는 표현이 나온다.
- 역주17 無所於忤 虛之至也 : 〈外物의 움직임에〉 거스름이 없는 것은 虛의 극치임. 《管子》 〈心術 上〉편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외물에 거스른다[不虛則仵於物矣].”는 표현이 보인다(池田知久). 忤는 ‘거스르다’는 뜻. 成玄英이 “거스름이다[逆也].”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於는 高亨이 “與와 같다[猶與也].”고 풀이하여 뒤의 ‘不與物交’와 같이 맞추려 했지만 그 뒤의 無所於逆의 於와 같이 보면 본래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무난하다(池田知久).
- 역주18 不與物交 惔之至也 : 外物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담담함의 극치임. 다음 장에 “恬淡하여 무위한다[惔而無爲].”고 하여 惔에 대한 풀이가 나온다. 交는 교류, 교섭한다는 뜻. 劉文典은 交자가 爻자의 誤字로 혼란스럽다[殽]는 뜻이라 했는데(池田知久), 交자 자체를 혼란의 뜻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지만 사물과 교류하는 모습을 어지러운 상태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 역주19 無所於逆 粹之至也 : 외물을 거스름이 없는 것은 순수의 극치임. 다음 장에 “순수함을 지켜 잡념을 섞지 않는다[純粹而不雜也].”고 하여 粹를 풀이한 말이 나온다(池田知久). 逆에는 맞이한다는 뜻도 있어, 林希逸이 맞이한다는 뜻을 취하여 “맞이함이니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으면 나에게 있는 것이 순수하게 유지된다[迎也 不將不迎 則在我者 純粹矣].”고 풀이하였고 赤塚忠도 같은 견해를 지지하였지만 池田知久도 그러하였듯이 취하지 않는다. 程明道의 ‘物來順應’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于鬯은 “逆에는 어지러운 뜻이 있다[逆有亂意].”고 풀이했지만 이것도 따르지 않는다(池田知久).
- 장자(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