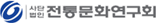장자(2)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장자(1)
- 여닫기 장자(2)
- 여닫기 장자(3)
- 여닫기 장자(4)
는 何人邪며
叟는 何爲此잇고
鴻蒙이 拊脾雀躍하고 對雲將하야 曰
遊하노라
雲將이 曰
朕은 願有問也하노라
鴻蒙이 仰而視雲將하야 曰
라
雲將이 曰
鴻蒙이
吾는 弗知로다
로다
雲將이 하다
又三年에 東遊하야 過하다가 而適遭鴻蒙하야
雲將이 大喜하야 行趨而進하야 曰
잇가
天은 忘朕邪잇가하고
再拜稽首하야 願聞於鴻蒙한대
鴻蒙이 曰
雲將이 曰
朕也 自以爲猖狂이어늘 而일새
鴻蒙이 曰
라
治人之過也니라
雲將이 曰
然則吾는 奈何오
鴻蒙曰
意라
로소니
어다
雲將曰
吾는 遇이 難하린대
願聞一言하노라
鴻蒙曰
意라
하라
汝 하리니
無問其名하며 無闚其情하면
하리라
雲將曰
호라하고
再拜稽首하고 起辭而行하니라
운장雲將이 동쪽으로 놀러 나가 거대한 부요扶搖나무의 가지를 지나가다 때마침 홍몽鴻蒙과 만났다.
홍몽이 막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놀고 있었는데 운장이 그를 보고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다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몽이 계속해서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운장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놀고 있다.”
운장이 말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홍몽이 머리를 들어 운장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으응? 그래.”
운장이 말했다.
“천기天氣가 고르지 않고 지기地氣가 엉기며, 육기六氣가 조화를 잃고 사계절이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육기의 정수를 모아 뭇 생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몽이 넓적다리를 두드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고개를 젓고는 말했다.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운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또 3년이 지난 뒤에 운장이 동쪽으로 놀러 나가 송나라의 들을 지나다가 마침 홍몽을 만났다.
운장은 크게 기뻐하면서 달려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께서는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늘께서는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운장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홍몽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홍몽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리저리 떠돌면서 무엇을 찾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바삐 놀기만 하면서 만물萬物의 거짓 없는 실상을 볼 뿐이니 내가 또 무엇을 알겠는가?”
운장이 말했다.
“저도 스스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제가 가는 데를 따라옵니다.
저도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백성들의 의지가 되고 있으니 한 마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홍몽이 말했다.
“하늘의 상도常道를 어지럽히고 만물의 실정實情을 어기면 현묘한 자연[玄天]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짐승의 무리를 흩어서 새들이 모두 밤에 울고 재앙災殃은 초목에까지 미치고 화禍는 벌레에까지 미치게 된다.
아!
이는 모두 〈무위無爲에 맡기지 않고〉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생긴 잘못이다.”
운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몽이 말했다.
“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운장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간해서는 선생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꼭 한 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홍몽이 말했다.
“아!
마음을 길러라.
그대가 무위에 머물기만 하면 만물이 저절로 감화될 것이다.
그대의 몸을 잊어버리고 그대의 총명을 버리고 세상의 규범이나 외물을 잊어버리면 혼돈한 도와 완전히 같아질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놓아서 고요히 혼도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만물이 성대하게 자라나고 각기 근본으로 돌아갈 것이니 각각 근본으로 돌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혼돈의 도와 일체가 되어 종신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곧 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대도 이름을 묻지 말고 실정을 엿보려 하지 마라.
그러면 만물은 저절로 생육될 것이다.”
운장이 말했다.
“하늘이신 선생께서 덕을 내리셨으며 말하지 않는 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몸소 이 도를 찾았는데 이제 비로소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 역주
- 역주1 雲將 : 인명. 작자가 구름을 의인화하여 가공한 인물. 《經典釋文》에서 李頤는 “구름을 거느리는 장수”라 했고, 兪樾은 “《楚辭》 〈九歌〉의 雲中君과 같은 것”이라 했다(池田知久). 또 福永光司는 제3장에 나오는 雲氣의 의인화라 했고, 呂惠卿은 “천하를 적시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以澤天下爲己任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2 扶搖 : 뽕나무. 扶桑. 바람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逍遙遊〉편 제1장의 扶搖는 회오리바람이고 여기의 扶搖는 扶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扶桑은 東海에 있는 巨大한 神木으로 《山海經》에 의하면 태양이 나오는 곳이라 한다. 《經典釋文》에는 扶자가 夫로 된 판본이 있다 했고, 李頤는 “扶搖는 신목이니 동해에서 자란다[扶搖 神木也 生東海].”라고 했다.
- 역주3 鴻蒙 : 역시 인명. 우주의 근원의 氣를 의인화하여 가공한 인물. 《經典釋文》에서 司馬彪는 “자연의 원기이다[自然元氣也].”라고 했고, 일설에는 “해상의 기이다[海上氣也].”라고 풀이했다. 또 呂惠卿은 “鴻은 크다는 뜻이고 蒙은 입었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살펴보면 그 물건의 됨됨이를 알 만하다[鴻大而蒙被 觀其名 則其物可知也].”라고 풀이했다. 《淮南子》 〈俶眞訓〉편과 〈道應訓〉편에는 ‘鴻濛’으로 되어 있다.
- 역주4 方將拊脾雀躍而遊 : 막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노닒. 拊는 치다는 뜻. 成玄英은 친다[迫也]는 뜻으로 풀이했다. 脾는 넓적다리[髀]. 奚侗의 주장처럼 髀의 假借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雀은 《經典釋文》에서는 一本에는 爵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지금도 爵으로 된 판본과 인용이 있다(王叔岷). 雀躍은 작은 새처럼 경망스럽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양. 《經典釋文》에는 일설에 “새가 뛰는 것과 같다[如雀之跳躍也].”라고 풀이했다.
- 역주5 倘然止 :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춤. 林希逸의 《莊子口義》에는 倘이 儻으로 되어 있다. 倘然은 멈칫하는 모양. 《經典釋文》에서 司馬彪는 “멈추려 하는 모양[欲止貌].”이라고 풀이했고, 李頤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모양[自失貌].”이라고 풀이했는데 다소 지나친 견해이며 맥락상 司馬彪의 견해가 무난하다.
- 역주6 贄然立 : 가만히 섬. 贄然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양. 《經典釋文》의 李頤는 贄를 “움직이지 않는 모양[不動貌].”이라고 풀이했다. 林希逸은 “우뚝 선 모양[屹立之貌].”이라 했고, 羅勉道는 “공손함을 극진히 하고 서서 마치 예물을 바치러 온 것 같이 함[致恭而立如執贄然].”이라 했는데 대의에 큰 차이는 없다.
- 역주7 叟 : 어르신. 《經典釋文》에서 司馬彪는 “연장자에 대한 호칭[長者稱].”이라고 풀이했다. 《孟子》 〈梁惠王 上〉의 ‘叟不遠千里而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長老에 대한 호칭[長老之稱 - 朱熹]으로 쓰였다.
- 역주8 不輟 : 그만두지 않음. 輟은 《經典釋文》의 李頤가 그침[止也]이라고 풀이한 것처럼 그만두다는 뜻.
- 역주9 吁 : 의아하게 여기며 대답하는 소리. 吁는 부정적인 함의를 담은 대답으로 《書經》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經典釋文》에 의하면 呼로 된 판본이 있다. 池田知久는 劉淇의 《助字弁略》에 탄식하는 소리[嘆也], 말의 느릿함[語之舒也], 의심하는 말[疑怪之辭], 그렇지 않다고 탄식하는 말[歎其不然之辭] 등의 풀이가 있음을 소개하고 뒤의 두 해석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 역주10 天氣不和 地氣鬱結 : 천기가 고르지 않고 지기가 엉김. 《經典釋文》에서 崔譔본에는 結이 綰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는 아마도 轉寫者의 잘못일 것이다(池田知久). 馬叙倫, 吳承仕도 要參照. 역시 池田知久에 의하면, 朱得之는 ‘天氣不和’ 이하의 네 구절은 이 편 제1장 ‘陰陽竝毗’ 이하의 세 구절이나 제3장 ‘雲氣不待族而雨’ 이하의 세 구절과 같은 趣旨라고 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11 今我願合六氣之精 以育群生 爲之奈何 : 지금 내가 육기의 정수를 모아 뭇 생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六氣’는 陰‧陽‧風‧雨‧晦‧朔 등의 자연현상(成玄英, 林希逸 등). 〈逍遙遊〉편 제1장에 이미 나왔다. 대의는 이 편 제3장의 “내가 천지의 정기를 가져다가 오곡의 생장을 도와 백성들을 기르고 또 나는 음양을 다스려 뭇 생명을 이루게 하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吾欲取天地之精 以佐五穀 以養民人 吾又欲官陰陽 以遂羣生 爲之奈何].” 하고 물은 내용과 같다(林希逸, 褚伯秀 등).
- 역주12 拊脾雀躍掉頭曰 : 넓적다리[脾]를 두드리고[拊] 껑충껑충 뛰면서[雀躍] 고개[頭]를 젓고[掉]는 말하였다. 여기서 掉頭는 머리를 젓다, 고개를 젓다는 否定하는 동작을 말한다. 흔들 도.
- 역주13 吾弗知 吾弗知 : 나는 몰라. 나는 몰라. 呂惠卿이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吾弗知 則是眞知也].”라고 말한 것처럼 앞의 〈齊物論〉 편 등에 나온 ‘無知의 知’를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문장에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무엇을 찾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바삐 놀기만 하면서 만물의 거짓 없는 실상을 볼 뿐이니 내가 또 무엇을 알겠는가[浮遊 不知所求 猖狂 不知所往 遊者 鞅掌 以觀無妄 朕又何知].” 하고 말한 것은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다(池田知久).
- 역주14 不得問 :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곧 答을 듣지 못했다는 뜻.
- 역주15 有宋之野 : 宋나라의 들판. 有는 有商, 有周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名 앞에 붙이는 接頭語. 성대하다는 뜻의 美稱이기도 하다.
- 역주16 天忘朕邪 : 天은 하늘인데 여기서는 鴻蒙에 대한 극존칭. 成玄英 疏에 上天처럼 공경한다고 하였다. 앞 장에서 黃帝가 廣成子를 하늘로 일컬은 것[廣成子之謂天矣]과도 같은 표현이다. 忘朕邪의 朕은 1인칭 대명사, 邪는 의문의 助字.
- 역주17 猖狂 :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함. 곧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다. 林希逸은 “질탕함[軼蕩也].”으로 풀이했고, 林雲銘은 “방일한 모양[放佚貌].”, 陸樹芝는 “방탕해서 구속됨이 없음[放蕩無拘束也].”으로 풀이했는데 대동소이하다.
- 역주18 遊者鞅掌 以觀無妄 : 오로지 바삐 놀기만 하면서 만물의 거짓 없는 실상[眞實無妄]을 봄. 鞅掌은 바쁜 모양. 成玄英은 鞅掌을 “많은 모양[衆多].”으로 풀이했고, 林希逸은 “어지러운 모양[紛汨也].”으로 풀이했으며, 宣穎은 “어지러이 흔드는 모양[紛擾貌].”으로 풀이했다. 呂惠卿이 “鞅과 掌은 모두 얽매임이 있는 것을 말함이다[鞅也掌也 皆有所拘係之謂也].”라고 풀이했는데 이 견해를 따르면 遊者鞅掌은 노는 데에 얽매인 것이므로 사실상 무심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王敔는 “수고로움[勞也].”으로 풀이했고, 林雲銘은 “겉으로는 수고롭지만 마음은 편안함[外勞而心逸].”이라 풀이했다. 그런데 福永光司는 林希逸이나 宣穎 등에 의거하여 鞅掌을 容貌가 어지러운 모양 또는 형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遊者鞅掌 以觀無妄을 떠돌아다니는 漂泊者는 外形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만을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도 참고할 만하다.
- 역주19 民隨予所往 : 백성들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옴. 趙諫議본에는 予자가 子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 역주20 朕也 不得已於民 : 나도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음. 백성들의 請을 그만둘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뜻. 已는 여기서는 그만둘 이. 林希逸이 “사절하고자 하지만 되지 않음을 말한 것[言欲謝絶之而不可也].”이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 역주21 民之放也 : 백성들의 의지가 됨. 放은 依放의 뜻. 《經典釋文》에서 陸德明은 “본받음[效也].”이라 풀이했고, 郭象은 “백성들이 의지하고 본받는 바가 됨이다[爲民所放效].”라고 풀이했다. 王敔는 “放과 倣은 같다[放倣同].”라고 했고, 吳汝綸은 “의지함이다[依也].”라고 했는데 모두 비슷한 뜻이다. 《論語》 〈里仁〉편에 있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게 된다[放於利而行多怨].”라고 할 때는 放도 依의 뜻.
- 역주22 亂天之經 逆物之情 : 하늘의 常道를 어지럽히고 만물의 실정을 어김. 天이 天下로 된 판본이 있다(朱得之본, 林雲銘본 등). 林希逸은 “하늘의 경상과 만물의 실정은 모두 자연일 따름이다. 지금 이미 인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려 한다면 이는 자연을 어지럽히는 것이다[天之經常 物之情實 皆自然而已 今旣以有心爲之 則是亂迹其自然矣].”라고 풀이했다. 天之經은 《孝經》과 《春秋左氏傳》에도 보인다(福永光司, 赤塚忠).
- 역주23 玄天弗成 : 현묘한 자연이 이루어지지 않음. 成玄英은 “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다[自然之化不成也].”라고 풀이했고, 朱得之는 玄天을 “심원하고 끝이 없는 자연의 도[深遠無涯自然之道].”라고 풀이했는데 본문의 번역은 이들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한편 宣穎은 “일 년 중에 玄天이 있으니 冬至가 이에 해당하고 한 달 중에 玄天이 있으니 그믐이 이에 해당하고 하루 동안에 현천이 있으니 한밤중이 이에 해당하며 사람에게도 현천이 있다[歲有玄天 冬至是也 月有玄天 晦日是也 日有玄天 夜半是也 而人亦有玄天].”라고 풀이했다.
- 역주24 解獸之群 而鳥皆夜鳴 災及草木 禍及止蟲 : 짐승의 무리를 흩어서 새들이 모두 밤에 울고 재앙은 초목에까지 미치고 화는 벌레에까지 미침. 《經典釋文》에는 “昆蟲으로도 쓴다. 崔譔본에는 正蟲으로 되어 있다[亦作昆蟲 崔本作正蟲].”라고 풀이했다. 王敔는 “止자는 豸와 통한다[止豸通].”라고 했고 洪頤煊, 兪樾, 蘇輿, 吳汝綸, 阮毓崧 등도 같은 견해이다. 成玄英본에는 “昆은 밝다는 뜻이다[昆 明也].”라고 하여 昆蟲으로 쓰고 있다.
- 역주25 意(희) : 감탄사. 《經典釋文》에는 噫로 된 판본이 있다 했고, 현재도 噫로 된 판본이 있다(王叔岷). 馬叙倫은 誒의 假借라고 주장.
- 역주26 意 毒哉 : 아! 길러야 할 것이다. 阮毓崧은 意를 “내 뜻으로 헤아려 본다고 말한 것과 같다[猶言以吾意度之也].”라고 풀이했고 章炳麟, 朱得之 등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바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로 읽고 감탄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馬叙倫이 기뻐하다는 뜻인 歖의 假借라 했지만 취하지 않는다. 毒은 기르다는 뜻. 郭象과 陳壽昌은 深으로 풀이했고, 馬叙倫은 篤의 가차로, 呂惠卿은 ‘병을 치료하는 것[所以治疾也]’으로, 林雲銘은 ‘해침[害也]’으로, 姚鼐는 每字로, 阮毓崧은 安으로 풀이하지만 모두 부적당하다. 陸樹芝의 《莊子雪》에서는 “약을 써서 질병을 고친다[以藥治疾也].”라고 하고 있거니와, 여기서는 《老子》 제51장의 ‘亭之毒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르다[育]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 홍몽이 마음을 길러야 한다[心養]고 말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표현이다. 일단 이상과 같은 근거로 意 毒哉를 “아! 길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으나, 위에 든 諸說 가운데 馬叙倫의 毒을 篤의 가차로 보는 주석을 따라 “아! 〈당신의 정치병도 참〉 지독한 重症이로구나.”로 해석하는 說이 또한 유력하다. 福永光司, 池田知久, 安東林 등이 바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
- 역주27 僊僊乎歸矣 :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됨. 僊僊이 仙仙으로 된 판본이 있다(趙諫議본, 莊子口義本 등). 僊僊에 대해서는 제설이 분분하다. 郭象은 “앉았다 일어나는 모양[坐起之貌].”, 成玄英은 “가볍게 드는 모양[輕擧之貌].”으로 풀이했고, 林希逸은 “급히 떠나는 모양[急去之貌].”으로 풀이했고, 林雲銘은 바로 앞 장에 나온 “翦翦(말만 잘하는 천박한 모양)과 같다[猶翦翦也].”라고 했고, 姚鼐는 “이것은 운장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무란 뜻이다[此譏雲將有浮動之意].”라고 풀이했고, 赤塚忠은 遷의 假借, 阮毓崧은 “춤추는 모양[舞貌].”이라 했다. 여기서는 僊이 신선을 뜻하는 仙의 古字임을 중시하여 呂惠卿이 “선은 사람이 지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다[僊則人之遷去而天者也].”라고 풀이한 것을 따라 “하늘 위로 날아간다.”는 뜻으로 번역했다. 歸는 돌아간다는 뜻으로 池田知久의 지적처럼 〈逍遙遊〉편 제2장의 “그대는 돌아가 쉬시오[歸休乎君].”라고 할 때의 歸와 유사한 뜻이다. 앞의 注까지 합해서 번역하면 “아!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가 되는데, 여기서도 앞의 毒을 篤의 뜻으로 보아 “아! 〈당신의 정치병도〉 참 重症이로구나!”라고 해석하고 이어서 雲將(구름의 의인화)에게 “〈쓸데없는 욕심 버리고 얼른〉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 버리게.”라고 한 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역주28 天 : 雲將이 하늘처럼 높은 스승으로 존경한 鴻蒙을 말함.
- 역주29 心養 : 마음을 기름. 陸樹芝는 “심양은 심재와 같다[心養猶心齋也].”라고 풀이하고, “마음을 길러 至虛의 경지에 도달하면 사물이 저절로 감화될 것이다[能養心於至虛 物自化也].”라고 부연하고 있는데 心齋는 〈人間世〉편 제1장에 공자와 안연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로 이 편과 유사한 논의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이다.
- 역주30 徒處無爲而物自化 : 단지 무위에 머물기만 하면 만물이 저절로 감화됨. 《老子》 제2장에서 “성인은 무위의 일에 머문다[聖人處無爲之事].”라고 했고, 제57장에서는 “성인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된다[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사상과 유사하다.
- 역주31 墮爾形體 : 그대의 몸을 잊어버림. 이하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大宗師〉편 제7장, 《淮南子》 〈覽冥訓〉편, 《文子》 〈上禮〉편 등에 보인다(池田知久). 墮는 떨어트림[落], 버림[棄], 잊어버림.
- 역주32 吐爾聰明 : 그대의 총명을 버림. 吐는 버린다는 뜻이다. 陳壽昌은 “吐는 버림과 같다[吐猶棄也].”라고 풀이했는데 이 견해를 따랐다. 王引之는 吐를 咄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武延緖, 王叔岷 등이 이 견해에 동의했는데 陳壽昌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王叔岷의 견해에 따르면 咄은 黜 또는 絀과 같은 뜻이다. 이 밖에 林希逸은 “종전에 지니고 있던 허다한 총명을 모두 토해 버리고 붙들어 두지 마라[將從前許多聰明 皆吐去而莫留之].”라고 풀이했다(池田知久). 한편 池田知久에 의하면 兪樾은 “吐자는 마땅히 杜자가 되어야 한다[吐當作杜].”라고 하고 있는데, 聰明은 외부의 물건이나 재화가 아니라 몸에서 발휘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막는다[杜]고 풀이하는 것이 의미상 적절한 해석이지만 吐자를 그대로 두고도 의미가 통하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굳이 兪樾의 說을 따를 것까지는 없다.
- 역주33 倫與物忘 : 세상의 규범이나 외물을 잊어버림. 倫은 세상의 도리, 규범 따위를 말한다. 物은 外物. 倫은 郭象이 도리[理]라고 풀이하고 成玄英이 답습한 이래 거의 정설이 되었다. 朱得之가 “인륜에 의거함이다[依據人倫].”라고 풀이한 것도 대의는 郭象의 견해와 같다. 한편 林希逸은 “倫은 淪과 같고 淪은 빠진다는 뜻이다. 빠져 들어서 대상 사물과 서로를 잊어버리면 혼돈한 도와 완전히 같아질 것이다[倫與淪同 淪 沒也 泯沒而與物相忘 則與涬溟大同矣].”라고 풀이했는데 武延緖나 奚侗이 이 견해에 동의했다. 또 다른 견해로 林雲銘은 “倫은 類이다. 대상 사물과 서로를 잊어버리게 되면 분별하는 견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倫 類也 與物相忘 則不生分別之見].”라고 풀이했는데 池田知久도 지적하고 있듯이 羅勉道, 宣穎, 陸樹芝, 陳壽昌 등이 이와 유사하게 풀이했다. 池田知久는 “또한 이 외에 章炳麟은 《說文解字》에서 ‘侖은 생각함이다[侖 思也].’라고 풀이한 것을 따라 倫을 侖의 가차자로 보았고 馬叙倫이 이 견해에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朱得之를 따라 人倫의 뜻으로 보고 싶다.”고 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 역주34 大同乎涬溟 : 혼돈한 도와 완전히 같아짐. 涬溟은 도의 혼돈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經典釋文》에서 司馬彪는 “자연의 기[自然氣也].”라 했고 成玄英도 이 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또 呂惠卿은 “기가 비어서 사물을 기다리는 것[氣之虛而待物者也].”이라 풀이했고, 宣穎은 “커다란 기[浩氣].”라 했고, 陸樹芝는 “혼융한 자연의 기[渾融自然之氣也].”라 했으며, 陳壽昌은 “원기가 혼연하여 몸체도 조짐도 없다[元氣渾然 無朕無兆].”라고 했는데 대체로 기를 지칭한 것으로 본 견해이다. 池田知久는 《淮南子》 〈覽冥訓〉편에 “대도는 混冥하다[大道混冥].”라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여기의 涬溟을 混冥과 같다고 보았는데 이 견해를 따른다. 물론 池田知久 이전에 陳景元이 “혼연한 모양[渾然貌].”이라 했고, 林希逸이 “모습도 없고 조짐도 없어 기가 아직 있지 않은 처음[無形無朕 未有氣之始也].”이라 풀이했고, 林雲銘이 “모두 기가 없었던 처음으로 돌아감이니 무극보다 먼저이다[總歸於無氣之始 無極之先也].”라고 풀이했는데 모두 涬溟을 도의 모습으로 풀이한 것이다.
- 역주35 解心釋神 莫然無魂 :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놓아서 고요히 혼도 없는 경지에 이름. 《淮南子》에는 “解意釋神 漠然若無魂魄”으로 되어 있다. 成玄英은 莫然을 “알지 못함[無知].”, 林希逸은 “안정됨[定也].”, 王敔는 “없는 모양[無貌].”, 陳壽昌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모양[坐忘之貌].”으로 풀이하였는데 ‘고요한 모습’, ‘고요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역주36 萬物云云 各復其根 : 만물이 성대하게 자라나고 각기 근본으로 돌아감. 王敔와 蘇輿는 云云을 “자연스런 모양[自然貌].”이라 했는데 이것은 池田知久가 不適當하다고 지적했듯이 옳지 않다. 成玄英이 “많음[衆多也].”으로 풀이한 것이 무난하며, 呂惠卿이 “사물이 바야흐로 일어나는 때이다[物之方興之時也].”라고 풀이한 것과, 陳壽昌이 “성대한 모양[盛貌].”이라고 풀이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 赤塚忠은 “萬物의 生氣가 솟아 일어나는 모양.”이라고 풀이했다. 《老子》 제16장에 “만물이 성대하게 자라나 각각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夫萬物云云 各復歸於其根].”라고 한 부분과 거의 같다.
- 역주37 不知 : 알지 못함. 林雲銘이 “또한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함이다[亦不知誰爲之者].”라고 풀이했고, 陸樹芝도 비슷하게 풀이했는데 이는 池田知久의 지적처럼 옳지 않다. 스스로 道로 돌아가는 道에의 復歸運動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意識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시 池田知久의 지적처럼 〈齊物論〉편 제1장의 ‘已而不知其然謂之道’를 답습한 것이다.
- 역주38 渾渾沌沌 : 혼돈의 도와 일체가 됨. 渾沌에 대해서는 〈應帝王〉편 제7장을 참조할 것.
- 역주39 若彼知之 乃是離之 : 만약 저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곧 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林希逸의 ‘纔有知覺, 則與道爲二’로 可함. 褚伯秀, 陸樹芝도 거의 같음. 〈齊物論〉편 제1장의 ‘唯其好之也 以異於彼其好之也 欲以明之 彼非所明而明之’를 承襲하고 있다(池田知久).
- 역주40 無問其名 無闚其情 物固自生 : 이름을 묻지 말고 실정을 엿보려 하지 마라. 그러면 만물은 저절로 생육될 것이다. 林希逸이 “묻지도 않고 엿보지도 않게 되면 분별함이 없게 되어 좋아하고 싫어함도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위자연이다. 내가 무위자연을 실천하면 모든 대상 사물이 각기 자신의 삶을 이루게 되니 이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無問無窺 則無所分別 無所好惡矣 此則無爲自然也 我能無爲自然 則物物各遂其生 是其固然者也].”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林雲銘과 宣穎도 비슷한 견해. 成玄英은 두 차례 나오는 其를 道로 해석했는데 맥락상 적절치 않다. 道로 보지 말고 만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池田知久는 道에 대해서가 아니고 萬物에 대해서의 無知를 提唱하는 것을 齊物論 哲學의 原初의 모습이 殘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역주41 天降朕以德 : 하늘이신 선생께서 덕을 내려 줌. 하늘은 鴻蒙을 지칭하고 朕은 雲將 자신을 일컬음. 降은 林希逸이 “‘나에게 하사하셨다.’고 말한 것과 같다[猶言賜我也].”라고 풀이했고 馬叙倫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 역주42 示朕以黙 : 말하지 않는 도를 보여 줌. 黙은 말하지 않음. 林希逸은 “말하지 않음이다[不言也].”라고 풀이했다. 馬叙倫은 法 또는 謐의 가차자라 했는데 謐로 보는 것은 林希逸과 같은 견해이다.
- 역주43 躬身求之 乃今也得 : 몸소 이 도를 찾았는데 이제 비로소 얻음. 求之의 之는 道를 지시하는 대명사. 成玄英은 “몸을 움직인 이래로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았다[立身以來 方今始悟].”라고 풀이했다. 林希逸은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보니 이미 이 도를 얻음이다. 躬은 스스로 함이니 스스로 내 몸에서 찾았더니 비로소 얻으려 한 것을 얻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反身而求之 已得此道 躬 親也 自也 言自於吾身求之 乃得其所得矣].”라고 했고, 羅勉道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한편 武延緖와 馬叙倫은 躬을 終 또는 窮의 假借라 하고 있다(池田知久).
- 장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