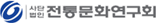장자(2)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장자(1)
- 여닫기 장자(2)
- 여닫기 장자(3)
- 여닫기 장자(4)
하얏거늘
하니라
태초에는 무無만 있었고 존재하는 것[有]이란 아무 것도 없었고 이름조차 없었다.
일一(未分化의 일一)이 여기서 생겨나 일一은 있었으나 아직 형체形體는 없었다.
이윽고 만물이 이 일一을 얻어서 생겨났는데 이것을 덕德이라 한다.
아직 형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는 큰〉 틈바구니는 없는 것, 이것을 명命(分化의 필연성必然性)이라 한다.
움직여서 만물을 낳는데 물物이 이루어져 결[理]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형形(형체)이라 한다.
이 형체形體(육체)가 정신을 보유해서 각각 고유한 법칙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性이라 한다.
성이 닦여져 덕德으로 돌아가면 덕이 처음과 같아짐에 이르게 될 것이니 같아지면 모든 것이 비게 되고, 비면 곧 대大가 될 것이니 새처럼 지저귀던 부리를 닫고 침묵할 것이다.
부리를 닫고 침묵하게 되면 천지와 합하여, 완전하게 합일이 이루어지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고 어두운 사람 같으리니 이를 일러 현덕玄德이라 한다.
위대한 순응에 동화하는 것이다.
- 역주
- 역주1 泰初有無 無有無名 : 태초에는 無만 있었고 有도 없고 이름도 없었음. “원초에는 無가 있었다. 그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존재이었다.”라고 福永光司는 流麗하게 번역하고 있다. 郭象은 “有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 붙일 것도 없었다[无有 故无所名].”라고 풀이했고, 成玄英은 “태초의 시대에는 오직 이 无만 있었고 有가 아직 있지 않았다. 有가 이미 있지 않았으니 이름이 어디에 붙겠는가. 그 때문에 有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太初之時 惟有此无 未有於有 有旣未有 名將安寄 故无有無名].”라고 풀이했다. 태초에 대해서는 異說이 분분하지만 林希逸이 “조화의 시작[造化之始也].”이라고 풀이한 것이 무난하다. 林雲銘, 陸樹芝도 마찬가지. 이 章은 태초의 虛無로부터 分化하여 物이 生成됨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장이다.
- 역주2 一之所起 有一而未形 : 여기서 一이 생겨나 一은 있었으나 아직 形體는 없었음. 一은 大道 곧 無를 지칭한다. 一에 대해서도 이설이 분분하지만 林希逸이 “여기의 一자는 바로 无자이다[此一字 便是无字].”라고 풀이한 것이 간명하다. 池田知久도 같은 견해. 《老子》 제42장의 “道生一”을 참조할 것.
- 역주3 物得以生 謂之德 : 만물이 이 一을 얻어서 생겨났는데 이것을 德이라 일컬음. 곧 德은 만물에 本來的으로 갖추어진 것을 뜻한다. 成玄英은 “德이란 얻음이니 이것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德者 得也 謂得此也].”라고 풀이했고, 劉鳳苞는 “만물은 모두 一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치이니 무로써 유를 머금은 것이다. 만물은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一을 얻어서 생성된다[萬物皆生于一 此箇未形之理 以无涵有 物得此未形之一以生].”라고 풀이했다.
- 역주4 未形者 有分 且然無閒 謂之命 : 아직 형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는 큰〉 틈바구니는 없는 것, 이것을 命(分化의 必然性)이라 한다. 且然無閒은 異說이 많은 難解한 글. 安東林은 錢穆, 奚侗, 金谷治 등의 說을 참조하여 “아직 형체는 없지만 〈내부에서〉 구분이 생겨 차례로 만물에 깃들면서 조금도 틈이 없다. 이것을 運命이라 한다.”로 번역하였으나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無閒을 渾然, 有分을 粲然으로 보는 林希逸의 주석을 택하고 無閒의 閒을 큰 틈바구니, 커다란 閒隙으로 이해하는 池田知久의 주석을 따라서 번역하였다. 林希逸의 주는 다음과 같다. “아직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一이 일어날 때를 말한다. 구분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큰 틈바구니가 보이지 않아〉 구분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且然無閒(또한 그러나 간격이 없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간격이 없는 것은 바로 혼연한 것이고 구분이 있는 것은 바로 찬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의 命자는 바로 天命謂性의 命과 같다[未形者 言一所起之時也 若有分矣 而又分他不得 故曰且然无閒 无間 便是渾然者 有分 便是粲然者 此命字 卽天命謂性之命].” 이처럼 林希逸은 여기의 命자를 《中庸》 제1장의 天命之謂性의 命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였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 역주5 留動而生物 物成生理 謂之形 : 움직여서 만물을 낳는데 物이 이루어져 결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形이라 함. 留動의 留에 대해서는 머물다의 뜻으로 보는 견해와 流의 가차로 보는 견해가 있다. 成玄英은 留를 머물다의 뜻으로 보고 留動을 動靜과 같은 의미로 보았지만, 陸德明이 流로 된 판본이 있다고 했고 또 맥락상 流動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武延緖, 奚侗, 阮毓崧, 馬叙倫 등의 학자들은 流의 뜻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留動而生物은 앞의 一이 流行하여서 만물을 생성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物成生理에 대한 견해 또한 분분하지만 《韓非子》 〈解老〉편에서 “理는 사물을 이루는 文理이고 道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근거이다[理者成物之文也 道者萬物之所以成也].”라고 한 언표를 따라 사물을 이루는 결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赤塚忠은 여기의 ‘理’는 宋代의 학자가 제창한 보편적 진리는 아니고, 개개의 사물이 성립하고 있는 구체적 진실이라고 해설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6 形體保神 各有儀則 謂之性 : 이 形體가 정신을 보유해서 〈육체와 정신의 營爲에〉 각각 고유한 법칙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性이라 함. 林希逸은 “이 한 구절은 바로 《詩經》에서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고 한 것과 같고, 《春秋左氏傳》에서 이른바 ‘백성들은 천지의 中을 얻어서 태어나 동작과 몸가짐에 법칙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形體는 氣이고 氣 속에 神이 있다. 이른바 의칙은 모두 이 神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 바로 성 속에 스스로 인의예지의 뜻이 있다는 말이다[此一句 便是詩有物有則 便是左傳所謂民受天地之中以生 有動作威儀之則也 形體 氣也 氣中有神 所謂儀則 皆此神爲之 便是性中自有仁義禮智之意].”라고 풀이했다. 한편 福永光司는 “만물은 제각기 ‘形’을 가지고 있는데, 이 形을 움직이는 것이 ‘神’ 즉 精神, 마음이다. ‘形’이 道에 의해서 생겨나듯이 ‘神’도 또한 道에 근본한다. 形은 神을 머무르게 하는 도구이고, 形이 神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形神 각각의 일에 自然의 법칙이 갖춰지고 있는 상태를 ‘性’이라고 한다.”고 풀이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7 性脩反德 德至同於初 : 성이 닦여져 德으로 돌아가면 덕이 처음과 같아짐에 이르게 될 것임. 反은 返과 같다. 林希逸이 “덕이 이미 지극하고 극진해지고 나면 사물이 없었던 처음과 같아질 것이니……至는 지극함이다[德旣至矣盡矣 則與無物之初同矣……至 極至也].”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며, 또한 그것이 定說이다(池田知久). 初는 맨 처음의 太初(成玄英). 《老子》 제28장을 참조할 것(赤塚忠).
- 역주8 同乃虛 虛乃大 : 같아지면 모든 것이 비게 되고, 비면 곧 大가 될 것임. 呂惠卿이 “같아지면 비게 된다는 것은 그 빔이 ‘처음에 아직 사물이 있기 이전의 단계’에 도달함이고 비면 곧 大가 된다는 것은 그 관대함이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지’에 도달함이다[同乃虛 則其虛至於未始有物也 虛乃大 則其大至於不同同之也].”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褚伯秀는 虛가 위 문장의 無를 받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大는 《老子》 제25장의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字(통칭)를 붙여서 말하면 道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면 大라 한다[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强爲之名曰大].”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 역주9 合喙鳴 : 새처럼 지저귀던 부리를 닫고 침묵할 것이다. 合은 赤塚忠이 닫는다는 뜻인 ‘闔’의 가차자로 본 것이 적절하다. 喙는 成玄英이 새의 부리[鳥口]라고 풀이한 것을 따른다. 한편 福永光司는 “‘合喙鳴’은 마치 새가 부리로 無心의 말을 재잘거리는 것처럼 조금의 邪心도 없이 自由自在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의 無心한 지저귐처럼 얽매이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 천지우주의 조화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풀이하였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10 與天地爲合 其合緡緡 : 천지와 합하여 합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緡은 보이지 않음. 其合緡緡은 합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 〈在宥〉편 제3장의 “나는 해와 달과 함께 빛나고 천지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어지러워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나만 홀로 남을 것입니다[吾與日月參光 吾與天地爲常 當我緡乎遠我昏乎 人其盡死 而我獨存乎].”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 ‘緡’자의 활용 예가 이미 나왔다. 林希逸은 “泯泯과 같다[猶泯泯也].”라고 풀이했고 王敔와 宣穎, 馬叙倫 등도 비슷한 견해이다. 赤塚忠은 ‘緡緡’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一體가 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 역주11 若愚若昏 :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고 어두운 사람 같음. 若愚若昏은 〈齊物論〉 제4장에서 “성인은 우둔하다[聖人愚芚]”라고 한 것과 《老子》 제20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밝은데 나만 홀로 어둡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만 홀로 어리석다[俗人昭昭 我獨昏昏 俗人察察 我獨悶悶].”라고 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 역주12 是謂玄德 : 이를 일러 현덕이라 함. 玄德은 깊은 덕. 玄德은 《老子》 제10장에 “만물을 낳아서 기르니 낳아 주지만 차지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만 뽐내지 아니하고 길러 주지만 주재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玄德이라 한다[生之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라고 했고, 《書經》 〈舜典〉에도 “〈舜의〉 깊은 덕이 위로 올라가 요임금에게 보고되어 마침내 〈堯가〉 임금의 자리로 명령하였다[玄德升聞 乃命以位].”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 역주13 同乎大順 : 위대한 순응에 동화함. 저절로 자연의 道에 順應하여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林希逸은 “대순은 태초의 자연의 이치이다[大順 則泰初自然之理也].”라고 풀이했는데 적절한 견해이다. 羅勉道는 “한 사람의 백성도 한 가지 물건도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無一民一物不順也].”라고 풀이했는데 다소 과장이 보태진 견해이다. 池田知久는 이 羅勉道의 해석을 成玄英 疏에서 由來한 해석으로 보면서 부적당하다고 하고 있다. 赤塚忠은 道의 자연적 展開와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했다.
- 장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