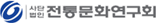안씨가훈(1)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안씨가훈(1)
- 여닫기 제1편 서치
- 여닫기 제2편 교자
- 여닫기 제3편 형제
- 여닫기 제4편 후취
- 여닫기 제5편 치가
-
여닫기
제6편 풍조
- 여기서 ‘예의범절’…
- 1. 사대부의 예의범절
- 2. 상식에 어긋난 지나친 피휘
- 3. 아첨에 가까운 잘못된 피휘
- 4. 지나친 피휘는 웃음거리
- 5. 피해야 할 이름자
- 6. 자식의 이름은 후손의 입장에서
- 7. 경박한 이름 짓기
- 8. 상스러운 호칭
- 9. 재치 있는 비유
- 10. 자기 친족의 호칭 - ‘가’
- 11. 상대 친족의 호칭 - ‘존’과 ‘현’
- 12. 남북 풍속의 차이
- 13. 자신에 대한 호칭
- 14. 고인이 된 친족을 언급할 때
- 15. 죽은 형제 자식들의 호칭
- 16. 이별의 눈물
- 17. 친족의 호칭은 분명하게
- 18. 일족의 호칭
- 19. 부모의 내외 친척 자매의 호칭
- 20. 조공이란 호칭
- 21. 이름과 자
- 22. 초상에서 곡하는 법
- 23. 조문 예절
- 24. 신일의 미신
- 25. 귀살의 미신
- 26. 한쪽 부모를 여읜 후 맞이하는 명절
- 27. 탈상 후 자손의 모습
- 28. 부모 여읜 자식의 마음
- 29. 부모님의 유품
- 30.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
- 31. 부모님의 기일엔
- 32. 기일 외에 추모하는 날
- 33. 동음이자는 피휘하지 않는다
- 34. 실수하기 쉬운 표현
- 35. 생일 풍속
- 36. 괴로울 때 외치는 소리
- 37. 탄핵된 사람들의 자손
- 38. 집안 어른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으면
- 39. 의형제 맺기
- 40. 손님을 맞이할 때
- 여닫기 제7편 모현
-
여닫기
제8편 면학
- 학문과 그것을 위한…
- 1.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이유
- 2. 학문 없는 귀족의 몰락
- 3. 독서만이 활로이다
- 4. 학문의 가치
- 5. 옛사람의 지혜
- 6. 학문의 의의는 실천
- 7. 배움에는 겸허해야
- 8. 배움의 목적
- 9. 늙어서도 학문에 힘써야
- 10. 학문의 실용성
- 11. 편협한 유학자들
- 12. 노장학자들의 모순
- 13. 무지로 인한 잘못된 효도 - 효소제
- 14. 양 원제의 면학
- 15. 옛사람들의 면학
- 16. 면학했던 환관의 순절
- 17. 자식의 진정한 도리
- 18. 고루한 학자들
- 19. 귀동냥한 학문의 오류
- 20. 문자학의 중요성
- 21. 잘못된 문자 사용
- 22. 지명 고증 - 엽려와 항구
- 23. 문자 고증 - 회
- 24. 지명의 유래 - 백
- 25. 어휘 고증 - 물물
- 26. 방언 고증 - 두핍
- 27. 갈새의 진위
- 28. 무지가 빚은 오류
- 29. 음운 지식 - 령
- 30. 교정의 어려움
-
여닫기
제9편 문장
- 여기서의 ‘문장’…
- 1. 문학의 근원과 경박한 문인들
- 2. 타고나는 글재주
- 3. 글을 발표하기 전에
- 4. 문인의 처세
- 5. 가당찮은 양웅
- 6. 겨울나무에 봄꽃
- 7. 문장은 절제가 있어야
- 8. 본말이 뒤바뀐 시속의 문장
- 9. 고금 문장의 장점을 다 살려야
- 10. 안씨 집안의 문풍
- 11. 문장삼역론
- 12. 형소와 위수, 그리고 심약와 임방
- 13. 글 쓸 때 조심해야 할 사항
- 14. 문장 비평에 대한 남북의 태도 차이
- 15. 대필의 문제
- 16. 만가의 형식
- 17. 내용의 일관성 - 찬미와 풍자
- 18. 용사 오류의 사례들
- 19. 문장 중의 지리
- 20. 강남의 문학(1) - 왕적의 시
- 21. 강남의 문학(2) - 소각의 시
- 22. 강남의 문학(3) - 하손, 하사징, 하자랑
- 여닫기 제10편 명실
- 顔之推 年譜
- 顔之推 家系圖
-
여닫기
안씨가훈(2)
- 여닫기 제11편 涉務 실무 능력
- 여닫기 제12편 省事 일을 줄여 집중하기
- 여닫기 제13편 止足 安分知足
- 여닫기 제14편 誡兵 兵事에 대한 훈계
- 여닫기 제15편 養生 養生의 원칙
-
여닫기
제16편 歸心 佛敎에의 귀의
- 본편은 불교도의 입장에서…
- 1. 佛敎信仰의 권유
- 2. 佛敎의 본질
- 3. 佛敎에 대한 다섯 가지 비난
- 4. 허황하다는 비난에 대한 해명1
- 5. 허황하다는 비난에 대한 해명2
- 6. 부처님의 신통한 感應力
- 7. 因果應報에 대한 해명
- 8. 승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해명
- 9. 國力을 소모한다는 비난에 대한 해명
- 10. 來世의 존재에 대한 해명
- 11. 殺生을 멀리하라
- 12. 머리카락 속 병아리들의 怨聲
- 13. 드렁허리 머리로 태어난 아이
- 14. 죽은 羊의 복수
- 15. 죽은 소의 앙갚음1
- 16. 손목 잘린 자들의 저주
- 17. 죽은 소의 앙갚음2
- 18. 죽은 물고기의 逆襲
- 19. 며느리 구박하는 시부모
-
여닫기
제17편 書證 古典考證
- 본편은 역대의 古典에서
- 1. 《詩經》의 ‘荇菜’
- 2. 《詩經》의 ‘荼’
- 3. 《詩經》의 ‘杕’
- 4. 《詩經》의 ‘牡’
- 5. 《禮記》 〈月令〉의 ‘荔挺’
- 6. 《詩經》의 ‘施施’
- 7. 《詩經》의 ‘祁祁’
- 8. 《禮記》의 ‘猶豫’
- 9. 《春秋左氏傳》의 ‘痎’
- 10. 《尙書》의 ‘影’
- 11. 《六韜》의 ‘陳’
- 12. 《詩經》의 ‘灌木’
- 13. ‘也’자
- 14. ‘蜀才’
- 15. 《禮記》 〈王制〉 注의 ‘㩊’
- 16. 《漢書》의 ‘肎’
- 17. 《漢書》의 〈王莽贊〉
- 18. ‘策’자
- 19. ‘虙’자
- 20. 《史記》의 ‘雞口’와 ‘牛後’
- 21. 《風俗通》의 ‘伎癢’
- 22. 《史記》의 ‘媚’
- 23. 《史記》 〈始皇本紀〉의 ‘隗林’
- 24. 《漢書》 〈司馬相如傳〉의 ‘禔’
- 25. 《漢書注》의 ‘禁中’과 ‘省中’
- 26. 《後漢書》 〈明帝紀〉의 ‘小侯’
- 27. 《後漢書》 〈楊震傳〉의 ‘鱓’과 ‘鱣’
- 28. 《後漢書》 〈酷吏列傳〉의 ‘穴’
- 29. 《後漢書》 〈楊由傳〉의 ‘削柿’
- 30. 《三輔決錄》의 ‘果’
- 31. 《三國志》 〈魏志〉의 ‘攰’
- 32. 《晉中興書》의 ‘濌’
- 33. 《古樂府》의 ‘三婦’와 ‘丈人’
- 34. 《古樂府》의 ‘吹’와 ‘扊扅’
- 35. 《通俗文》의 저자
- 36. 古典에 삽입된 후대의 사실
- 37. 《東宮舊事》의 ‘祠尾’
- 38. 《東宮舊事》의 ‘六色罽䋿’
- 39. 巏嵍山
- 40. 五更의 의미와 유래
- 41. 《爾雅》의 ‘朮’과 ‘山薊’
- 42. 傀儡戱를 郭禿이라 하는 이유
- 43. 治獄參軍을 長流라 하는 이유
- 44. 《說文解字》의 가치
- 45. 俗字의 사례들
- 46. 破字의 사례들
- 47. 《漢書》 〈賈誼傳〉의 ‘日中必熭’
- 여닫기 제18편 音辭 音韻
- 여닫기 제19편 雜藝 여러 가지 技藝
- 여닫기 제20편 終制 葬禮에 대한 당부
- 여닫기 附錄
16. 이별의 눈물
別易會難, 古人所重。
강남江南餞送, 。
有, 양梁 무제武帝弟,
坐此被責, 飄颻舟渚, 一百許日, 卒不得去。
北間風俗, 不屑此事, 岐路言離, 歡笑。
然人性自有少涕淚者, 腸雖欲絶, 目猶。
16. 이별의 눈물
이별은 쉽지만 만남은 어려워 옛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짐을〉 소중히 여겼다.
강남江南에서는 전송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한다.
후侯에 봉해진 왕자가 있었는데 양梁 무제武帝의 동생이었다.
동쪽 군郡의 태수로 나가게 되어 무제武帝와 작별을 하는데, 무제武帝는 “내가 이미 연로하여 너와 헤어지게 되니 몹시 슬프도다.”라고 하면서 몇 줄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후侯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끝내 나오지 않아 얼굴만 붉히고 나왔다.
이 일로 문책을 받아 배를 대놓은 채 100일이 넘도록 지체하다가 끝내 떠나지 못하였다.
북방北方의 풍속에는 이런 일을 대단치 않게 여기며, 갈림길에서 ‘안녕’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헤어진다.
그런데 사람들 중엔 본래부터 눈물이 적은 이가 있어서, 애간장은 비록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눈은 오히려 반짝거린다.
이런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무조건 다그칠 수는 없다.
- 역주
-
역주1
下泣言離 :
《南史》 〈張邵傳〉에서 “張敷는 말투를 잘 조절했는데, 한없이 자상하고 느린 말투로 남과 헤어질 때 손을 잡고서 ‘소식 듣기를 바라네.’라고 말하면, 그 餘響이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았다. 張氏의 후진들이 모두 그를 흠모하여 따랐는데, 그 기원이 張敷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다.[劉盼遂]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고하다.[역자] -
역주2
王子侯 :
《漢書》 〈王子侯表〉에서 “孝武帝 때에 이르러 여러 侯王들의 강토는 규제를 넘어서고 때로는 법도를 어기면서도, 그 子弟들은 匹夫가 되어 輕重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에 御史에게 詔書로 명하기를 ‘여러 侯王들 중 혹 개인적으로 子弟들에게 封邑을 나누어주고 싶은 이들은 각기 항목을 올리게 하라. 짐이 장차 직접 그 名號을 정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남 이외의 아들들이 모두 侯가 되었다.”라 하였다.[王利器]
侯에 봉해진 王子, 즉 왕실 출신의 제후를 말한다.[역자] - 역주3 東郡 : 여기서는 수도 建康 동쪽에 있는 吳郡, 會稽 등의 고을들을 가리킨다. 秦‧漢 때의 東郡은 당시 梁의 영역 밖이었다.[錢大昕]
- 역주4 分張 : 分別[헤어지다]과 같은 뜻으로 六朝人들이 잘 쓰던 표현이다. 庾信의 〈傷心賦〉에 “兄弟는 五郡에서 헤어지고, 父子는 三州에서 離散했다.[兄弟則五郡分張 父子則三州離散]”라 했는데, 여기서 ‘分張’이 ‘離散’과 對偶를 이루며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王利器]
-
역주5
密雲 :
《周易》 小畜卦의 彖辭에 “된 구름에 비는 오지 않는다.[密雲不雨]”라는 표현이 나온다. 《藝文類聚》 29와 《太平御覽》 489에 인용된 《語林》에 “어떤 사람이 謝公을 찾아왔다가 헤어지게 되자 謝公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사람은 끝내 슬픔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측근들이 말하기를 ‘좀 전의 손님은 별나게도 된 구름입디다.’라고 하자, 謝公은 ‘된 구름일 뿐만 아니라, 마른천둥이더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陸繼輅의 《合肥學舍札記》 3에서 “密雲은 아마 당시의 비속어로서, 울지 않는 것을 희롱하여 말한 것이다.”라 하였다.[王利器]
‘密雲不雨’의 줄임말로 구름만 짙게 끼고 비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별의 자리에서 눈물이 날듯하면서도 끝내 나지 않음을 희화화한 표현이다.[역자] - 역주6 赧(난)然 : 《說文解字》에서 “赧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라 하였다.[盧文弨]
- 역주7 赧 : 난
- 역주8 分首 : ‘首’자와 ‘手’자는 고대에 同音으로 통용되었다. 《儀禮》 〈大射儀〉에 나오는 ‘後首’에 대한 鄭玄의 注에서 “古文에서 ‘後首’는 ‘後手’이다.”라고 한 것, 또 〈士喪禮〉에 대한 鄭玄의 注에서 “고문에 나오는 ‘首’는 ‘手’이다.”라고 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楚辭》 〈九歌 河伯〉에 대한 朱熹의 集注에서 “交手란 古人들이 이별을 앞두고 서로 손을 잡고서 차마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晉‧宋 간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였다.[王利器]
- 역주9 爛然 : 《世說新語》 〈容止〉篇에 “裴楷가 지적하기를 ‘王戎의 눈은 마치 바위 아래에 치는 번개처럼 번쩍거린다.[爛爛]’고 했다.”라고 한 표현이 나온다. 《續談助》 4에 인용된 《小說》에서는 “王夷甫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양 눈동자가 번쩍거리는 것[雙眸爛爛]이 마치 바위 아래에 번개가 치는 것과 같소.’라고 했다.”라 하였다. 《詩經》 〈鄭風 女曰雞鳴〉의 “샛별이 반짝인다.[明星有爛]”에 대한 鄭玄의 箋에서 “샛별이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다.[明星尙爛爛然]”라고 풀이하였다.[王利器]
- 역주10 如此之人 不可强責 : 《孔叢子》 〈儒服〉篇에서 “子高가 趙나라에 갔더니 鄒文과 季節이라는 자가 있어, 子高와 친구가 되어 가깝게 지냈다. 子高가 魯나라로 돌아오게 되어 그들이 전송을 하였다. 추문과 계절은 3일 밤을 함께 묵고 이별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목을 비볐지만, 子高는 다만 손만 들어주었을 뿐이었다. 그의 일행이 묻기를 ‘이게 바로 친한 이를 친하게 대한다는 말 아니겠소?’라고 하자, 子高가 말하기를 ‘처음에 나는 이들을 대장부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아녀자입디다. 사람이 태어나면 四方에 뜻을 갖게 마련인데, 어찌 사슴이나 돼지와 같겠소? 어떻게 늘 함께 지낼 수가 있겠소?’라고 했다.”라 하였다. 子高의 말이 친구 사이에서는 괜찮겠지만, 그것으로 天倫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盧文弨]
-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