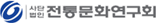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
여닫기
통감절요(1)
- 序(江鎔)
- 序(劉應康)
- 資治通鑑總要通論(瀋榮)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一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二
- 여닫기 周紀
- 여닫기 秦紀
-
여닫기
後秦紀
-
여닫기
始皇帝
- 名政이요 實姓은 呂氏니 卽王位二十五年이요
- [丁巳]秦王政三, 楚十九, 燕十一, 魏三十三, 趙悼襄王偃元, 韓二十九, 齊二十一年
- [庚申]秦六, 楚二十二, 燕十四, 魏二, 趙四, 韓三十二, 齊二十四年
- [甲子]秦十, 楚幽王悍元, 燕十八, 魏六, 趙八, 韓二, 齊二十八年
- [戊辰]秦十四, 楚五, 燕二十二, 魏十, 趙三, 韓六, 齊三十二年
- [己巳]秦十五, 楚六, 燕二十三, 魏十一, 趙四, 韓七, 齊三十三年
- [辛未]秦十七, 楚八, 燕二十五, 魏十三, 趙六, 韓九, 齊三十五年
- [癸酉]秦十九, 楚十, 燕二十七, 魏十五, 趙八, 齊三十七年
- [甲戌]秦二十, 楚王負芻元, 燕二十八, 魏王假元, 齊三十八年
- [丙子]秦二十二, 楚三, 燕三十, 魏三, 齊四十, 代三年
- [戊寅]秦二十四, 楚五, 燕三十二, 齊四十二, 代五年
- [己卯]秦二十五, 燕三十三, 齊四十三, 代六年
-
여닫기
始皇帝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四
- 故事成語․熟語
- 周王室世系圖
- 漢王室世系圖
- 戰國時期圖
- 秦時期圖
- 西漢時期圖
- 歷代帝王傳授總圖
- 여닫기 통감절요(2)
- 여닫기 통감절요(3)
- 여닫기 통감절요(4)
- 여닫기 통감절요(5)
-
여닫기
통감절요(6)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一
-
여닫기
南北朝
- 按南北二朝 不能混一하니
-
여닫기
宋紀
- 여닫기 高祖武帝
- 여닫기 營陽王
-
여닫기
太祖文帝
- 名義隆이니 高祖第三子라
- [甲子]宋景平二, 太祖文帝元嘉元年, 魏世祖太武帝燾始光元年
- [乙丑]宋元嘉二年, 魏始光二年, 夏主赫連昌承光元年
- [丙寅]宋元嘉三年, 魏始光三年
- [丁卯]宋元嘉四年, 魏始光四年
- [庚午]宋元嘉七年, 魏神䴥三年
- [辛未]宋元嘉八年, 魏神䴥 四年
- [癸酉]宋元嘉十年, 魏延和二年
- [丙子]宋元嘉十三年, 魏太延二年
- [戊寅]宋元嘉十五年, 魏太延四年
- [己卯]宋元嘉十六年, 魏太延五年
- [丙戌]宋元嘉二十三年, 魏太平眞君七年
- [己丑]宋元嘉二十六年, 魏太平眞君十年
- [辛卯]宋元嘉二十八年, 魏太平眞君十二年
- [壬辰]宋元嘉二十九年, 魏高宗文成帝濬興安元年
- [癸巳]宋元嘉三十年, 魏興安二年
- 여닫기 世祖孝武帝
- 여닫기 太宗明帝
- 여닫기 蒼梧王
- 여닫기 順帝
- 여닫기 齊紀
-
여닫기
南北朝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二
-
여닫기
南北朝
-
여닫기
梁紀
-
여닫기
高祖武帝
- 名衍이요 姓蕭니
- [壬午]齊中興二年, 梁高祖天監元年
- [甲申]梁天監三年, 魏正始元年
- [丙戌]梁天監五年, 魏正始三年
- [己丑]梁天監八年, 魏永平二年
- [乙未]梁天監十四年, 魏延昌四年
- [丁酉]梁天監十六年, 魏肅宗孝明帝詡熙平二年
- [己亥]梁天監十八年, 魏神龜二年
- [丙午]梁普通七年, 魏孝昌二年
- [戊申]梁大通二年, 魏孝昌四
- [己酉]梁中大通元年, 魏永安二年
- [庚戌]梁中大通二年, 魏永安三年
- [辛亥]梁中大通三年, 魏節閔帝恭普泰元
- [壬子]梁中大通四年, 魏普泰二, 中興二, 孝武帝脩永熙元年
- [癸丑]梁中大通五年, 魏永熙二年
- [甲寅]梁中大通六年, 魏永熙三年, 東魏孝靜帝善見天平元年
- [乙卯]梁大同元年, 魏文帝寶炬大統元年
- [乙丑]梁大同十一年, 魏大統十一年
- [丙寅]梁中大同元年, 魏大統十二年
- [丁卯]梁太淸元年, 魏大統十三年
- [戊辰]梁太淸二年, 魏大統十四年
- [己巳]梁太淸三年, 魏大統十五年
- 여닫기 太宗簡文帝
- 여닫기 敬帝
-
여닫기
高祖武帝
-
여닫기
梁紀
-
여닫기
南北朝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三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四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五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六
- 故事成語․熟語
- 五胡十六國王室 世系圖
- 隋王室 世系圖
- 唐王室 世系圖
- 北魏 南齊 對立時期圖
- 隋時期圖
- 唐時期圖
-
여닫기
通鑑節要 卷之三十一
- 여닫기 통감절요(7)
- 여닫기 통감절요(8)
- 여닫기 통감절요(9)
[辛亥]二十七年이라
北匈奴遣使詣武威하야 求和親이어늘 帝召公卿하야 廷議호되 不決이러니
皇太子言曰 南單于新附而反하야 交通北虜하니 臣은 恐南單于將有二心일까하노이다
帝然之하야 詔武威太守하야 勿受其使하다
〈出匈奴傳〉臧宮,
馬武 上書曰 匈奴貪利하고 無有禮信하야 窮則稽首하고 安則侵盜라
今에 人畜이 疫死하고 旱蝗赤地注+[釋義]空盡無物曰赤이니 言在地之物이 皆盡也라하야 疲困乏力하야 不當中國一郡이니 今命將臨塞하야 厚縣(懸)購賞이면 北虜之滅이 不過數年이리이다
故曰 務廣地者는 荒하고 務廣德者는 彊이라하니 今國無善政하야 災變不息이어늘 而復欲遠事邊外乎아
誠能擧天下之半하야 以滅大寇 豈非至願이리오마는 苟非其時면 不如息民이라하니 自是로 諸將이 莫敢復言兵事者러라
〈出宮傳〉
林之奇曰
光武以兵定天下로되 而用兵이 果光武之心乎아
觀其遣馮異入關에 必先告之曰 征伐은 非必略地屠城이라 要在平定安集之耳요 且平定之將은 不足以立威라하니
方群雄角逐之時하야도 猶不欲以威勝이어든 而況於匈奴乎아
方投戈講藝之餘하야 正欲與天下相安於無事어늘 而臧馬二子 必欲求逞於一劍하니 嗟呼라
一劍用而吾民之命이 殘矣라
求以殘匈奴는 適以殘吾民이니 光武之心이 豈忍爲之哉아
故로 不得不持黃石之說하야 以自戒而固却之也니라
건무建武 27년(신해 51)
북흉노北匈奴가 사신使臣을 보내어 무위군武威郡에 와서 화친할 것을 구하자, 황제가 공경公卿들을 불러 조정에서 의논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였다.
황태자가 말하기를 “남선우南單于가 새로 귀부歸附하였다가 배반하여 북쪽 오랑캐와 교통(왕래)하니, 신은 남선우南單于가 장차 두 마음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무위태수武威太守에게 명하여 사신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흉노전匈奴傳》에 나옴 -
장궁臧宮과 마무馬武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흉노匈奴는 이익을 탐하고 예禮와 신의가 없어서 곤궁하면 머리를 조아려 복종하고 편안하면 침략하고 도둑질합니다.
지금 사람과 가축이 병들어 죽고 가뭄과 충해蟲害로 〈큰 흉년이 들어〉 거둘 만한 농작물이 하나도 없어서注+[釋義]비고 다하여 물건이 없는 것을 적赤이라 하니, 적지赤地는 지면地面에 있는 물건이 모두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지치고 기력이 다하여 중국의 한 군郡을 당해내지 못하니, 이제 장수를 명하여 변방에 임해서 후하게 상賞을 내건다면 북쪽 오랑캐의 멸망은 몇 년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서를 내려 답하기를 “황석공黃石公의 기록인 《소서素書》에 ‘유柔한 것이 강剛한 것을 제압하고 약弱한 것이 강彊한 것을 제압하며,注+[頭註]유순한 자는 덕이 있고 굳센 자는 해치며, 약한 자는 인仁이 도와주는 바이고 강한 자는 악惡이 돌아가는 바이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도모하는 자는 수고롭기만 하고 공功이 없으며, 먼 것을 버리고 가까운 것을 도모하는 자는 편안하면서도 끝마침이 있다.
그러므로 땅을 넓히기를 힘쓰는 자는 황폐해지고 덕德을 넓히기를 힘쓰는 자는 강해진다.’ 하였으니,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정사가 없어서 재변災變이 그치지 않는데, 다시 변방 밖을 멀리 정벌하고자 하는가.
진실로 천하의 반半을 들어서 큰 도적을 멸망하는 것이 어찌 나의 지극한 소원이 아니겠는가마는 만일 적당한 때가 아니면 백성을 쉬게 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 이로부터 여러 장수들이 감히 다시는 전쟁하는 일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 《후한서後漢書 장궁전臧宮傳》에 나옴 -
임지기林之奇가 말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군대를 가지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나 군대를 사용함이 과연 광무제光武帝의 마음이었겠는가.
살펴보건대 풍이馮異를 보내 관중關中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먼저 고하기를 ‘정벌은 굳이 땅을 공략하고 성城을 도륙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이 평정平定하고 안집安集하는 데에 있을 뿐이요, 또 평정平定하는 장수는 위엄을 세울 수 없다.’ 하였으니,
군웅群雄이 각축角逐할 때를 당해서도 오히려 위엄으로써 이기고자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흉노匈奴에 있어서겠는가.
막 창을 던지고 문예를 익힌 뒤에 바로 천하와 더불어 무사無事함을 서로 편안히 하고자 하였는데, 장궁臧宮과 마무馬武 두 사람이 기필코 한 칼에 무찔러 쾌함을 구하고자 하였으니, 아! 슬프다.
한 칼을 쓰면 우리 백성들의 목숨이 해를 입는다.
흉노匈奴를 해치려는 것은 다만 우리 백성들을 해치는 것일 뿐이니, 광무제光武帝의 마음이 어찌 차마 이것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황석공黃石公의 말을 가져다가 스스로 경계하고 굳이 물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